김형찬의 음악세상
 |
|
정현종 시인, 한겨레 자료사진
|
나는 별아저씨- 정현종
나는 별아저씨/별아 나를 삼촌이라 불러다오/별아 나는 너의 삼촌/나는 별아저씨.
나는 바람남편/바람아 나를 서방이라고 불러다오/너와 나는 마음이 아주 잘 맞아/나는 바람남편이지.
나는 그리고 침묵의 아들/어머니이신 침묵/언어의 하느님이신 침묵의/돔(Dome) 아래서/나는 예배한다/우리의 生은 침묵/우리의 죽음은 말의 시작.
이 천하 못된 사랑을 보아라/나는 별아저씨/바람남편이지.
시는 비유를 통해 세상과 관계를 맺고, 관계맺음을 통해 세상에 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위의 정현종의 시에서 ‘나’는 어느 순간 놀라운 은유의 힘으로 하늘로 점프하여 ‘별의 아저씨’가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냥 누군가의 눈동자에서 반짝이는 정도의 사소한(?) 관계에 지나지 않았을 별이, 위 시에서는 어이없을 정도로 전복적이게도 ‘나’와 아저씨와 조카로서 끈끈한 혈연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넓디넓은 우주공간에서 그렇게 시적인 혈연관계로 맺어진 별을 찾아내 본다는 것은 무언가 다른 차원의 감정과 인식의 세계를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나’의 부인이 되어버린 바람은 또 어떻습니까. ‘바람남편’은 ‘별아저씨’와 같은 글자수로 음악적 댓구까지 이루면서 ‘나’의 범상치 않은 혼인관계까지 드러내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해 인간과 세계 사이의 엄청난 간극을 한순간에 혁명적으로 뛰어넘는 드라마틱한 관계맺기를, 단 몇 글자의 은유적 시어로 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독일 철학자 헤겔이 미학강의(Vorlesungen uber die Asthetik)에서 ‘시인의 감정이 자연의 다른 대상들과 비교됨으로써 역으로 자기를 초월적 존재로 고양시키는 데에 효과를 발휘한다’고 했듯이 말입니다.
 |
|
헤겔, 한겨레 자료사진
|
비유에 의해 맺어진 ‘나’와 세상과의 시적인 관계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과학의 인과관계와는 사뭇 다릅니다.
과학이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축적하여 그 속에서 가설을 뽑아내고, 그 가설이 맞는지 다시 한번 재관찰과 재실험을 통해 검증하여 튼튼한 인과관계를 가진 과학법칙을 세운다면, 시는 상상력을 동원하고 비유라는 훌륭한 표현기법을 통해 세상과의 감동적인 시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시는 더 나아가 과학처럼 실험을 통해 또다른 인식의 지평을 열어나가기도 하죠.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프랑스 시인 아르튀르 랭보는 아래의 시에서처럼 언어를 가지고 과학처럼 실험을 했습니다.
모음- 아르튀르 랭보
A는 흑색, E는 백색, I는 홍색, U는 녹색, O는 남색/모음이여 네 잠재의 탄생을 언젠가는 말하리라/A, 악취 냄새 나는 둘레를 소리내어 나르는/눈부신 파리의 털 섞인 검은 코르세트
그늘진 항구, E, 안개와 천막의 백색/거만한 얼음의 창날, 하이얀 왕자, 꽃 모습의 떨림/I, 주홍색, 토해낸 피, 회개의 도취련가/아니면 분노 속의 아름다운 입술의 웃음이런가
U, 천체의 주기, 한바다의 푸른 요람/가축들이 흩어져 있는 목장의 평화/연금술을 연구하는 넓은 이마에 그어지는 잔주름살
O, 기괴한 날카로운 비명이 찬 나팔소리려니/온 누리와 천사들을 꿰뚫는 침묵/오오, 오메가! 신의 시선의 보라빛 광선
A, I, U, O 4개의 모음에 색깔을 칠해보기도 하고, ‘창날’의 자리에 ‘침묵’을 대신 대입해보는 등 여러 가지 언어실험을 행한 것이죠. 언어의 실험을 통해 축적한 많은 시들을 통해 기존의 표현법칙(과학으로 말하자면 기존 과학법칙)을 깨트리고 다른 표현법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주 옛날 시로부터 분화되어 나온 음악이 여러 가지 다양한 코드, 사운드, 리듬의 실험과 악기의 개발과 발견을 통해 새로운 표현법칙을 가진 노래를 만들어내듯 말입니다.
 |
|
랭보, 한겨레 자료사진
|
일반적으로 실증적 인과관계를 토대로 한 과학법칙이 시나 음악의 표현법칙보다 더 정밀하고 우월하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저명한 과학철학자 파울 파이어아벤트는 시와 음악 등 과학 이외의 것들이 만들어내는 관계법칙이 과학의 인과관계법칙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원래 비엔나 대학에서 물리학과 천문학을 전공한 과학도이자 나중에 ‘과학혁명의 구조’로 유명한 토마스 쿤과 함께 연구작업을 했던 파이어아벤트는, 과학의 중요한 원리 발견 수단인 관찰이 기존의 이론이나 신념의 개입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현상에 대해 순수한 눈으로 관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철학자 칸트의 `색깔 안경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관찰하는 눈은 기본적으로 기존 이론과 신념이라는 ‘색깔 안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과학의 허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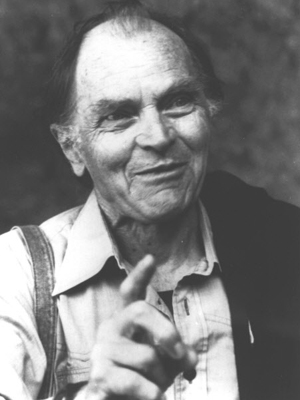 |
|
파이어아벤트, 한겨레 자료사진
|
최근 저렴하고 간편한 혈액 검사법을 개발해 포브스지 선정 미국 400대 부호에 오른 한 ‘ 엘리자베스 홈스(30)는 “어린 시절 주삿바늘에 대한 공포가 이런 검사법을 만든 동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동기는 인식을 인도하기 때문에, 홈스의 사례와는 정반대로 잘못된 동기에 의한 잘못된 과학적 인식 또한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과학에게는 또다른 허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설에 관련된 것이죠. 관찰과 실험을 통해 가설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가설이 강철처럼 튼튼한 인과관계를 가진 과학법칙이 되기 위해선 재실험과 재관찰을 통해 검증을 해야하는 데 그 검증의 범위가 세상 전체가 아닌 이상 모든 가설은 잠정적인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조는 하얗다”는 법칙이 세상 어다선가 자연적으로 홀연히 등장한 ‘푸른 백조’에 의해 깨어지듯 말입니다. 또 데이터 축적의 어느 시점에서 가설을 뽑아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죠. 섣부르게 가설을 뽑아냈다가는 종국적으로 엉뚱한 과학법칙이 유도되기도 하니까요.
그리하여 파이어아벤트는 ‘반방법론 : 지식의 무정부주의적 이론에 대한 스케치’ (Against Method: Outline of an Anarchistic Theory of Knowledge)에서 깨달음에 대해 “어떻게 해도 좋다”(Anything Goes)고 말하며, 과학적 방법의 우월성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니 여러 가지 다른 깨달음의 법칙을 찾는 다양성 중시의 자세를 보이라고 천명하게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도 많고 과학 방법론 또한 그의 ‘반방법론’과 다르게 여전한 힘과 영향력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깨달음을 찾는 법칙에 대한 유연한 태도의 배경에는 그의 연극에 대한 관심과 음악에 대한 사랑이 숨어있습니다. 그는 연극에 소질을 보여 ‘소격효과’로 유명한 극작가이자 연출가였던 베르톨트 브레히트로부터 같이 작업을 하자는 제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아코디언을 연주하며 바이올린을 배우고 합창단에서 활동하기도 했죠. 그는 오페라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성악레슨을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파이어아벤트는 평소 굉장히 흠모하던 미국 미네소타 과학철학센터에서 자리 제안을 받고 응했다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보컬 선생님 없이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며 다시 퇴짜를 놓았다고 합니다. 동기는 인식뿐만 아니라 자리에도 우선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김형찬기자 chan@hani.co.kr
김형찬의 앱으로 여는 음악세상 http://plug.hani.co.kr/appsong/1944127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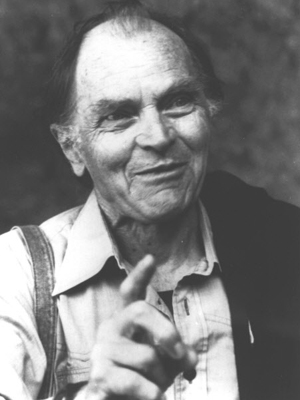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