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쑤저우에 있는 호구검지. 손무를 등용했던 오왕 합려의 무덤이다. 합려를 장사지낼 때 애장하던 검 3000개를 같이 묻었다고 한다. 왼쪽 아래에 붉은 글씨로 ‘호구검지’라는 글자가 보인다. 옛날 오나라 땅이었던 쑤저우에서는 지난해 손자병법을 강학하는 손자병법원을 개설하기도 했다.
|
‘왜 선물했을까’ 궁금증 돋우는 것마저 병법인가
그럼 나의 방문을 거절한 노학자도 병법을 쓴 것인가
내가 ‘변통’을 알았다면 선생을 뵈었을텐데 미국의 한 여성 독자가 중국의 한 저명한 작가의 작품을 읽고 그를 존경한 나머지 만나보려고 전화로 먼저 연락을 한 일이 있었다. 작가는 “달걀을 사서 먹고 맛이 좋았으면 그만이지 그 알을 낳은 닭은 찾아 뭘 하겠느냐?”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첸종슈(錢鍾書, 1910-1999)라는 저명한 지식인에 관한 일화다. 이 일화를 접할 때마다 나는 첸종슈의 기지에 찬 거절에 남들처럼 감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어떤 인연으로 읽게 되었는지 기억은 아련하지만 중국의 어느 노학자의 수필을 읽었는데 너무 마음에 와 닿았다. 그래 그 분이 쓴 글이 있으면 모두 구하려고 했고, 새 글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예전에 읽은 것을 다시 읽곤 했다. 그 분의 글에 빠져들어 갈수록 그분을 정말 한번 만나고 싶었다. 그게 인지상정 아닌가? 그 분 책도 구할 겸 중국에 간 김에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겨우 그 분 댁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전화를 걸기 전에는 나이가 너무 연로하시니 귀가 잘 들리실까 걱정했는데 유선상으로 들리는 목소리는 아주 정정하셨다. 정말 다행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당신의 글을 몇 권 읽고 뵙고 싶어서 불원천리하고 이렇게 왔노라고. 속으로 나는 당연히 언제 찾아오라고 말할 줄 알았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거절하셨다. 이유는 나이가 많이 들어 보기 좋지 않으며 귀도 잘 들리지 않고 몸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음성으로 보아 건강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당시 그 분 연세가 여든도 훨씬 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조를 수도 없었다. 몇 년 후에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헤아려보니 벌써 6년이 넘었다. 아 세월의 무상함이여.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내가 그 분을 생전에 만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그 분이 거절했기 때문에? 아니다. 나는 ‘병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우연히 그 분에 대한 일화를 접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분은 20년 전부터 그렇게 거절했다는 것이다. 아뿔싸. 어떤 사람이 원고청탁을 하러 찾아오면 그 분은 언제나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싸 가슴 앞에 모은 자세(무협영화를 보면 많이 나오는 자세)로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나에게 했던 대로 갖가지 ‘핑계’를 댄다는 것이다. 눈도 이빨도 귀도 다 좋지 않다, 혈압은 높아 머리가 어지럽다, 나이도 이제 너무 많다, 그러니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등등. 처음 온 사람은 당황해서 죄송스런 마음으로 물러서기 마련이다.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 분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혜와 통찰로 가득한 글을 쓰다가 구십이 다 된 나이에 돌아가셨다. 그분은 정말 ‘병법’에 능한 분이셨던 것이다. 전쟁 같은 인생 승리하려 필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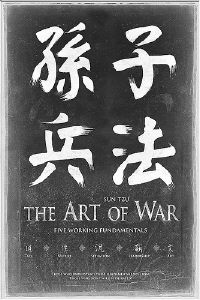 |
|
<손자병법>
|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질 것 같으면 도망가라
궁지에 몰린 적은 압박하지 않는다
→물에 빠진 개는 두들겨 패라
마오는 병법 응용한 지략가 <손자병법>은 원래 역사상 무인이건 문인이건 많이 읽었던 저명한 병서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특히 유명해진 데에는 사실 마오쩌둥의 역할이 크다. 전쟁을 다룬 그의 글을 읽다보면 <손자병법>을 인용한 부분이 많이 나온다. 특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그는 한때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왕밍과 같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손자병법>이나 <삼국지>에 의지해 전투를 하고 있다고 비판받기도 했다. 그리하여 “산골짜기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나오지 않는다”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요즘 우리가 개천에는 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고, 청계천에서는 ‘용’이 나올지 모른다고 하듯이 말이다. 하지만 그는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는 싸우고, 싸워서 질 것 같으면 도망가는”(<중국혁명전쟁의 전략문제>) 방식으로 결국 국민당과 일본을 물리치고 신중국을 건립하였다. 중국은 “동방이 밝지 않으면 서방이 밝고, 남방이 어두우면 북방이 있는,” 다시 말하면 진퇴나 변통의 여지가 있는 대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원칙 없다는 것이 최고의 원칙 마오는 당나라 때의 시인 두목(杜牧)의 ‘제오강정(題烏江亭)’이라는 시를 아주 좋아했다고 한다. 오강을 건너 강동으로 돌아가 다시 훗날을 기약하자는 주위의 충고를 무시하고 분기탱천 싸우다가 죽은 초패왕 항우를 비판한 시다. “승패는 병가도 기약할 수 없으니 치욕을 참고 견디는 것이 사나이라. 강동의 자제 중에는 인재가 많으니 땅을 말아 다시 올 날을 그 누가 알랴!” 오강을 건너 도망갔어야 한다는 것이다. 삼십육계 중에서도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역사상 많은 문인들이 항우의 영웅다운 죽음을 애석하게 여겼지만 마오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1949년 4월 인민해방군이 국민당군을 물리치고 난징을 점령한 것을 기념해 마오가 쓴 시 중에 이런 대목이 있다. “마땅히 남은 용기를 가지고 궁지에 몰린 적을 추격해야 하리. 이름을 내기 위해 패왕을 배워서는 안 될 것이로다.(宜將剩勇追窮寇 不可沽名學覇王)” 항우는 일찍이 유방을 홍문에서 죽일 수 있었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의롭지 못한 일이라는 항백(項伯)의 충고를 받아들여 유방을 죽이지 않았었다. 마오는 항우처럼 궁지에 몰린 적을 놓아주어 나중에 당하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사실 <손자병법>에 나오는 “궁지에 몰린 적은 압박하지 않는다”(‘軍爭 편)는 원칙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 확실히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물에 빠진 개‘는 두들겨 패야 한다는 루쉰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페어플레이는 뒤로 미루어야 한다>) 잘못하면 건져준 ’개‘에게 도리어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
|
황희경/영산대 교수·중국철학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