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러브레터>(1995)
|
[토요판] 김세윤의 재미핥기
눈밭을 걷는 여자의 걸음이 빨라진다. 두 발이 마음의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픽, 앞으로 고꾸라진다. 하지만 씩씩하게 일어나 빨간 스웨터에 묻은 눈을 대충 털어내고 다시 뛰기 시작하는 여자. 숨이 차올라 더 달릴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멈춘다. 그러고는 저 멀리 우뚝 서 있는 산봉우리를 향해서, 아니 2년 전 그 산봉우리가 집어삼킨 자신의 연인을 향해서 소리친다. “잘 지내죠? 저는 잘 지내요.”
그녀의 애절한 외침이 겨울산에 울려퍼지기 한 해 전, 어느 좁고 낡은 아파트 욕실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뚜껑 덮인 변기 위에 흰색 속옷 차림으로 걸터앉은 남자는 손에 든 비누에게 말을 걸었다. “너무 야위었어. 전엔 통통했는데. 왜 그래? 자신감을 가져.” 이번엔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레를 집어든 남자. “그만 울어. 계속 울기만 할 거야? 강해져야지. 왜 축 처져 있는 거야?” 남자는 결국 젖은 걸레를 비틀어 ‘눈물’을 모두 짜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빨래를 걷어서 따뜻하게 다림질도 해주었다. 그렇게 방 안의 모든 사물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나서야 남자는 비로소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읽는 동안 이미 <러브레터>(1995)와 <중경삼림>(1994)이란 영화 제목을 재빨리, 그리고 정확히 기억해낸 사람은 나름 응답할 게 있는 1990년대를 보낸 것이다. 누구는 스키장에서 “오겡키데스카?”를 함께 외쳐대던 커플로, 누구는 원룸에서 젖은 걸레의 눈물을 홀로 쥐어짜던 싱글로. 누구는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책장을 넘기면서, 또 누구는 팝송 캘리포니아 드림인(california dreamin’)을 흥얼거리면서. 그 여자의 메아리를 잊지 못해 탄식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거나, 아니면 그 남자의 넋두리가 잊혀지지 않아 피식 웃는 사람들 중 하나였거나. 서로 포즈와 표정은 달라도 결국 같은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는 단체사진 속 동창생처럼, 어쨌든 우리 모두는 <러브레터>와 <중경삼림>의 관객으로 1990년대를 함께 통과했던 것이다.
이와이 슌지와 함께 관객은 ‘짝사랑’을 다시 시작했다. 왕가위와 더불어 오래도록 ‘옛사랑’을 잊지 못하였다. 이와이 슌지 영화의 주인공들은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챘고, 왕가위 영화의 주인공들은 사랑이 끝났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받아들였다. 두 사람이 그려낸 사랑의 본질은 같았다. 그것은 끊임없이 어긋나고 엇갈리는 사랑. 말하자면, 시계 속 시침과 분침의 관계와도 같은 것이었다.
숫자 ‘12’위에 포개져 잠시 하나가 된 시침과 분침. 하지만 시침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분침 혼자 조금씩 멀어진다. ‘12’를 그리워하면서 ‘1’로, ‘2’로, ‘3’으로…. 그렇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것은 동시에 과거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이기도 하다. 그게 바로 둥근 원을 그리며 도는 분침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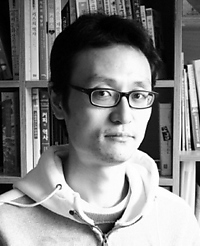 |
|
김세윤 방송작가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