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영화 <래빗 홀>(2010)
|
[토요판] 김세윤의 ‘재미핥기’
모니터 속 노란 리본을 바라본다.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간절한 문장 위에 나비 모양 리본이 가만히 날개를 펴고 앉아 있다. 꿈틀꿈틀, 나비가 움직인다. 나풀나풀, 모니터 밖으로 날아오른다. 나비를 따라가본다. 고 작은 녀석이 용케 바다를 건너고 숲을 지난다. 이윽고 일본 바닷가 어느 집 거실. 영화 <걸어도 걸어도>(2008)의 한 장면으로 날개를 파닥이며 들어가는 노란 나비. 제일 먼저 문으로 다가간 건 둘째 아들 료타(아베 히로시)였다. 나비를 내보낼 셈이었다. 그때 엄마(기키 기린)가 소리쳤다. “문 열지 마. 준페이일 거야.” 그러고는 텅 빈 눈빛으로 비틀비틀 나비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당신의 주름진 두 손을 뻗어 허공의 나비를 잡으려고 허우적대기 시작했다. 조금 전 낮에 엄마는 큰아들 준페이에게 다녀왔더랬다. 15년 전, 물에 빠진 소년을 구하려다 그만 목숨을 잃은 아들이다. “자식 묘를 찾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담담하게 비석을 쓰다듬고 돌아오는 길, 당신의 눈앞을 가로질러 날아가던 노란 나비 한 마리. 그때 엄마는 료타에게 말했다. “저건 말이지, 겨울이 되어도 죽지 않은 하얀 나비가 이듬해 노란 나비가 되어 나타난 거래. 그 얘기를 들은 뒤로 저 나비를 보면 왠지 딱해 보였어.” 하지만 그날 밤, 딱해 보이는 건 나비가 아니라 엄마였으니. 낮에 본 노란 나비가 당신을 따라왔다고 믿는 어미는, 그것이 아들의 환생이라고 믿고 싶은 어미는, 료타가 잡아 마당으로 날려보낸 나비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거실 끝에 우두커니, 마치 비석처럼 한참을 서 계셨다. 어제 그러했듯이 오늘도, 그렇게 문득문득 허공으로 텅 빈 눈빛을 향처럼 피워 올리는 준페이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또 눈물이 고인다. 내 모니터에서 날아간 노란 나비를 그 어두운 마당의 나뭇가지 끝에 리본처럼 남겨두기로 한다. 그리고 혼자 이 끔찍한 현실로 돌아온다. 자식 잃은 부모들의 흐느낌을 밤낮으로 들은 지 열흘이 되었다. 시인 T. S. 엘리엇은 “쾅 하는 소리가 아니라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끝났다고 했지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가라앉은 자식을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건져 올리는 부모 앞에서, 그는 틀렸다. 과연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떤 말이든 위로가 될 수나 있을까. 영화 <래빗 홀>(2010)에서 네 살배기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진 딸 베카(니콜 키드먼)는 역시 오래전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자신의 엄마에게 묻는다. 그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11년이나 견디며 살고 있느냐고. 그때 엄마는 딸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글쎄, 무게의 문제인 것 같아. 언제부턴가 견딜 만해져. 결국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조약돌처럼 작아지지.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해. 하지만 문득 생각나 손을 넣어보면 만져지는 거야. 끔찍할 수도 있지.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냐. 그건 뭐랄까… 아들 대신 너에게 주어진 무엇. 그냥 평생 가슴에 품고 가야 할 것. 그래, 절대 사라지지 않아. 그렇지만… 또 괜찮아.” 가슴을 짓누르는 바위 같은 슬픔이 정말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조약돌처럼’ 작아질 수 있는지 나로선 알 길이 없다. 다만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다. 아이들이 나비라도 되어 돌아오기를. 바위가 꼭 조약돌로 작아지기를. 절대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또 언제부터인가는 견딜 만한 아픔이 될 수 있기를. 그냥 무턱대고 믿고만 싶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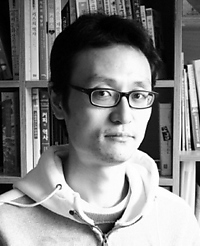 |
|
김세윤 방송작가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