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정민석의 해부하다 생긴 일
시신을 해부해서 만든 표본을 오래 보관하는 것은 해부학의 큰 숙제였다. 표본이 말라비틀어지거나 썩지 않게 하면서 그 모습이 남아 있게 하려고 애썼다. 표본을 투명한 통 속의 방부액에 담그기도 하였고, 표본을 틀에 넣고 투명한 액체 플라스틱을 부어서 굳히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77년에 독일의 어느 해부학 선생이 기막힌 방법을 개발하였다. 해부한 표본에서 물을 빼고, 그 자리에 액체 플라스틱을 스며들게 해서 굳힌 것이다. 이 방법의 결과로 물 대신에 플라스틱이 차 있는 표본을 플라스틱화 표본이라고 부른다.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플라스틱화 표본은 썩지 않고 냄새나지 않는다. 표본이 보존액 통 속에 있거나 플라스틱 속에 있으면 직접 만질 수 없지만, 플라스틱화 표본은 직접 만질 수 있다. 젖지 않아서 장갑을 안 끼고 만져도 괜찮다. 플라스틱화 표본은 언제나 냄새나고 젖어 있던 해부학 표본실을 산뜻하게 바꾸었다. 플라스틱화 표본은 일반인한테 전시해서 충격을 주었는데, 일반인은 시신을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부한 시신이 어떤 자세(이를테면 운동하는 자세, 밥 먹는 자세)를 취해서 좋게 말하면 예술 작품을, 나쁘게 말하면 엽기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인체 신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해서 충격을 주었다. 처음에는 독일에서 만든 표본이 전세계를 휩쓸었고, 나중에는 중국에서 만든 표본이 그 시장을 차지하였다. 아주 옛날에 플라스틱이 있었고 이 방법을 개발했으면, 시신을 미라로 만들지 않고 플라스틱화 표본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랬으면 지금 우리는 옛날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감 나게 보고 있었을 것이다. 고대 이집트 사람이 만든 플라스틱화 표본을 전시한다면 보고 싶지 않겠는가. 시신을 해부해서 만든 플라스틱화 표본은 물건이 아닌 시신이며, 따라서 윤리 문제가 뒤따른다. 해부학 선생은 일반인한테 전시하는 것을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한다. “자기 몸을 기증한 분이 살아 있을 때 그런 전시에 동의했으면 찬성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반대입니다.” “전시가 교육 목적이면 찬성이고, 상업 목적이면 반대입니다. 상업 목적의 보기를 들면, 시신이 야한 자세를 취하는 것과 표본을 개인한테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육 목적인지 상업 목적인지 모호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의과대학에는 해부학박물관이 많으며, 이곳에서는 학생이 실습하고 일반인이 견학한다. 요즘 해부학박물관에서는 온몸 또는 여러 부위의 플라스틱화 표본을 만들어 전시하며, 과학관과 자연사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한다. 더 좋은 플라스틱화 표본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으며, 이것을 위한 학술대회와 학술지도 생겼다. 그러나 한국에는 해부학박물관이 없고, 플라스틱화 표본을 거의 만들지 않았다. 의과대학 또는 나라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해부학 선생이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지원이 없으면 만들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전시에 관한 윤리도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자신있게 말한다. “한국의 해부학 선생은 재주가 좋아서 플라스틱화 표본을 금방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할지 어떻게 전시할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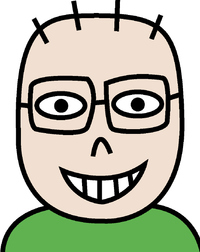 |
|
정민석 아주대 의대 해부학교실 교수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