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정민석의 ‘해부하다 생긴 일’
의과대학 학생은 머리가 좋아서 자만하고 게을러지기 쉽다. 머리가 나빠서 낙제하는 학생은 없고, 게을러서 낙제하는 학생이 있을 뿐이다. 게을러지는 것을 막으려고, 나는 학생한테 머리가 나쁘다고 말한다. 진짜 머리가 나쁜 학생한테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의과대학에서는 학생한테 머리가 나쁘다는 말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편하다. 아마 연극영화학과에서는 학생한테 못생겼다는 말을 마음껏 할 것이다. 나는 해부학 선생답게 해부학 지식을 바탕으로 머리가 나쁘다고 말한다. 뇌는 대뇌, 소뇌, 뇌줄기로 나뉜다. 이 중에서 소뇌는 대뇌의 운동 명령을 돕는다. 즉, 소뇌에 있는 운동 정보 덕분에 우리는 똑바로 걷고 글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뇌줄기는 목숨을 지켜준다. 즉, 뇌줄기에 있는 심장혈관중추와 호흡중추 덕분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다. 머리가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하는 것은 대뇌이다. 그러므로 머리가 나쁘다고 말할 때 소뇌, 뇌줄기가 아닌 대뇌를 들먹이면 된다. 다음 네 가지의 비꼬는 말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쓰면 된다. 첫째, “너는 대뇌가 해맑아서 좋겠다.” 대뇌는 대뇌겉질과 대뇌속질로 이루어져 있다. 중요한 것은 대뇌겉질이다. 대뇌겉질에서 신경세포끼리 만나 자극이 전달되면, 감각과 운동, 그리고 생각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대뇌겉질이 다치면 감각을 느끼지 못하거나 운동을 명령하지 못하거나 생각을 못한다. 대뇌를 잘라서 보면 대뇌겉질이 회색이고 대뇌속질이 흰색이다. 대뇌가 해맑다는 말은 회색의 대뇌겉질이 없다는 뜻이고, 따라서 생각을 못한다는 뜻이다. 마음이 해맑다는 말은 칭찬이지만, 대뇌가 해맑다는 말은 머리가 나쁘다고 비꼬는 것이다. 둘째, “너는 대뇌에 주름살이 없어서 좋겠다.” 사람은 다른 짐승에 비해서 대뇌가 클 뿐 아니라 주름이 많고 깊다. 대뇌의 주름에서 들어간 곳을 고랑, 나온 곳을 이랑이라고 부른다. 본래 고랑과 이랑은 밭에서 쓰는 말인데, 대뇌에서도 잘 쓰고 있다. 대뇌의 주름은 호두 열매를 닮기도 하였다. 대뇌가 2개의 대뇌반구로 이루어졌고, 2개의 대뇌반구가 서로 이어져 있는데, 이것도 호두 열매를 닮았다. 하여튼 대뇌는 주름 덕분에 표면적이 넓고, 그만큼 대뇌겉질이 커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 얼굴에 주름살이 없다는 말은 칭찬이지만, 대뇌에 주름살이 없다는 말은 머리가 나쁘다고 비꼬는 것이다. 셋째, “너는 쓰지 않은 새 대뇌를 갖고 있어서 좋겠다.” 대뇌겉질을 많이 쓰면, 신경세포끼리 자극을 더 전달한다. 머리가 좋아지는 과정이고, 치매를 막는 과정이기도 하다. 대뇌겉질을 아껴 쓸 까닭이 없다. 심장을 아껴 쓰려고 운동하지 않으면, 심장이 오히려 나빠진다. 콩팥을 아껴 쓰려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혈액에서 해로운 것의 농도가 높아진다. 이처럼 우리 몸 대부분의 기관은 아껴 쓸 까닭이 없다. 쓰지 않은 새 명품을 갖고 있다는 말은 칭찬이지만, 쓰지 않은 새 대뇌를 갖고 있다는 말은 머리가 나쁘다고 비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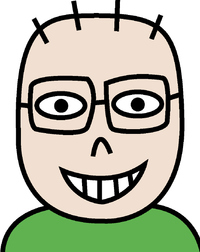 |
|
정민석 아주대 의대 해부학교실 교수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