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정민석의 해부하다 생긴 일
나는 의과대학 졸업반 학생일 때 해부학에 몸담기로 마음먹었다. 의사 국가고시에 떨어져서 의사가 못 되어도 해부학 선생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의사 국가고시에 떨어지면 해부학을 가르치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나한테 배울 학생이 “선생님이나 잘하세요”라고 말할 것 같았다. 그런 생각으로 꾸역꾸역 국가고시 공부를 하였고, 겨우겨우 의사 면허증을 땄다. 내 의사 면허증은 곧 장롱 면허증이 되었다.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운전하지 않는 것처럼, 의사 면허증이 있는데 진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업 의사가 진료실에 의사 면허증을 걸어서 환자한테 보여 주듯이, 내가 해부학 실습실에 의사 면허증을 걸어서 학생한테 보여 줄 수 없지 않은가? 장롱 면허증을 갖고 있는 나는 돌팔이 의사이다. 학생 때 배운 임상의학을 거의 까먹었고, 해부학과 관련된 임상의학을 조금 알 뿐이다. 학생 때 부지런히 공부했으면 많이 까먹어서 억울했을 텐데, 억울하지는 않았다. 내가 두려워한 것은 응급 환자였다. 비행기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치자.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의사가 와서 도와주세요.” 헷갈린다. ‘나는 의사이지만, 수의사 또는 약사보다 임상의학을 모른다. 도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나는 의사가 된 지 거의 30년인데, 이런 응급 환자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해부학에 몸담은 1980년대에도 의과대학을 졸업한 해부학 선생, 즉 의사 해부학 선생이 적었는데, 요즘에는 더 적다. 갈수록 진료로 먹고살기 어려운데, 졸업하면 다 의사의 길을 걷는다. 왜 그럴까? 옛날보다 의과대학 입학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더 어렵게 딴 의사 면허증을 장롱에 넣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행기에서 응급 환자를 도우려고 의사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 의과대학에는 비의사 해부학 선생도 필요하고, 의사 해부학 선생도 필요하다. 비의사 해부학 선생은 가르칠 때 등신, 연구할 때 귀신이다. 거꾸로 의사 해부학 선생은 연구할 때 등신, 가르칠 때 귀신이다. 의사가 될 학생한테 해부학을 가르칠 때에는 의사 해부학 선생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나처럼 연구할 때도 등신, 가르칠 때도 등신인 의사 해부학 선생이 있기는 하지만. 나는 웃으면서 말한다. “한국에 의사 해부학 선생이 모자라서 기쁩니다. 나는 은퇴한 다음에도 일자리가 있을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부학을 가르치면서 용돈을 벌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일 뿐이다. 의사 면허증을 장롱에 넣을 씩씩한 후배를 기다린다. 나는 의과대학의 많은 학생한테 해부학에 몸담으라고 권했는데 실패하였다. 그래서 의과대학 학생이었던 내 아들한테도 권했는데 뜻밖에 성공하였다. 지금 내 아들은 나와 함께 해부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다. 이처럼 의사가 대를 이어서 해부학 선생이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두번째이다. 내 아들은 생김새와 쓰임새가 나와 비슷하다. 생김새를 말하면 나보다 머리카락이 길 뿐이고, 쓰임새를 말하면 나만큼 놀기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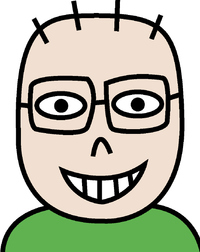 |
|
정민석 아주대 의대 해부학교실 교수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