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9.11 19:45
수정 : 2013.09.12 15:39
 |
|
박미향 기자
|
[매거진 esc] 백수의 청춘식탁
시기별로 ‘꽂히는’ 술안주가 있게 마련이다. 한때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먹는 야채참치가 최고였고, 또 다른 어떤 시기에는 종로 시장통의 돼지 수육에 꽂히기도 했다. 요즘 내가 꽂혀 있는 술안주는 바로 양꼬치다.
처음 양꼬치를 먹었던 건 대학 학부 시절 교양수업을 함께 들었던 중국인 친구가 권해서였다. 아직도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중국인 친구와 중국 본토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매우 신선한 경험으로 다가왔다. 학교 앞에 새로 생긴 양꼬치집의 주인도 한국말이 서툴렀다. 함께 먹은 맥주도 중국산. 나에게 양꼬치는 한번도 가본 적 없는 중국 그 자체와의 만남이었던 것이다. 중국에 다녀온 친구들은 중국에 짜장면은 없지만 양꼬치는 아주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들을 해줬다.
그 이국적인 풍미에 익숙해지자, 양꼬치집은 나의 단골 데이트 코스가 되었다. 양꼬치라는 음식은 연애에 있어 의외로 많은 메리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에게는 비교적 생소할 수 있는 음식이라 아는 척을 좀 할 수 있다. 직접 숯불에 구워주며 “이 향신료는 ‘쯔란’이네, 저 반찬은 ‘짜샤이’(자차이)네” 하며 미식가 행세를 할 수 있다. 기름기가 많은 편이라 맥주를 많이 마시게 된다. 쉽게 친해진다. 또한 학생이었던 내게 부담스러웠던 ‘영화-밥-술’로 이어지는 데이트 코스를 ‘영화-술’로 간소화해 주기도 했다. 양꼬치 2인분이 모자라면 옥수수 온면 하나 시키면 충분히 배가 부르므로.
양꼬치를 먹으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대학교 3학년, 꼭 함께 양꼬치를 먹고 싶었으나 끝내 그러지 못했던 그녀. 그녀는 학교 앞 맥줏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국인 여학생이었다. 외모도 외모지만, 서툰 한국말로 조곤조곤 열심히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다. 맥줏집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다 보니 어느새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어느 날엔가 드디어 그녀의 휴대폰 번호를 물을 수 있었다.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그녀와 양꼬치를 먹기로 약속을 했다. 무얼 먹고 싶냐는 물음에 그녀가 선택한 메뉴였다. 고향이 그리워서 그런가보다 생각이 들어 그녀에게 회심의 한마디를 날리고 싶어졌다. ‘난 너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라는 말을 중국어로 해주면, 그녀를 위해 중국어를 연마하기까지 하는 따뜻한 남자로 보이리라. 중문과에 다니던 친한 형에게 물어 알아낸 말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워 샹 건 니 친친’(wo xiang gen ni chinchin)이었던가.
친할 친 자를 두개 써서 만든 문장이라는 말을 믿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녀로부터 메시지가 끊겼고, 얼마 후 방문한 맥줏집에도 더 이상 그녀가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양꼬치를 먹기로 했던 약속도 지킬 수 없었다. 중국에서 유학중이던 다른 친구와 그 까닭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알게 됐다. 그 문장의 뜻이 ‘나는 당신과 입을 맞추고 싶다’라는 것을. 아아, 만리타국에 공부하러 와서 친하지도 않은 남자로부터 심야에 그런 문자메시지를 받은 그녀는 얼마나 무섭고 당혹스러웠을까! 황급히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이미 수신을 거부해 놓았든가 아니면 한국말이 서툴러 내 사과 문자를 이해하지 못했든가.
며칠 전 지인과 함께 방문한 동대문의 유명하다는 양꼬치집에서 다른 테이블의 중국인 손님들의 중국어를 들으며 양꼬치를 뜯다가 또 그녀 생각이 났다. 어쩌면 아직 한국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전하고 싶다. “두이 부 치”(dui bu qi! 미안합니다)
강백수 인디뮤지션·시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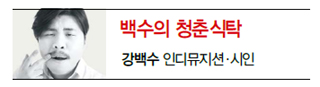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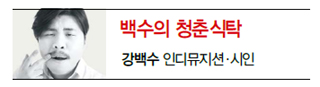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