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10.30 19:58
수정 : 2013.10.31 13:44
[esc] 백수의 ‘청춘 식탁’
며칠 전, 친구 제이(J)와 맥주를 먹다가, 우리 집에 곧 제사가 있을 건데 우리 집 제사 음식이 정말 맛있다는 얘기를 했다. 기독교 집안이라 제사를 지내 본 적이 없는 제이는 맛있겠다며 나에게 제사 음식을 싸 와 파티를 하자고 했다. “우리 엄마 제사인데?”라는 나의 답에 그는 무안하고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우스워 껄껄 웃었다.
9주기. 내년이면 벌써 10년이 된다. 그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다. 고등학생이었던 내가 ‘장가갈 나이’ 소리를 듣는가 하면 중학생이었던 여동생도 인턴사원이 되어 어엿하게 사회생활을 한다. 청년 같던 아버지는 이제 지하철에서 젊은이의 자리 양보를 받는다. 그러나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내가 ‘우리 제사 음식이 맛있다’고 말하면서 껄껄 웃게 되었다는 것이다. 9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우리 집 제사 음식은 기가 막히게 맛있다. 할머니께 “할머니, 20년만 젊었으면 나 음악 안 하고 안동 내려가서 할머니랑 헛제삿밥집 하면서 먹고살 텐데!”라고 말했을 정도다. 할머니 다음의 실력자였던 우리 어머니가 떠나시고, 사촌 누이들이 시집을 가고, 작은어머니들도 슬슬 나이가 드셔서 부침개 정도는 사온 것으로 대체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직접 만든 우리 집 음식이 최고다. 초저녁 공연 때문에 9시가 되어서야 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에 갔다. 독립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은 자취방보다 가족들이 사는 집이 더 익숙하고 친근하다. 작은아버지 내외와 고모까지 오셔서 이제 막 시작된 나의 자취생활을 물으셨다. 나는 완전 자취 체질인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었고, 어른들은 “우리 민구 이제 장가만 가면 되겠다”며 웃으셨다. 옛날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어머니의 1주기 때, 나는 어머니 제사가 다가오기 몇 주 전부터 울적했다. 제사 당일엔 나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동생도 울었다. 서로에게 눈물을 보이기 싫고, 서로의 얼굴을 보기도 괴로워서 모두가 숨죽여 울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서로의 소식뿐만 아니라 어머니와의 추억까지 이야기를 하다니!
자취방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이런 마음을 에스엔에스(SNS)에 올렸더니, 가까운 누님 한 분이 가족과의 화목했던 오늘 하루가 바로 어머니의 선물일 거라는 댓글을 달아주었다. 손에 가득 들려 있던 제사 음식은 생각해보니 엄마가 생전에 제일 공을 많이 들인 음식이다.
집에 돌아와서는 밴드 연습을 했다. 제이도 왔고 드럼 치는 케이(K)도 왔다. 셋이 조촐하게 막걸리 한잔을 기울였다. 부침개와 제사 닭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탕국도 한 냄비 데워서. 너 때문에 진짜로 엄마 제삿날 파티를 한다고 공연히 제이를 타박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불현듯 아직은 내가 완전히 괜찮아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하루 종일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속으로 외치는데, 눈물이 쪼르륵 볼때기를 타고 내려갔다.
제사 음식은 며칠을 더 먹었다. 두부전과 탕국이 조금 맛이 간 것 같기는 했지만, 꾸역꾸역 다 먹었다. 온종일 장 트러블로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엄마가 차려준 아침상 같아서 좋았다. 제사 음식은 결국은 산 사람이 먹는다. 떠난 이의 선물이다.
강백수 인디뮤지션·시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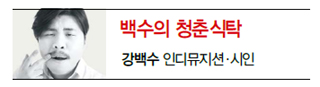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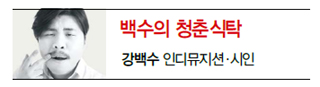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