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12.04 20:22
수정 : 2013.12.05 11:59
[매거진 esc] 백수의 ‘청춘 식탁’
학교를 한해 일찍 들어가서 친구들의 나이는 스물여덟. 남자친구들에게는 아직은 이른 이야기이지만, 여자친구들이나 형, 누나들을 만나면 자연스레 결혼이라는 화제가 튀어나온다. ‘아, 정말 다들 시집 장가들을 가는구나. 저 녀석도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싶었던 친구가 건넨 청첩장에 웃음이 피식 나온다. 나의 경우 특수한 직업 덕분에 주변 사람들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축의금 부담은 없다. 오히려 축가를 부르면 신랑, 신부가 나를 빈손으로 보내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 내심 반갑기도 하다. 게다가, 축의금을 내지 않는 결혼식이라면 설령 빈손으로 돌아오더라도 공짜 밥을 한끼 먹을 수 있지 않은가! 밥 한끼를 공짜로 때울 수 있는 기회가 부모님 집에 살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자취를 시작한 지금은 얼마나 절실한지 모르겠다.
결혼식 피로연 메뉴는 뷔페가 최고라고 생각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간 결혼식장 뷔페는 그야말로 천국이었다. 손목에 자유이용권을 차고 놀이공원을 누비듯, 뷔페를 종횡무진 활보했다. 먹는 욕심이 많아서 뷔페에 다녀오는 날이면 항상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한달에 서너 차례 이상 뷔페에 가다 보니 오히려 뷔페가 먹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동네 뷔페를 가나 음식들의 메뉴와 맛이 비슷하고, 특출나게 맛있는 음식도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었다. 차라리 푸짐한 갈비탕 한 그릇 나오는 곳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날도 을지로입구 인근 예식장에서 열린 결혼식 피로연 메뉴는 뷔페였다. 대학교 1학년 때 5개월 정도 사귀었던, 이제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친구가 된 ‘그녀’의 결혼식이었다. 어느 여름날, 공연장 대기실에서 그녀의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다. 연인으로 지낸 시간보다 친구로 지낸 시간이 훨씬 길다지만, 그래도 사귀었던 여자의 결혼식이라니 조금 싱숭생숭한 기분이 들었다. 갈까 말까 조금 망설였다. 하지만 요즘 별다른 사건이 없다 보니 노래도 안 나오고. 거기에 가면 윤종신의 ‘너의 결혼식’ 같은 명곡을 쓸 수 있을까 싶어 참석하기로 했다. 그런데 의외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조금이라도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을까 했던 것은 착각이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박수를 쳐 주고, 심지어 사진까지 같이 찍었다.
그때 했던 생각은, 그저 ‘다 잘되었다’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이별이 겁도 나고 낯설어서 많이 울었지만, 지금은 그녀는 그녀대로,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감 비슷한 것을 느꼈다.
그녀 이후로 여러 번의 연애가 반복되었다. 모든 연애는 마치 결혼식 피로연 뷔페처럼 비슷했다. 설렜고, 싸웠고, 헤어졌고, 이내 괜찮아졌다. 때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소모적이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처음 한 연애만큼 큰 감흥을 받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날의 뷔페가 잊을 수 없는 맛일 수 있는 것처럼, 저 멀리 한복을 입고 인사를 다니던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는 그날이 잊을 수 없는 날일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내게 다가올 어떤 연애도 그 모습이 비록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연애와 비슷할지라도 내게 특별해지는 순간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날 그녀의 옆에 서 있던 그 남자와의 연애가 그녀에게 그러하였듯이 말이다.
그런 날이 오면 나도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뻔한 예식장에서 뻔한 음식을 차려놓고 나와 내 옆에 있을 누군가에게만 뻔하지 않을 그런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까.
글·사진 강백수(뮤지션 겸 시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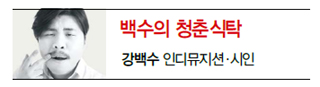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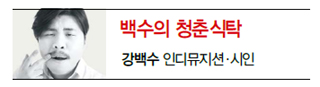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