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3.26 19:50
수정 : 2014.03.27 14:26
 |
|
사진 강백수 제공
|
[매거진 esc] 백수의 청춘식탁
아직 일교차가 커서 겨울옷을 넣어 두지는 못했지만, 춥더라도 봄옷을 입고 싶은 날씨다. 괜히 마음도 설레서 겨우내 집에서 읽던 책을 꺼내 집 근처 카페의 통유리 창 옆에서 앉아 읽고 싶은 그런 계절이다. 조금 추워도 커피는 반드시 차가운 것으로 주문하고 싶은 그런 계절 말이다.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이 벌써 거리마다 울려 퍼진다. 곧 벚꽃도 피겠다. 개나리도 필 거고, 진달래도 피겠지. 꽃이 필 무렵에는 새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
사실 내게 봄을 알리는 식물은 벚꽃도 아니고 개나리, 진달래도 아니다. 바로 쑥이다. 구수한 된장 내음 사이로 배시시 피어오르는 쑥 내음 가득한 쑥국이 먹고 싶어진 걸 보니 정말로 봄이 오긴 왔구나 싶었다. 마침 오늘은 대학원 회식이 있는 날. 술을 먹고 나서 허기를 달랠 요량으로 아침 일찍 장에 나가 쑥을 한 봉지 사왔다. 2000원으로 어린아이 머리만한 봉지를 사 올 수 있었다.
멸치 다시마 국물에 된장을 풀고 콩고물을 묻힌 쑥을 푹푹 끓이니 집 안 가득 쑥 향이 퍼졌다. 국이 끓는 동안 나물도 하나 무쳤다. 그냥 데쳐서 된장, 고추장, 다진 마늘, 참기름에 무쳐내기만 하면 된다며 시장 아주머니가 추천한 참나물을 반찬통에 담아두고, 완성된 쑥국 간도 보고 회식자리로 나섰다. 최근 새로 나온 내 책의 출판을 축하할 겸 모인 자리라 과음을 하는 바람에 쑥국은 그날 밤 먹지 못했다. 다음날 점심에 늦은 기상을 하고야 먹었다. 독거남의 숙취 가득한 아침은 어쩐지 외롭다. 그런 쓸쓸함으로 한 입 떠먹은 쑥국(사진)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있었다. 어린 시절 기억의 한 조각이 떠올랐다.
우리 집은 독실한 불교 집안은 아니지만 일 년에 딱 한 번 석가탄신일에만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 절에 갔다. 절에 가서 연등을 달고 절 밥을 먹고 내려오는 산길의 가장자리에는 뽀얀 듯 푸르게 쑥이 피어 있었다. 엄마와 작은어머니들과 할머니가 쑥을 뜯는 동안 나와 내 동생은 근처의 클로버 덤불에서 네잎클로버를 찾곤 했다. 1995년도의 석가탄신일에 나는 처음으로 네잎클로버를 찾아냈다. 나는 그것을 당시 배가 불러 있었던, 젊은 작은어머니께 드렸다. 건강한 아들을 낳으시라면서. 쑥을 뜯던 작은어머니가 활짝 웃던 모습이 기억난다. 그해 여름 작은어머니가 낳은 아들 형구는 지금 대학 새내기가 되어 캠퍼스를 활보하고 있다.
몇 숟가락 더 떠먹다가 다른 추억도 떠올랐다. 2인조 밴드 ‘백수와 조씨’로 활동하며 절친한 밴드인 ‘미쓰매치’ 형들과 함께 자주 공연을 했다. 이맘때면 항상 열리는 통영 국제음악제의 프린지 페스티벌에 2년 동안 참여를 했다.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건 차비와 숙소밖에 없었지만, 봄날 싱숭생숭해진 마음을 달래기에는 통영만한 관광지가 없었기에 우리는 그저 여행 삼아 통영으로 떠난 것이다. 거기서 공연을 어떻게 했는지보다는 형들과 사 먹은 통영의 맛있는 음식들이 더 기억에 남는다. 낮에는 충무김밥을 먹고, 밤이면 시장에서 회를 떠다 먹고, 아침이면 봄에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통영의 도다리쑥국으로 해장을 했다. 쑥국도 훌륭한데, 제철을 맞아 살이 오른 도다리까지 한마리 들어 있으니, 전날 술을 더 먹었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속이 풀렸다.
국물 한 숟가락으로 이런 추억들이 돌연 떠오르는 것을 보면, 음식이 가진 힘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그냥 손쉽게 끓여낸 국 한 그릇일 뿐인데 말이다. 앞으로 맞이할 수많은 봄마다 나는 또 쑥 내음을 맡겠지. 그럴 때마다 그 이파리 사이사이에 또 어떤 추억들을 숨겨놓게 될까. 어떤 표정으로 그 추억들을 꺼내어 보게 될까.
강백수 인디뮤지션·시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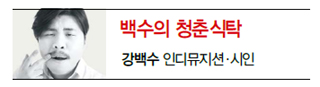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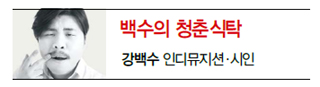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