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5.14 19:45
수정 : 2014.05.15 10:44
 |
|
사진 강백수 제공
|
[매거진 esc] 백수의 청춘식탁
연휴를 맞아 친구들과 바람을 쐬러 다녀왔다. 철원에 있는 소박한 통나무 펜션인데, 과 선배의 부모님이 하시던 곳이라 학부 시절 자주 엠티를 가던 곳이었다.
학원 강사로 일할 적에 고등학생 제자들에게 “대학 가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니?”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연애요!” 다음으로 많이 한 대답이 바로 “엠티(MT) 가 보고 싶어요!”였다. 나 역시 엠티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아이였다. 1학기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합격하는 바람에 입학을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기다렸기에 기대감은 더욱 컸다. 더군다나 우리 과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은 국문과이니.
물론 실제 엠티의 모습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다. 모닥불을 피워두고 기타를 튕기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청춘드라마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 소주를 박스로 사서 게임을 하며 언제 저걸 다 먹나 싶을 정도로 쌓여 있던 그 술들을 다 먹어치우는 것이 엠티의 본질이었다. 멤버십 트레이닝(Membership Training)이 아니라 ‘마시고 토하고’의 약자라던 선배들의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술을 마시다 보면 몇몇은 짝을 지어 사라졌다가 손을 잡고 돌아오기도 하고, 또 선배가 된 누군가는 어디서 났는지 기타를 주워들고 알코올 냄새 나는 노래를 목이 터져라 부르기도 하고.
그럼에도 나는 그 엠티를 참 좋아했다. 학교에 다니던 5년 동안 못해도 매년 3번 정도는 엠티를 갔으니 총 한 달 정도는 엠티 장소에 있었던 것이라 생각해도 되겠다. 처음에 대규모 엠티가 좋았던 것은 내가 스무살이었기 때문이다.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방에 모여 왁자지껄 떠들고 논다는 것, 그중에 나를 설레게 하는 예쁜 아이가 있다는 것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다.
그러다 내가 ‘기타를 주워들고 나타나는 선배’가 될 무렵부터는 소규모의 엠티를 좋아하게 되었다. 동기들끼리, 편한 동아리 사람들끼리 공기 좋은 곳에서 천천히 술을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올 수 있는 엠티. 해가 떠오를 무렵의 하늘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강촌에서 처음 알았다. 무슨 이야기를 그리 나누느라 떠오르는 해를 그리도 아쉬워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는 거기서 마음을 내보이는 친구가 되었고, 때로는 사랑을 하기도 했다.
엠티에서 먹었던 음식들의 맛도 기억이 난다. 학교 앞 시장에서 한 근에 4000원 주고 샀던 ‘엠티고기’가 어느 부위였는지 아직도 알 수 없지만, 여럿이서 드글드글 붙어서 먹던 설익거나 탄 고기가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다음날 쓰린 속을 부여잡고 일어나면, 일찍 기상한 몇몇이 큰 솥에다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당시 엠티 회비는 ‘2만원+쌀 한 봉지+라면 한 봉지’였다. 집에서 가져온 종류도 다양한 라면 수십개가 큰 솥에서 한 번에 끓고 있노라면, 술에 취해 송장처럼 자던 이들도 그 냄새에 하나둘 신음을 뱉으며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1인당 2만원보다는 더 많은 회비를 모아 친구들과 더 좋은 곳으로 놀러가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스무살 무렵 엠티에서 느꼈던 그 기분은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것이다. 대학원 연구실에 있다가 엠티를 떠나는 후배들을 보면 밤새 과음을 할 것이 분명할 그들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괜히 질투가 나기도 한다. 날씨도 좋아서 엠티니 농활이니 많이들 떠날 텐데, 다들 무탈하게 좋은 추억들 많이 쌓으시길.
강백수 인디뮤지션·시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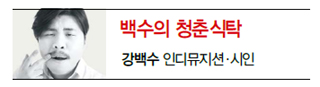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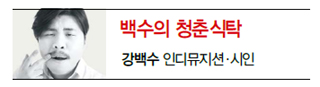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