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6.11 19:25
수정 : 2014.06.12 09:56
 |
|
사진 강백수 제공
|
[매거진 esc] 백수의 청춘식탁
최근에 나는 석사논문 때문에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음식 해먹는 것을 좋아해서 되도록 직접 해먹으려고 애쓰는 편이지만, 요즘같이 도저히 여유가 없는 때에는 배달 음식을 애용한다. 배달 안 되는 음식이 없는 시대이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중화요리. 짜장면, 짬뽕, 볶음밥, 짬뽕밥 등등 대중적인 메뉴들을 차례로 섭렵하다가 며칠 전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잡채밥이었다.
나는 잡채밥을 보면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다. 나의 은사이신 원로 시인 이승훈 선생님, 내게 시의 길을 처음 열어주신 분이다. 하는 것 없이 술만 마시면서 보내던 대학 시절, 정년을 앞둔 노교수님이시던 선생님의 시 창작 수업을 들으면서 고교 시절 이후 처음으로 시를 쓰게 되었고, 몇 차례 칭찬을 받으면서 시인으로 등단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게 되었다. 버스에서건 지하철에서건 시를 써서 선생님의 연구실에 찾아갔다. 옛날 박목월 선생님이 쓰시던 연구실에서 박목월 선생님의 제자이자 대시인이신 선생님께 시를 보여드리는 일이 나는 항상 감개무량했다.
선생님은 매일 오전, 같은 중화요리 집에서 잡채밥을 시켜 잡수셨다. 아침 열시면 연구실 문을 잠그고 잡채밥을 반 정도만 드시고 잠시 낮잠을 주무신 것이 이십 년이 넘었다고 들었다. 왜 하필 잡채밥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매일 같은 것을 드신다는 것이 마냥 신기했다.
취향이 심화되면 강박이 되기도 하던가, 선생님은 잡채밥 외에도 강박에 가까운 취향을 몇 가지 더 갖고 계셨다. 저녁이 되면 맥주를 드시는데, 하이트맥주에 멸치와 김 안주만을 즐기셨다. 테이블에 다른 안주들이 놓여 있어도 멸치와 김만을 집어드셨다. 꼬불꼬불한 글씨로 글을 쓰실 때, 항상 파란색 모나미 볼펜을 끝을 조금 잘라 사용하셨다. 담배는 항상 얇은 ‘에세’를 피우셨다. 대시인은 자신의 몸처럼 가느다란 담배를 피우는 모습마저 시적이었고, 나를 비롯한 제자들의 눈에 이러한 괴벽들은 모두 매혹적으로 보였다.
이처럼 항상 같은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멋져 보이는 사례는 흔하다. 007의 제임스 본드의 ‘마티니, 젓지 말고 흔들어서’라는 주문도, 영국의 록 뮤지션 피트 도허티가 항상 쓰고 다니는 페도라 모자도, 내게도 하나쯤 있었으면 싶은 트레이드마크인 것이다.
쑥스러운 이야기이지만 때로는 이러한 강박을 가지려고 애써 보기도 했다. ‘난 이것만 먹어’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것만’ 먹고 다닌 적도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다. 강박 수준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잡채밥’만큼 특이하거나, ‘20년’만큼 오래 유지해야 하는데, 독특한 것을 오랫동안 고집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그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니 말이다.
물론 선생님처럼 거장이 된다면 내가 애용하는 사소한 물건들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나의 취향들이 그런 매혹적인 강박으로 보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쩌면 그 매혹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잡채밥’이나 ‘20년’이 아니라 선생님이 갖고 계신 그 아우라일 수도 있다. 나도 70살까지 글을 쓰고 노래를 부르면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
지금은 정년퇴임을 하시고, 칠순이 넘으신 선생님.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은 항상 선생님께서 잡채밥을 시켜 드시던 시간인데, 오늘도 역시 소년 같은 선생님은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려고 문을 잠그고 홀로 잡채밥을 잡숫고 계실까? 오랜만에 선생님께 전화를 한 통을 드려야겠다.
강백수 인디뮤지션·시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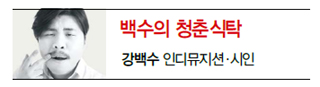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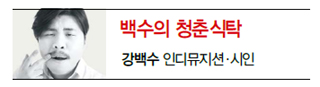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