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7.02 19:22
수정 : 2014.07.03 10:12
 |
|
사진 박미향 기자
|
[매거진 esc] 백수의 청춘식탁
최근 싸이의 신곡 ‘행오버’(Hangover)가 화제다. 덕분에 숙취가 영어로 ‘Hangover’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언제 영어권 국가에서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필경 자주 사용할 단어가 될 것 같다. 잦은 과음은 곧 잦은 숙취이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나는 ‘행오버’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니 말이다.
스물다섯살 정도였을 것이다. 인간의 간은 소모품이나 다름없어서 사용할수록 그 기능이 약해진다는 것을 처음 깨달을 무렵 나는 처음으로 숙취라는 낯선 경험을 했다. 천장이 회전하고 임신부처럼 헛구역질을 하며 좀비 같은 몰골로 물을 찾게 되는 그 현상을 마주하는 빈도는 점점 많아져 갔다.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라는 노래가 있다. 이별 뒤의 아픔까지도 사랑이라는 행위에 포함되니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다. 술을 사랑하는 사내라면 응당 ‘그 숙취까지 사랑해야 하는 거야’라고 말을 하면서도 도저히 사랑을 하기가 힘들어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해장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사실 나트륨이 많은 뼈해장국이나 우거지해장국은 숙취 해소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가뜩이나 목이 말라 죽겠는데 짠 것을 먹으면 물을 더 찾게 되지 않는가! 커피를 마시면 위가 더 쓰리고, 편의점 냉장고의 한 칸을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숙취 해소 음료는 특유의 괴상한 맛으로 구토를 유발함으로써 음주 후 속을 편하게 다스린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같다. 어떤 선배는 느끼한 피자로, 어떤 친구는 기름진 삼겹살로 해장을 한다는데 그 또한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찾아 헤맨 파랑새가 결국은 집에 있더라는 동화 속 이야기처럼, 해답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 나와 가장 비슷한 위장을 가지고, 나처럼 술을 사랑하며, 나보다 훨씬 먼저 해장에 대한 고민을 갖고 그 정답에 도달한 이가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이다.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차리시던 아침상에 항상 밍밍한 국이 놓여 있던 까닭을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때로는 콩나물로, 때로는 오징어와 무로, 그 밍밍한 국에 흰쌀밥을 말아 먹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처방이었던 것이다. 특히 아버지는 재첩을 사랑하시는데, 숙취가 심했던 어느 아침에 재첩국을 한 숟가락 입에 머금는 순간 ‘아, 나는 역시 아버지 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저마다 해장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사실 우리 모두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 될 일이다. “술을 그렇게 많이 안 마시면 되잖아?” 그런데 어디 그게 그렇게 되던가. 밀려오는 숙취 속에서 “내가 다시 술을 이렇게 마시면 사람이 아니고 개다!”라는 선언을 얼마나 많이 했던가. 그리고 그 선언은 얼마나 공허하고 부질없던가. 바로 그날 밤 다시 술을 마시고 개가 되어버리는 언행일치를 행하기 마련이니 말이다. 역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강백수 인디뮤지션·시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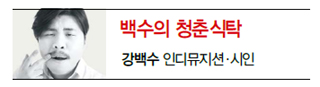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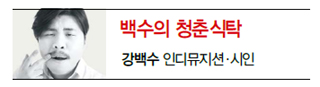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