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7.30 18:54
수정 : 2014.07.31 13:31
 |
|
사진 AP 연합뉴스
|
[매거진 esc] 김소민의 타향살이
독일 국기가 이렇게 많이 날린 건 여기 와 2년 만에 처음이다. 국경일에도 내거는 일이 없다. 독일인 베른트는 “지은 죄 탓에 ‘국가, 애국’ 따위 잘못 말했다간 극우로 오해받기 십상인 까닭”이라고 했다. 학교에서도 ‘자랑스러운 독일인’은 배워본 적 없단다. 그간 꾹꾹 참아 왔던 국기 게양 욕망이 폭발했는지 결승에서 이긴 날 새벽 1시 본 시내는 국기와 맥주가 점령했다. 곤드레만드레 청춘들은 “독일 독일” 주구장창 반복하며 신 내린 듯 뛰었다. 그중 한명이 “나에게 W를 줘” 그러면 다들 따라 외치는데 그렇게 한 글자씩 ‘세계 최고’(벨트마이스터, Weltmeister)를 만들며 날밤을 새웠다. 베른트는 1990년 월드컵 우승 때만 해도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했다. 대놓고 “독일 독일” 하는 이도 거의 없었고 그랬다간 묘한 죄책감이 스멀거렸을 거란다.
그들은 입을 다문 채였다. 터키계 이민 2세 국가대표 메수트 외질, 튀니지계 사미 케디라, 가나계 제롬 보아텡이다. 이번 월드컵 매 경기 전 국가가 울려 퍼질 때였다. 곧 트위터가 불났다. “왜 국가 안 불러. 국가대표로 뛰면 의무지.” “융화의 모범을 보여야지. 국가 가사나 배워라.” 맞불도 붙었다. “이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역겹다.” 언론이 올라탔다. 지난달 26일치 <디 벨트>에 카트린 슈푀어(Kathrin Spoerr)는 이 셋을 두고 “꼭 부모가 싸워 화난 청소년 같았다”며 “당신들의 침묵은 독일이 우리 모두의 조국이란 느낌에 상처를 냈다”고 비판했다. 같은 지면에 홀거 크라이틀링(Holger Kreitling)은 “나도 한 번도 국가를 불러본 적이 없다”며 “그건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라고 반격했다. 독일이 우승한 1974년 월드컵 때엔 경기 전 국가, 단 한명의 선수도 따라 부르지 않았다. 크라이틀링은 “국가 안 부른다고 애국심 없는 거 아니다”라며 “남의 입술 움직임 따져 애국 여부 판단하겠다는 사람들이야말로 애국심이 없는 자들”이라고 덧붙였다.
이 논란 동안 내 머릿속엔 한 독일인이 무심결에 내뱉었던 말이 맴돌았다. 외질은 부진했다. 왼쪽 돌파로 좋은 도움을 끌어내긴 했지만 골은 변비 같았다. 5~6명이 목에 독일 깃발이 새겨진 호루라기를 차고 함께 중계를 봤다. 외질이 힘 못 쓰는 게 부상 때문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갔는데 그때 한 사람이 소시지에 겨자를 찍으며 말했다. “별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나 보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외질은 터키인이었다. 나는 그때 진짜 융화의 적은 무엇인가 생각했다.
이겼다. 그래서 ‘언제 적 논란’이 됐다. 국가대표팀이 돌아오는 날 브란덴부르크 앞은 터져 나갔다. 외질, 케디라, 보아텡도 영웅들 속에 있었다. 그들은 이겨 독일인이었다.
이 삼인방은 왜 입을 닫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계 2세이자 독일 유소년 아이스하키 대표선수였던 마르틴 현(Martin Hyun)은 지난 24일 <도이칠란트라디오 쿨투어>에 자신은 이해할 수 있다고 기고했다. “나는 독일인임이 자랑스럽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만우절 농담처럼 받아들인다. 운동선수로 알아준다고 사회에서 일원으로 끌어안아주는 건 아니었다.” 그는 “이 땅을 사랑하는 이주민을 의심하지 않고 그 비판을 받아들일 때 독일은 극우로 몰리는 공포에서 해방될 것”이라 썼다.
김소민 독일 유학생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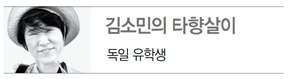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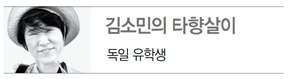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