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11.12 20:45
수정 : 2014.11.12 20:45
 |
|
사진 김소민 제공
|
[매거진 esc] 김소민의 타향살이
“팔아.” “못 팔아.” 3년째다. 한스(78)와 크리스텔(76)이 2층 단독주택(사진)을 놓고 부동산 전화번호를 누르다 말다 한 게 그렇다. 20평 남짓한 마당에서 감자 캐며 허리 후들거릴 땐 분명 “이놈의 집 판다” 했다가 그 감자 창고에 쌓이면 “어떻게 지은 집인데…”로 돌아섰다. 추레한 구식 집인데 둘에겐 그대로 인생이다. 피난 와 맨땅에 제 손으로 세운 집이다. 거기서 자란 아기들이 분가하고 불혹을 넘기는 사이 한스의 심장은 가끔 박자를 놓쳤고 크리스텔의 무릎엔 인공관절이 박혔다. 이제 버겁다. 둘 중 하나 먼저 가기 전에 작은 아파트로 옮기기로 머리로는 이미 결정했다. 겨울이 오고 있다.
한스와 크리스텔의 고향은 동프로이센이다. 2차 세계대전 뒤 폴란드와 러시아로 찢어져 넘어간 땅이다. 러시아군 피해 서쪽으로 피난 떠날 때 한스가 8살, 크리스텔은 6살이었다. 걷다 화물칸에 실려 가다 하며 북해 부근까지 오는 데 6개월 걸렸다. 화물칸 철문이 닫히면 암흑이었다. 기차가 멈추면 숲으로 도망쳤다. 그 공포 탓에 둘은 평생 비행기를 못 탔다. 문이 닫히고 내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거기가 어디건 그때 그 화물칸이 돼 버렸다.
도착한 서쪽 땅, 크리스텔이 기억하는 건 머릿니다. 농가 마구간 짚 위에서 떼로 자니 이들이 이 머리에서 저 머리로 튀어 다녔다. 또 하나는 동네 언니가 버터 한 조각 구해 설탕 넣고 만들어준 사탕, 그 기적 같은 맛이다. 농사일 도우며 농가에 기식하다 군인들이 두고 간 합판 숙소에서 지내게 됐다. 방 한 칸에 9명이 살았다. 그때 배곯은 기억에 한스와 크리스텔 집 지하 창고엔 아직도 깡통 식품이 가득하다. 전쟁이 또 터질 때를 대비해서다.
더 서쪽으로 가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피난 가족인 한스와 크리스텔은 독일 서쪽 라인강 주변 공동주택 이웃으로 만났다. 어느 저녁 자전거 세우다 입 맞추고 연인이 됐다. 신혼부부에겐 집이 없었다. 운 좋게 삼촌이 허허벌판 땅 한 뙈기 줬다. 은행에서 돈을 끌어다 집 골격만 세웠는데 안은 시멘트 바닥이었다. 첫아이는 그 바닥 기어 다니다 무릎이 해졌다.
기차 검표원이던 한스가 한 달에 500마르크를 받으면 400마르크가 은행으로 직행하던 시절이었다. “일이 끝나면 담배가 간절했어. 한 개비씩 팔았거든. 딱 한 개비만 살까? 안 돼. 그 돈 모아 시멘트 사야지.”
그 집 마당엔 시멘트와 모래 섞는 기계가 돌아갔다. 두 아들은 걸음마 배우곤 삽질했다. 한스 손으로 격자모양 마루를 맞춰 넣고 집 안에 문을 만들어 달았다. 45년 지났는데 이 집 아직도 다 완성하지 못했단다.
습기 타고 추위가 스멀거리는 겨울 초입, 한스는 아들에게 전화했다. “부동산에 내놨다.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가라.” 1972년부터 모은 잡지 <월간 정원>만 방 한쪽 벽 4분의 1을 채운다. 아들의 받아쓰기 공책까지 그대로다. 옮겨갈 집은 20여평이니 다 처분해야 한다. “아, ‘슬픈 돼지’가 아직도 있네. 마지막 장면 기억나.” 말하는 아들 목소리가 습기 찼다. 종이 노래진 10여쪽 그림동화책을 꺼내 주는 한스 눈이 벌겋다.
온수로 샤워하려면 물 달궈질 때까지 15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집이다. 새 주인은 아마도 헐거나 완전히 리모델링해 버릴 거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래도 여기 살 때 행복했잖아요.”
김소민 독일 유학생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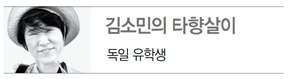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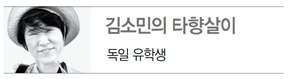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