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8.28 19:49
수정 : 2013.08.29 11:34
 |
|
남현지 제공
|
[매거진 esc] 시계태엽 패션
고등학생 때부터 밴드활동을 해왔다. 연주 솜씨가 없다는 것은 진작에 깨달았지만, 여전히 음악이 유일한 취미로 남아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다. 주변에도 취미로 밴드를 하는 친구들이 몇 있는데, 최근 친구가 결성한 한 밴드의 티셔츠를 샀다. 밴드의 이름은 세컨드 뱅크럽시, 직역하면 ‘두 번째 파산’이다. 개인이 소량으로 제작했기에 시중의 비슷한 티셔츠보다 값은 조금 비쌌지만, 유행하는 단어로 말하자면, 친구의 밴드를 ‘리스펙트’(존중)하기 위해 구입했다.
친구가 쉽게 티셔츠를 제작할 수 있었던 건 이제는 너무나도 보편화된 주문제작 방식 덕분이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혹은 동대문을 비롯한 서울 시내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티셔츠를 제작할 수 있다. 어설프게 제작해서 한두 번 입고 버리는 티셔츠가 아니라 기성 제품만큼 품질이 좋아진 것은 물론, 디자인 또한 상향 평준화되어 운동회나 야유회의 단체 티셔츠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제작 티셔츠의 품질이 좋아진 것은 ‘트리플에이’, ‘헤인스’, ‘프루트 오브 더 룸’ 등의 무지 티셔츠가 인기를 얻으면서부터다. 이 브랜드의 제품들은 싼 가격에 견줘 품질과 스타일이 좋다. 트리플에이의 티셔츠는 목 부분이 늘어나지 않고 원단이 견고하기로 유명하고, 아시아인에게 헐렁하게 딱 떨어지는 피트감 때문에 국내외 스트리트 브랜드에서 선호도가 높다. 사진의 티셔츠도 트리플에이의 무지 티셔츠에 고무 날염 방식을 사용했다. 고무 날염은 실크스크린과 원리가 비슷해, 프린트할 디자인의 나무틀을 만들고 스퀴즈(고무를 끼운 나무판)를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며 염료를 밀어내는 방식이다. 그러면 나무틀의 도안이 티셔츠에 찍힌다.
원래 밴드 티셔츠는 밴드를 홍보하거나 순회공연 등을 기념하려고 제작된다. 밴드 앨범의 커버 디자인이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로고, 그림 등이 디자인 모티브로 쓰인다. 패션에서 고전이 된 밴드 티셔츠도 엄청나게 많은데, 록, 펑크, 메탈에 이르기까지 전설적인 밴드의 수만큼 전설적인 티셔츠가 있다. 라몬스, 아이언 메이든, 미스피츠, 건스 앤 로지스 등 수십년 전부터 활동한 밴드의 티셔츠 디자인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매번 런웨이에서 재해석되는 걸 보면 밴드 티셔츠가 패션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 있다. 그래서 티셔츠를 탄생시킨 밴드는 잘 모르더라도 디자인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많다.
영국의 펑크 록 밴드 ‘조이 디비전’을 대표하는 티셔츠는 1979년 발매된 앨범 ‘언논 플레저스’의 아트워크가 그려져 있다. 워낙 유명해서 패러디가 많이 되기도 하는데, 밴드의 이름과 앨범명을 ‘밴드를 모른다면(Don’t know the band?) 티셔츠를 입지 마(Don’t wear the shirt)’라는 문구로 대체한 티셔츠도 있다. 입고 있는 티셔츠의 밴드 음악을 들어본 적도 없이, 즉 ‘리스펙트’ 없이 티셔츠를 입는 사람들에 대한 조롱을 담은 것이다. 그 마음도 십분 이해한다. 나 또한 나름의 의미가 담긴 티셔츠를 흰 글씨가 새겨진 수많은 검정 티셔츠와 비교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남현지 디어매거진 편집장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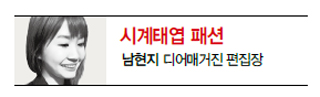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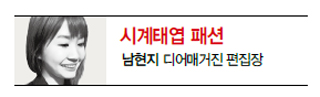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