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12.18 20:37
수정 : 2013.12.19 17:00
 |
|
사진 남현지 제공
|
[매거진 esc] 시계 태엽 패션
세상엔 수많은 셔츠의 종류가 존재한다. 소재, 디자인, 입는 때에 따라 이름이 붙는데 그중 하나로 ‘워크(work)셔츠’가 있다. 이름처럼 일을 할 때 입는 셔츠라는 의미다. 워크셔츠가 많이 생산되던 시기는 100년 전, 산업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철로를 깔고 광산이나 공장에서 일할 때 편한 옷은 아무래도 오버롤(멜빵바지)처럼 거치적거리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는 옷이나 튼튼한 직물 소재의 셔츠, 재킷, 데님 등이었다. 이때의 옷은 10년 단위로 유행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 셔츠에 주머니가 하나만 달린 옷은 1910년대 전, 두 개 달린 것은 20년대까지의 전형적인 디자인이었다. 또한 셔츠의 칼라 디자인도 계속 바뀌었는데, 라운드 넥 디자인은 1900년대 초부터 20년대까지, 턱밑에 달려 칼라를 세울 수 있는 친스트랩(턱끈)은 1910년대부터 1930년대 사이에 주로 더해졌다. 대부분의 남성복 브랜드들이 이 몇십년간의 유산을 차용해가며 워크셔츠를 내놓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포스트 오버롤스’라는 브랜드의 셔츠다. 정확히 말하면 ‘풀오버(뒤집어써서 입는) 워크셔츠’다. 지난여름 홍대 ‘와일드혹스’에서 구매했다. 무엇을 사려고 처음 갔다기보다는 수십년 전의 오리지널 빈티지를 구비해놓았다는 말에 구경하러 갔었다. 하지만 벽에 걸린 검정색 셔츠가 포스트 오버롤스인 걸 듣자마자 마음이 동했다. 이 브랜드를 나에게 처음 알려준 사람은 빈티지 숍에서 우연히 만난 일본 아저씨였는데, 미숙한 영어와 일본어로 긴 시간 동안 여러 주제로 대화한 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포스트 오버롤스는 다케시 오부치가 1993년 뉴욕에서 만든 브랜드다. 1920~30년대 미국의 워크웨어, 밀리터리웨어, 아웃도어웨어 빈티지에서 영감을 받아 옷을 만든다.
흰색 단추가 세 개, 부들부들한 면에 큼직한 한 개의 주머니, 포인트가 되는 흰색 스티치, 칼라 부분에 달린 친스트랩까지, 내가 산 옷은 1920년대 워크셔츠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 면 100%의 소재라 부드럽고, 막 입어도 다릴 필요가 없는 옷이다. 옆선의 사이드 거싯(튼튼함을 위해 삼각형으로 덧댄 천) 부분도 흰색 스티치로 튼튼하게 박혀 있다.
워크웨어는 내구성을 요하며, 많은 사람들을 위한 유니폼이었기에 이런 디테일과 디자인이 생겼다. 당시 급격히 증가하는 블루칼라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의복회사들이 고안한 것이다. 서스펜더(멜빵)나, 신치 백(뒷허리조임끈), 버클, 서스펜더를 달 수 있는 허리춤의 단추 등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급되었던 옷이었던 만큼 사이즈의 세분화보다는 이런 장치로 개개인의 사이즈에 맞게 입어야 했던 당시의 상황이 그 이유다.
한국에서도 워크웨어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들이 있다. 과거에서 소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모두 엇비슷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엔 각자의 개성적 해석이 그제야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누군가에겐 세부 요소(디테일)에 담긴 이야기가 구매로 이어지는 가장 큰 매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나친 설명은 매력을 반감시킨다. 수많은 브랜드 속 승패의 관건은 누가 더 그때와 똑같이 재현했는지, 100년 전의 숨겨진 역사를 알고 옷을 만든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차별성으로 과거의 유산을 멋지게 현대화하는 것이다.
남현지 디어매거진 편집장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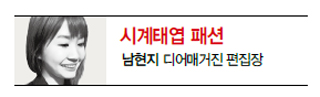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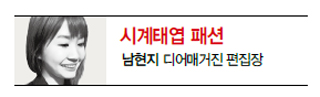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