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1.22 20:05
수정 : 2014.01.23 10:00
[매거진 esc] 시계태엽 패션
작년 가을, 도쿄 아트북 페어에 참가하러 처음 일본을 방문했다. 빡빡한 행사 일정 때문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진 못했다. 도쿄를 떠나는 날 비행기를 타기 전 잠시 여유가 있었는데, 마지막 행선지로 고른 곳은 다이칸야마였다. 나와 동료들이 만드는 <디어매거진>을 도쿄에서 유일하게 판매하는 쓰타야 서점을 둘러본 뒤, 군데군데 잘 알려지지 않은 편집매장 몇 군데를 구경하려고 나선 길이었다. 캐리어와 짐을 바리바리 끌고 나카메구로역에 내려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하나라도 더 구경하려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데 땀은 쏟아지고 팔이 빠질 듯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까지 내렸다. 역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한 매장을 스쳐지나갔는데, 여행책자에도 나왔던 ‘할리우드 랜치 마켓’을 만났다. 기무라 다쿠야가 좋아하는 편집매장이라고 쓰여 있던 것이 기억났지만, 비를 맞고 있는데 구경은 무슨 구경.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우연찮게도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일본에 와 있다. 이번엔 그때 지나친 할리우드 랜치 마켓에 들러 가방 하나를 살 수 있었다.
요즘은 ‘시즌오프’ 기간이라 대부분의 상점에서 세일을 한다. 사진의 가방도 거의 반값에 가까운 가격에 샀다. ‘이삭 앤드 잉거’(Isak and Inger)라는 캐나다 브랜드인데, 장갑·가방·모자·신발 등을 토론토 공방에서 모두 수공예로 만든다. 덮개는 스웨이드, 가방을 두른 끈도 가죽으로 만들고 정교하지 않고 투박한 멋이 더욱 손맛을 느끼게 해준다.
이 가방을 집어 들 때 비슷한 원단이 쓰인 가방이 여럿 있었다. 다들 전통 인디언 문양을 연상시키는 패턴들이었는데, 펠트의 촉감과 비슷한 원단에 색색의 기하학적 모양이었다. 이를 패션에서는 ‘나바호 패턴’으로 부르며, 가장 유명한 것은 ‘펜들턴’이다. 펜들턴은 1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브랜드로, 한 영국인이 미국 토착 원주민들에게 울로 만든 침대용 모포를 판매하려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회사는 기존의 모포 디자인 대신, 지역 사람들이 선호하던 색에 기하학적 패턴을 적용했다. 무늬의 의미는 부족의 종교적, 정신적 의미를 담는 것이었기에 상업적 의미와 존재의 의미, 두가지를 함께 거머쥘 수 있었다. 펜들턴은 인디언족인 나바호인들의 수공예 담요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고, 그 뒤 이 원단은 점차 옷에 부분적으로 쓰이면서 패션의 한 카테고리로 자리잡았다. 현재는 수많은 브랜드들과 협업(컬래버레이션)하고, 자체 제품을 생산하며 원단 브랜드의 지평을 더욱 넓히고 있다. 제작 방법 또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미국 전역에서 생산되는 울을 모직 공장인 ‘울른 밀스’에서 염색하고, 양털을 잣기 전 공정인 ‘소모’를 하고, 방적하고, 직물을 짜고, 마무리한다.
펜들턴을 비롯한 인디언 문양의 원단이 원단만으로 자체의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고 오랜 시간 사라지지 않는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본다. 가장 정답에 가까운 이유는 ‘시간의 축적’이 아닐까 한다. 때로 묵묵히 지나온 세월은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매력으로 다가온다. 손으로 만든 물건도 비슷하다. 예전과 거의 다름없는 도구와 재료, 방법을 쓰는데다 제작이 완료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의 흐름을 견뎌야 한다. 낯선 곳에서 만난 작은 가방에서 새삼 시간과 수제품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남현지 디어매거진 편집장, 사진 남현지 제공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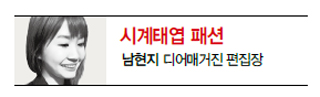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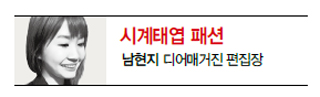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