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2.12 20:06
수정 : 2014.02.13 11:30
 |
|
'밀리너리’(Millinery) 모자.
|
[매거진 esc] 시계 태엽 패션
국내에 생소한 패션 개념 중 하나가 ‘밀리너리’(Millinery)다. 사전적 의미는 여성 모자 제작점 혹은 모자 제작인데, 밀리너(Milliner)는 여성 모자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고객들에게 모자를 제공하는 사람을 통칭한다. 외국 패션대학에는 세분화된 전공 수업 중 밀리너리가 있을 만큼 패션에서 모자에 대한 중요도가 높고 모자만을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와 디자이너가 많다.
20세기 패션계에서 유명한 족적을 남긴 밀리너이자 패션에 대한 나의 지평을 넓혀준 디자이너로 스티븐 존스와 필립 트레이시가 있다. 학생 때 책을 보다가 이탈리아의 유명 패션 에디터 안나 피아지가 쓴 스티븐 존스의 특이한 모자들이나, 필립 트레이시가 2008년 봄/여름 알렉산더 매퀸의 컬렉션을 위해 만든, 얼굴 주변을 빨간 나비가 빽빽이 둘러싼 모자를 보고서 눈이 번쩍 뜨였다. 이들은 모자가 단순히 액세서리의 한 종류가 아니라, 그 자체로 패션의 정의와 개념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런웨이를 걷는 모델의 머리 위에서 하나의 조각과도 같은 그들의 작품을 보며, 세상엔 방한을 위한 모자보다 더 가치있는 모자가 많음을 깨달았다.
사진은 미국의 모자 브랜드 ‘구린 브로스’의 밀짚모자다. 항상 여행의 테마가 패션숍 순례에 가까운 나는 이 모자를 산 날도 뉴욕 웨스트빌리지에서 가게를 전전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구경한 가게엔 챙이 거대하고 우아한 ‘플로피 해트’부터 챙이 짧고 종 모양을 한 ‘클로슈 해트’, 일명 빵모자라 불리는 ‘뉴스보이 캡’ 등 여러가지 모자가 진열되어 있었다. 가게가 문을 닫는 시간에 가까스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리저리 모자를 써보던 중 갑자기 모자를 파는 직원이 오늘은 금요일이니 위스키 한잔 하지 않겠냐며, 나무로 만들어진 계산대 밑에서 위스키를 주섬주섬 꺼냈다. 그동안 나머지 직원은 종이로 정성스레 모자를 싸고 모자가 구겨지지 않게 해트 박스에 모자를 담아 주었다. 알딸딸해진 기운으로 모자를 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인사동이나 삼청동의 수제 모자 가게들이 떠올랐지만, 내가 마주한 가게의 직원들은 마감시간에 빨리 문을 닫기 바빴지 이처럼 여유로운 친절을 베풀진 않았다.
구린 브로스의 창업자는 1895년 고객을 위한 맞춤 모자를 제작하면서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보통 수제 모자 제작이 그렇듯 머리 모양을 한 나무통을 마네킹 삼았다. 이후 앨프리드와 테드 구린 형제가 사업을 이어받아 비로소 구린 브로스가 되었다. 그 뒤로도 계속 가족사업으로 이어졌고 시대에 맞춰 제품군을 확장해오며 지금의 구린 브로스가 되었다. 사실 구린 브로스는 밀리너라기보다는 보편적인 모자 제작자를 이르는 ‘해터’(Hatter)에 가깝다. 한때 미국에는 동네에 모자 가게가 많았는데, 친절하고 모자에 대해 박식한 점원들이 고객을 응대하고 모자 가게는 동네 펍이나 이발소와 같은 모임장소였다.
처음 모자에 대한 개념의 지평을 넓혀준 것은 필립 트레이시나 스티븐 존스와 같은 천재적인 밀리너였지만, 내가 쓸 수 있는 보통의 모자를 파는 편안한 가게는 구린 브로스였다. 한국도 이제 구두나 슈트에서 ‘커스텀 메이드’라는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했기에, 이젠 ‘밀리너’ 혹은 ‘해터’(모자 제작자)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하는 디자이너와 브랜드가 많이 생기길 기대해본다.
남현지 디어매거진 편집장
사진 남현지 제공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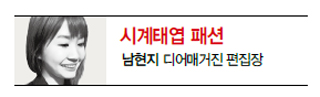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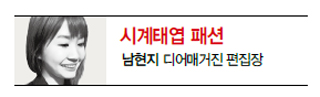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