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5.21 19:15
수정 : 2014.05.22 16:48
 |
|
사진 남현지 제공
|
[매거진 esc] 시계태엽 패션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옷 중 하나는 ‘폴로 셔츠’다. 남녀노소, 장소나 때에 상관없이 편하게 입을 수 있다. 폴로 셔츠의 기본 디자인은 반팔에 칼라가 있고 앞 여밈 부분은 보통 2~3개의 버튼이 달려 있다. ‘테니스 셔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테니스 선수들은 경기용으로 버튼이 달린 긴팔 셔츠를 입었다. 경기할 때 여러모로 불편함이 있어서 프랑스 테니스 선수 ‘르네 라코스트(라코스테)’는 이를 개선하고자 오늘날 테니스 셔츠의 근간이 되는 옷을 만들었다. 흰색 피케 원단, 반팔, 뒷부분 원단을 앞부분보다 더 길게 만든 ‘테니스 테일(꼬리)’ 등을 디자인했다. 그는 이후 브랜드 ‘라코스테’를 만들어 이 디자인의 대중화에 더욱 기여했다.
하지만 ‘폴로 셔츠’라고 불리는 이유는 미국 브랜드 ‘랠프 로런’에서 20세기 후반, 이 디자인의 셔츠를 중점적으로 마케팅했기 때문이다. 폴로 경기 선수들을 위한 옷은 아니었지만 당시 폴로 선수들이 입었던 옷과 비슷하게 만들었다. 라코스테가 그랬던 것처럼 왼쪽 가슴엔 말을 타고 있는 폴로 선수를 자수로 그려 넣었다.
사진의 흰색 폴로 셔츠는 뉴욕 이스트빌리지에 위치한 ‘퍼트리샤 필드’ 매장에서 샀다. 퍼트리샤 필드는 세계적인 스타일리스트로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주인공 캐리의 룩을 만들어 낸 장본인이다. 또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퍼홀릭> 등 다양한 작품에서 존재감을 알렸다. 그녀의 이름을 딴 매장은 1966년 뉴욕대학교 근처 반지하에서 시작했다가 몇 번의 이사 뒤 2006년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지금 퍼트리샤 필드의 숍은 50년 전 그때와 다르지 않다. 놀랄 만큼 파격적이고 생생한 분위기다.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의 트렌드도 반영하고 있는 것에 놀랐다. 칠순을 넘긴 할머니가 진두지휘하는 숍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직원들부터 패션 감각이 남다르다. 아니 ‘남다르다’는 말이 부족하다. 진한 화장을 한 남자 직원이 배꼽티에 핫팬츠, 연두색 그물 스타킹을 신었으니 말이다. 매장은 1층과 지하 1층으로 나뉜다. 1층에는 퍼트리샤 필드의 브랜드 ‘하우스 오브 필드’(House of Field)의 옷과 아티스트 ‘키스 해링’에 영감을 받아 제작한 옷이 특히 눈에 띄었다. 지하에는 수영복, 빈티지, 쇼 의상과 가방, 신발 그리고 미용실이 있다. 레이디 가가가 다녀갔을 만큼 독특한 인테리어가 돋보이고 희한한 가발이 즐비하다. 개성을 뿜어내는 옷들을 뒤적거리던 차에 이 밋밋한 폴로 티셔츠를 발견했다. 이 유명한 퍼트리샤 필드까지 와서 뭐라도 사야겠는데 가격은 원래 24달러에서 반값도 안 되는 단돈 10달러. 사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신기한 점은 퍼트리샤 필드라는 브랜드와 전혀 동떨어진 브랜드 ‘리’(LEE)의 옷이라는 거다. 청바지로 유명한 바로 그 회사다. 물론 개성이 듬뿍 담긴 옷을 산다고 한들 입지 않을 걸 잘 아니까 선뜻 다른 것에 손이 가진 않았다. 개성 넘치는 숍을 동경해 직접 찾아갔으면서도 내가 향유할 수 있던 건 아무 특징이 없는 흰색 셔츠였다. 계산대 앞에 서며 숍의 자유분방한 분위기와 나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다는 생각에 잠시 풀이 죽었다. 그때 옆에 있는 파우치가 눈에 띄었다. 퍼트리샤 필드 제품이었다. 셔츠 가격의 몇 배나 비싼 파우치를 집어 들며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남현지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에디터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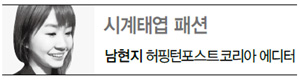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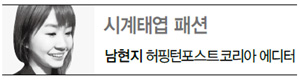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