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6.18 19:15
수정 : 2014.06.19 15:16
 |
|
사진 남현지 제공
|
[매거진 esc] 시계태엽 패션
첫 해외여행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였다. 대학 동기 중 한 명이 자카르타에서 왔는데, 방학을 맞아 당시 친했던 친구들 몇 명 우르르 같이 갔다. 3주 동안 숙식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기에 진짜 최소한의 돈만 들고 갔다. 수년이 흐른 지금에야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남의 집에서 민폐를 끼쳤는지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다. 매일 저녁 낄낄대며 맥주를 마시고 아침엔 거실에 널브러져서 잤으니 친구 부모님께서 참 황당도 하셨지 싶다.
자카르타에 사는 한인들은 ‘몰’(Mall)이란 곳에 자주 간다. 친구도 어렸을 땐 몰에서 하루 종일 놀았단다. 비교적 치안이 안 좋은 밖보다 안전한데다 없는 게 없기 때문이다. 쇼핑몰, 마켓, 식당, 영화관, 심지어 실내에 롤러코스터도 있고 자동차까지 진열해놓고 판다. 처음엔 거의 천국과도 같은 몰의 매력에 빠져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오곤 했다. 자카르타엔 100개가 넘는 몰이 있다고 하는데 시내에서 제일 큰 몰인 ‘클라파가딩’에 가서 하루 종일 숨바꼭질도 했다.
수많은 몰을 돌아다니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전통직물 ‘바틱’으로 만든 옷들이었다. 멀리서 보면 대부분 풀색, 버건디(와인)색으로 칙칙하지만 자세히 보면 기하학적인 패턴과 디자인이 어찌나 무궁무진한지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인도네시아의 바틱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공무원들은 매주 금요일엔 바틱을 입고 출근한다고 한다. 무엇보다 바틱으로 만든 옷은 몸에 헐렁하게 맞고 촉감이 매끄러워 덥고 습한 인도네시아에선 제격인 패션이다. 그런데 바틱 옷의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생각보다 비쌌기 때문이다. 바틱의 문양은 녹인 왁스를 가지고 일일이 그리거나 도장으로 찍는다. 원단을 염색하면 왁스가 묻은 부분엔 염료 처리가 되지 않아 문양이 만들어진다. 일종의 방염(resist printing) 기술이다. 내가 본 바틱은 손으로 일일이 만든 전통 바틱인데다 진열된 원단을 골라 개인맞춤이 가능한 고급이었다. 돈 아끼려고 남의 집에 눌러앉은 주제에 인도네시아 전통의상 한번 입어보겠다고 큰 출혈을 감수할 용기는 없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싼 걸 사자니 거적때기를 두른 모습이 따로 없었다.
‘바틱풍’의 바지를 사게 된 건 아냐르 해변에서였다. 사람이 거의 없는 해변의 한 좌판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옷가지들을 팔고 있었다. 친구는 바틱풍의 셔츠 두 개, 나는 사진의 바지를 샀다. 5000원이 채 안 됐던 것 같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바지는 내 여름용 잠옷이 됐다. 집에서만 입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갈 때도 꼭 챙기게 됐다. 바지를 처음 본 사람들은 촌스럽게 할머니 몸뻬 바지 같은 걸 왜 입고 자느냐고 핀잔을 준다.
얼마 전 어릴 때부터 베던 베개가 찢어져 서럽게 울었다는 남자의 글을 읽었다. 이해가 안 된다는 댓글도 많았는데, 그 심정 십분 이해된다. 아마 베개를 벴던 세월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기분이었을 거다. 이 바지를 입고 잔 지도 햇수로 6년이 됐다. 친구들과 해변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이 바지를 입었고, 한여름 밤 한강을 따라 조깅할 때도, 얼마 전 응급실에 실려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요즘 날씨가 더워져 이 바지를 다시 꺼내 입었다. 시원하고 편하기보단 아무 걱정거리 없었던 20대 초반의 기분으로 매일 잠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남현지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에디터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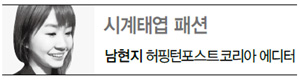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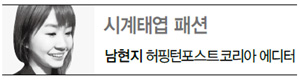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