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7.02 19:18
수정 : 2014.07.03 13:40
 |
|
사진 남현지 제공
|
[매거진 esc] 시계태엽 패션
작년에 진지하게 옷 장사를 할까 생각한 적이 있다. 거창하게 건물을 빌려서 오프라인 매장을 내거나, 직접 디자인한 옷을 팔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바로 브랜드 ‘슈프림’의 제품을 떼어다 파는 것이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캐주얼웨어 브랜드 슈프림은 꾸준히 마니아층에서 인기를 누려왔지만 작년이 그 인기의 절정이었다. 사진의 모자는 매장 가격이 40달러(약 4만원)인데 한국에서는 12만원을 웃도는 가격에 판매됐었다.(지금도 그렇다.) 뭐든 슈프림 제품이라면 한국에서는 3배에 가까운 가격에 팔렸다. 꼼데가르송 같은 인기 브랜드와의 컬래버레이션(협업) 제품이라도 나오면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었다. 오죽하면 작년 슈프림은 ‘만식이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옷 파는 사람들 사이의 은어로 모든 사람(개성이 없다는 조롱도 포함된)이 입는 대중적인 브랜드를 뜻한다. 즉 지금 팔면 디자인이 어떻건 ‘슈프림’이니까 모조리 팔린다는 의미다. 장사를 해야겠다고 느낀 계기는 슈프림의 인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였다.
뉴욕 소호의 라피엣 거리에 위치한 1호 매장에 갔을 때였다. 깨끗이 닦인 거리에서 유독 스케이트보드를 탄 친구들이 떼로 앉아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멀리서도 슈프림 매장인 걸 알 수 있었다. 슈프림은 라스베이거스에 살던 스케이트보더 제임스 제비아가 맨해튼에 와서 만든 브랜드로, 스케이트보더들을 직원으로 고용하며 지역의 스케이트 문화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스케이트보드 ‘씬’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슈프림을 입으니 적어도 스케이트보더들에겐 유니폼 같은 브랜드였다. 대체로 뉴욕의 옷 가게 점원들은 친절한 편인데 어째 슈프림 매장의 직원들만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들 같았던 이유도 알 것 같았다. 그들은 곁에 와서 제품을 설명하는 친절함이나 인사 따윈 없었다. 가게를 들르는 손님들 또한 그들의 쿨함은 익히 알고 있다는 듯 이리저리 옷이나 모자를 걸쳐보고 마음에 들면 계산, 아니면 도로 제자리에 놓고 나가는 식이었다.
어쨌든 슈프림 매장에서 가성비가 제일 좋은 캠프캡(camp cap, 5개의 천 조각과 챙으로 만들어진 모자)을 이것저것 집었다. 친구들이 구매대행을 부탁한 물건도 한가득 샀다. 온라인에서는 한 사람당 같은 제품은 하나 이상 사지 못해 오프라인에서 사는 게 가장 싸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번 시즌이 지난 제품은 재생산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줄을 서서 슈프림을 사는 게 당연했다.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돈을 모아 장사를 하려 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친구들과 합의한 건 각자 수익분배를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 우리가 어디 가서 슈프림을 떼다 판다고 말하지 말자는 거였다. 정식 수입도 아닌데다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터무니없는 이윤을 보고자 했으니 멋있게 보이는 판매자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슈프림의 기조인 ‘쿨함’을 지키려면 슈프림을 팔아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포부와 계획은 딱 거기까지였다.
그렇게 슈프림이라는 브랜드를 잊고 있다 얼마 전 슈프림에서 20주년을 기념해 만든 다큐멘터리 <체리>(cherry)를 봤다. 룩북에 나오던 제이슨 딜, 마크 곤잘레스와 같은 유명한 보더들을 비롯해 슈프림과 함께했던 보더들이 그저 길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욕을 하는 장면을 스스럼없이 보여줬다. 영상은 어떤 특별한 비전을 제시하지도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막’산다. ‘막’ 한다의 절정을 보여줬다. 20년을 걸어온 브랜드의 문화사적 의의 따윈 없었다. 게다가 20주년을 기념해 만든 슈프림의 박스 로고만 덜렁 새겨진 일명 ‘박스티’가 발매 뒤 20만원이 넘는 걸 보니, 자존심이고 뭐고 눈치 보지 말고 ‘막’ 팔고 돈을 벌었다면 슈프림의 정신에 더 비슷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현지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에디터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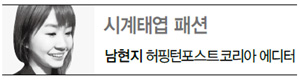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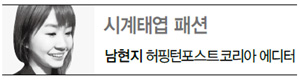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