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7.23 18:54
수정 : 2014.07.24 10:06
 |
|
사진 남현지 제공
|
[매거진 esc] 시계태엽 패션
한달 전 ‘시어서커 데이’에 다녀왔다. 이 패션 행사는 1996년 미국 국회에서 ‘시어서커 서스데이’(Seersucker Thursday)를 지정해 시어서커 원단으로 만든 슈트를 입고 업무를 본 데서 유래한다. 시어서커를 입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공연, 경품 추첨, 술과 음식 등으로 채워지는 사교 파티다. ‘사교’에도, ‘파티’에도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서 구경은 하고 싶은데 선뜻 옷까지 차려입고 가기가 주저됐다. 고민하고 있던 차, 여름이면 자신이 만든 시어서커 옷을 입고 다니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게다가 술과 음식이 공짜고, 내 수준에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충족했으니 별다른 약속도 없는 목요일, 집에만 있을 이유는 없었다.
‘시어서커’는 올록볼록한 주름이 있는 가벼운 면직물이다. ‘지지미’(쫄쫄이)라고도 한다. 세탁하기 편리하고 다리미질이 필요 없다. 오글오글한 주름 덕분에 피부에 달라붙지도 않고 통풍과 열 발산에 탁월해 여름용으로 훌륭한 원단이다. 어렸을 적 어머니가 ‘홈패션’에 일가견이 있으셨다면, 한번쯤 빨간색, 노란색 지지미 원단으로 만든 옷을 입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도 어머니가 빨간색 원피스를 만들어주신 기억이 난다. 물론 패턴을 공부하신 분이 아니기에 앞판·뒤판 딱 두 장으로 연결되는 지극히 단순한 옷이었지만 말이다. 여름에 선풍기에 원피스를 씌우고 바람을 맞는 게 어찌나 시원하던지.
어쨌든 어릴 때 이후로 딱히 시어서커로 된 옷을 사본 적이 없었다. 아디다스에서 산 블루종이 있었는데 긴팔인데다 너무 스포티해 여름 행사용으론 낙제였다. 그래도 시어서커에 대해 기사도 썼는데 티피오(TPO, 시간·장소·상황)에는 맞게 입고 가야 할 것 같아 집 근처에서 급하게 민소매 블라우스를 사서 입고 갔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웬걸, 서울에 이렇게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나 싶었다. 시어서커로 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 모두들 기를 쓰고 발걸음을 한 티가 역력했다. 재밌는 풍경은, 모두가 가로수길에서 흔히 포착될 만한 말쑥하고 날렵한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거짓말 조금 보태, 시대의 아이콘 데이비드 호크니처럼 펑퍼짐하고 수더분하게 시어서커를 입은 사람도 있었다. 물론 스리피스 슈트만 멋있었던 건 아니다. 여성부터 아기까지 남녀노소 각기 다른 시어서커를 뽐냈다. 그렇다고 누가 제일 멋있게 입었나 자랑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암묵적인 규칙을 지켰다는 데 더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았다. 나 또한 “시어서커 입으셨네요”라는 말을 하지도, 듣지도 않았다.
같이 간 친구들의 말도 그렇고 수많은 패션 행사 중 6월의 시어서커 데이는 정말이지 담백했다. 한남동 골목 행사가 열리는 곳만 유독 다른 세계 같았다. 시어서커 데이는 브랜드를 시끄럽게 홍보하는 자리도, 연예인들이 와서 주위가 요란하지도 않기에 나 같은 일반인이 덜 ‘뻘쭘한’ 행사였다. 주최 쪽에서는 내년부터 유료입장으로 전환할까 생각 중이란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적극 찬성이다. 1년에 한번 수십명의 사람이 같은 원단의 옷을 입고 모이는 행사, 게다가 그 분위기가 수수한데다 보는 재미까지 있다면 얼마를 내서든 가야만 한다.
남현지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에디터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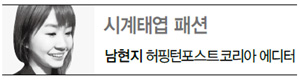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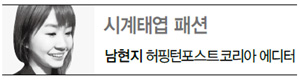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