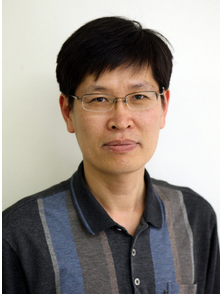 |
|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
대학 때 가까이 지냈던 선배 한 분이 있었다. 지금은 지방대에서 교수를 하는 이 선배가 고교 시절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어 혼쭐났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형사들이 학교까지 와서 날 찾고, 아버지도 오셨지. 그런데 아버지가 형사들 앞에서 버럭 화를 내며 내 따귀를 때리셨어.”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아버지한테 맞은 건 그때가 처음이야. 아버지도 나중에 사과하시더라고.”
불현듯 이 얘기가 떠오른 이유는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나 당시 얘기를 들으며 내가 느꼈던, 놀라움이랄까, 그런 기억은 생생하다. 아버지에게 처음 맞아봤다고? 어린 시절 매를 한 번도 맞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아버지가 날 야단친 뒤 미안하다고 말씀하신 적은? 기억이 없다. 아이의 발그스레한 얼굴을 들여다보다 어느날 그 생각이 났고, 뜬금없이 나도 그렇게 키우고 싶다고 생각했다.
체벌이 교육적 목적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은 뿌리 깊은 것 같다. 서양에는 매를 아끼면 아이를 버린다는 속담이 있다.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에는 서당에서 회초리를 맞는 아이가 나온다. 정말 체벌이 교육적일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내 생각보다 더 ‘어른’이라는 걸 확인하고 놀라곤 한다. 억지를 부리다가도, 차근차근 설명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가 많다. 내 말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리지 않을까 했던 우려가 감동으로 변한다. 그래도 고백하건대, 매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유혹을 받은 순간이 몇 번 있다. 언제일까? 기억이 또렷하지 않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있다. 아빠의 권위가 무시된다고 느낄 때다.
부모의 권위가 무시될 일은 많다. 일찍 자라고 해도 자지 않을 때도 있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에 빠져 있거나 빈둥거릴 때도 있다. 방 좀 치우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놀러 나갔다간 늦도록 연락 두절이어서 속도 태운다. 이런 일은 대개 아무리 얘기해도 반복된다. 어느 지점에선가는 아이의 태도가 눈에 거슬린다. 반항하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지고 폭발 직전이 된다. 체벌 옹호론에 솔깃해진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그 순간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매를 든다면, 교육일까, 화풀이일까?
나는 학창시절 범생이 축에 들었다. 크게 말썽을 피운 기억이 없다. 그래도 체벌을 피할 순 없었다. 이유야 널려 있다. 머리가 길다는 이유도 있고 공부 안 한다고 혼난 기억도 있다. 단체기합을 받은 적도 있고, 아직까지 왜 맞았는지 이유를 모르는 매도 있다. 누군가는 사랑의 매라고 하는데, 숱한 매에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나? 글쎄, 자신없다. 그러면 매에서 ‘감정’을 전달받은 기억은? 생생하다. 체벌이 없으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우려하는 이들이 있다. 스승의 권위가 이런 ‘감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꽉 막힌다.
체벌의 효용은 효과가 즉각적이라는 데 있다. 10여년 전 스포츠부에 근무할 때 대학 감독에게 들은 얘기다. “나도 폭력이 싫다. 그러나 안 때리면 안 뛴다. 매를 대면 경기장에서 애들 눈빛이 달라진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뭘까? 외국에서 오랫동안 선수로 뛴 뒤 귀국해 프로팀을 맡은 감독은 이런 얘기를 했다. “어느 날 선수 몇이 안 보였다. 코치에게 물어보니, 한 명이 숙소를 이탈해 잡으러 간 것이었다. 이해가 안 됐다. 명색이 프로선수가 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두면 될 일이지, 몰래 달아나는 것은 뭐며, 잡으러 가는 것은 또 뭔가.” 오해는 마시라. 옛날 일이다. 지금은 스포츠계도 달라졌을 것이다. 나는 두 사례를 동전의 양면으로 이해한다. 언제부턴가 운동을 체벌의 관성으로 하게 됐으며, 나중에는 무엇을 욕구하는지도 스스로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닐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은가?














![[카드뉴스] ‘떡볶이’ <br> 여기가 최고](http://img.hani.co.kr/imgdb/main2arti/2014/1128/1427370861_141714014683_20141128.jpg)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