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7.10 19:44
수정 : 2013.07.24 10:09
 |
|
일러스트레이션 박지훈
|
[매거진 esc] 박지훈의 서바이벌 대작전
추락의 공포, 가장 무서운 힘은 중력이다. 극적 긴장을 뜻하는 ‘서스펜스’도 어딘가에 매달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을 일컫는 말이니. 평소 안전불감 중증인 자도 어디 고층건물 재난 사고 터지니 묻더라. “로프 살까?” 뭐하게? “불나면 타고 내려가게.” 일단 웬만한 상황 아니고선 로프 하강 탈출은 절대로 권할 바가 아니고,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맨손으로 줄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 대부분은 매달리지도 못한다. 철봉에 매달려 보라, 몇 분이나 버틸 수 있나. 수직으로 늘어진 줄에 매달리기는 수평인 철봉에 비해 훨씬 더 힘들다. 악력 매우 강한 유도선수도 굵고 거친 마닐라 로프 아니면 긴 하강은 불가능하고.
굵고 거친 로프? 중력에 따른 낙하 운동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마찰력, 한 물체가 다른 물체 표면 따라 미끄러질 때 마찰은 운동을 방해하고 마찰계수 높을수록 마찰력은 커진다. 즉 줄을 붙잡고 움켜쥐는 방식, ‘그립’ 때문. 사람의 손은 주먹을 쥐면 빈 공간이 생기니 딱 그만큼의 비효율이다. 완벽한 정권을 쥐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지만 결국 주먹을 잘라내고 손목뼈로 지르기를 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늙은 가라테 고수의 회한 또한 그립 효율을 향한 분투. 무언가를 쥘 때도 마찬가지, 골프나 테니스 그리고 검도 등 도구를 쥐고 하는 운동의 훈련은 그립에서 시작해 그립으로 끝난다. 도구와 나 사이의 간격이 곧 숙련도의 척도니, 기술의 연마란 그 간격을 없애거나 줄이고 그 빈틈에 익숙해지기 위한, 즉 적절한 마찰력을 얻기 위한 노력이다. 삼 섬유를 꼬아 만들어 표면이 거친 마닐라 로프는 맨손으로 쥐기에 알맞아 군대 유격장에서는 아직도 마닐라 로프를 쓴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일은 결국 안 되는 법, 줄이 얼마나 굵든 거칠든 맨손으로 매달려 탈출하겠다는 계획은 애초에 포기하는 게 현명하다. 자고로 안 되면 되게 하라 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 수직 경사 긴 거리를 안전하게 이동하려면 반드시 하강기를 사용해야만 한다. 건물 설치형, 카라비너 겹침, 8자형, 튜브형, 그리그리 등 다양한 모양의 하강기가 있지만 목적과 원리는 모두 같으니, 안전한 하강에 충분한 마찰력을 확보하고 조절하기 위한 장치. 그리고 보다 얇은 줄을 로프에 친친 감아서 만드는 프루지크 매듭이나 로프와 카라비너를 함께 묶는 바흐만 매듭 등 제동 장치를 추가로 이용해 안전성을 높인다.
그런데 그 설계 어째 좀 이상하다. 프루지크 매듭은 매듭을 손으로 쥐고 있어야 결속이 풀려 하강하고 손을 떼면 정지한다. 그리그리 등 여타 기계적 장치들도 대개 마찬가지, 쥐면 내려가고 손을 떼면 멈춘다. 그런데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저절로 주먹을 꽉 쥐는 본능이 있어서 그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하강 속도가 너무 빨라 당황해 손에 힘이 들어가면? 더 빨라진다. 마치 바이크 초보자가 급제동 필요한 순간 깜짝 놀라 본능적으로 가속 레버를 당기듯. 도대체 물건을 왜 이리 위험하게 만드는 거지? 하긴, 굳이 지질 단층선 위에 도시를 짓고 거기에 점점 더 높은 건물을 세우는 위험 중독자들의 세계에서 그 정도쯤이야 뭐.
박지훈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zeensaid@naver.com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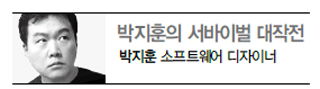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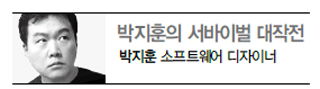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