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편제> 1년 뒤인 1994년 개봉한 성인애니메이션 <블루 시걸>은 악평 속에서도 30만명이 넘는 관객을 불러들였다. 두 작품은 모두 1994년 서울 정도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울천년타임캡슐’에 들어갈 수장품으로 지정돼 땅에 묻혔다. <한겨레> 자료 사진
|
[토요판] 김형민의 ‘응답하라 1990’
(24) 한국 영화의 부활(하)
1992년 무렵에도 한국 영화의 부활은 암담해 보였다. 1992년 한 해 동안 수입된 외국 영화는 318편으로 한국 영화의 3배였고, 관객 수도 직배 영화인 <사랑과 영혼>이 168만명, <원초적 본능>이 113만명, <늑대와 춤을>이 98만명이었으니 한국 영화 가운데 최고 흥행작 <장군의 아들>의 67만명은 갖다 댈 숫자가 아니었다. 1992년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작 <결혼 이야기>도 52만명 동원에 그쳤다. 할리우드 직접배급 체제가 도입된 이래 흥행 순위 200위까지를 헤아려 볼 때 82%가 외국 영화였다니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993년 봄, 이 암울한 정경에 서광이 비친다. 이번에도 그 무대는 서울의 단성사였다. 1977년 <겨울 여자>로 13년 동안 한국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보유했다가 <장군의 아들> 67만명으로 시원하게 그 기록을 스스로 갈아치운 극장 단성사. 단성사가 새로이 내건 간판은 바로 <서편제>였다. 아버지와 삼촌 두 명이 빨치산으로 지리산에 입산하고 그로 인해 신산에 가득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임권택 감독이 탐낸 작품은 원래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이었다. 하지만 영화 제작을 논의하던 1992년 당시, 아직은 군인 출신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 때문에 민감한 영화이니만큼 그해 말 대통령 선거 이후 누가 되든 민간인 출신이 청와대 주인이 된 뒤로 미루자는 결정이 있었다. 그럼 그때까지 뭘 하나. 가볍게 말하면 “노니 장독 깬다”고 손댄 영화가 <서편제>였다. 임권택 감독 자신이 “<서편제>는 개봉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1990년대 초의 판소리 영화는 누가 봐도 흥행될 리가 없는 버린 카드였다”고 고백한 적이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스타급 배우 하나 없이, 그것도 대중에게 생소하기 이를 데 없는 판소리를 다룬(개인적으로 판소리에 동편제와 서편제가 있다는 것을 영화 개봉 후에야 알았다) 이 영화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기적으로 한국 영화사에 남게 된다.
하지만 나는 그 영화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 예술 영화를 많이 걸어 주던 서울 강남의 뤼미에르 극장 같은 곳까지 꾸역꾸역 찾아가서 유럽 영화들을 졸면서 보고, 무슨 내용인지 갈피가 잡히지 않아 끙끙거리다 잡지 영화평을 읽고서야 대충 감을 잡고 친구들에게 “그 영화는 말이야”라면서 허세를 부리던 나름 영화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까지 ‘한국 영화 돈 주고 봐?’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잊기 힘든 진도아리랑 롱테이크 ‘장군의 아들’ 67만 기록 넘어
100만 관객 전설을 쓴 ‘서편제’
우리 마음 깊은 골짜기 속에 있는
신명과 여흥을 만나게 해주었다
한국 최초의 성인 애니메이션
‘블루 시걸’도 1994년 타임캡슐에
‘서편제’와 함께 수장품으로 지정
2394년 이를 보게 될 후손들은
어리둥절해하며 논쟁하진 않을까 술 한잔 걸치면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그래서 <서편제>가 장안의 뜨거운 화제가 된 뒤에야 나는 그 영화를 볼 수 있었다. 원래는 몇명 규합해서 영화도 보고 술도 한잔 하고 할 요량이었지만, 어느새 주변의 친구들이고 선후배들이고 죄다 <서편제>를 벌써들 봤다질 않는가. 결국 투덜거리면서 혼자 조조할인을 노려 단성사 나들이를 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올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극장이 거의 만석이라 나오는 데에 한참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나이 드신 분들도 계셨지만 거개가 판소리라면 당시 시에프(CF)에 출연하여 “우리의 것이 소중한 것이여”를 부르짖고 계시던 박동진 명창 정도나 알 법한 청춘 남녀들이 득시글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나는 <서편제>의 매력을 한껏 느끼지는 못했다. 전국의 아름다운 풍광을 담은 화면과 유장한 판소리의 흐름 속에 눈과 귀는 호강했지만 그 스토리가 내게는 그렇게 감동적으로 와 닿지는 않았다.(개인의 부족함을 탓하지 마시길.) 다만 기억나는 것은 ‘진도 아리랑’의 롱테이크였다. 그 후 10년이 흘렀을 즈음 단성사 근처의 중국음식점을 촬영한 적이 있다. 그때 음식점 사장님은 <서편제> 열풍을 이렇게 회고했다. “술 한잔 걸친 사람들이면 어김없이 나갈 때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를 흥얼거리고 나갔어요.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서편제>를 본 사람들이지. 처음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러더니 나중엔 대학생들도 엉성하게 어깨를 흔들면서 그러고 나가더라고.” 방송 연출로 밥을 먹고 살게 된 이후 나는 종종 이 시퀀스를 써먹었다. 서넛이 어울려 논두렁길을 가거나 인적 드문 산길을 오를 때 출연자들에게 슬그머니 “<서편제> 진도 아리랑 아시죠?”라고 옆구리를 찌르면 어떻게나 익숙하게들 그 장면을 재연하며 즐거워하는지. 언젠가 훈련소 가는 신병을 취재하는데 그 친구들이 어울려 “논산훈련소는 웬 말인가 우리 ○○이 고생길이 뻥뻥뻥뻥뻥 뚫렸네” 하고 놀리면서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을 부를 때는 다 같이 배를 잡고 길거리에서 데굴데굴 굴렀다. 영화 <서편제>에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다. 오랜 세월과 변화 속에 사라져버린 듯했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골짜기 속에 묻혀 있던 신명과 여흥과의 만남이었다 할까. 처음에는 낯설지만 순식간에 스스럼없이 어우러지는 무언가와의 조우였다고나 할까. 나도 그러했다. 전라도 다도해 지역에 촬영을 갔을 때 뱃길이 먼 청산도에 굳이 들르자고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일도, 아내와 함께했던 남도 여행길에서 굳이 해남 대둔산 아래 유선여관을 찾아 막걸리 한 사발을 걸쳤던 추억도 모두 <서편제> 덕분이었다. ‘진도 아리랑’의 롱테이크를, 그 현장을 찾아 나 홀로라도 재연하고픈 마음이었고, 배우 김명곤씨가 그 구성진 목소리로 <춘향전>의 어사출또 장면을 늘어놓았던 그 현장을 다시 보고 싶은 바람이었던 것이다. 마침내 <서편제>는 관객 100만명을 돌파하는 전설을 만들었다. 서울 강남 씨네하우스에서 나온 100만번째 관객은 평생관람권을 수여받는 행운을 누린다. 누구보다 기분이 좋았던 사람들은 <장군의 아들> 67만명이라는 숫자를 흥행 1위로 가냘프게 치켜들고 있던 한국 영화인들 자신이었다. 1993년은 그 자신감이 커져만 가던 해였다. 강우석 감독의 <투캅스>가 사람들의 배꼽을 잡아 뺀 것도 이때였다. <투캅스>에서 폭소 포인트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블랙 위의 자막이었다. 경찰의 이미지를 망가뜨린다며 경찰청이 항의한 결과 “이 영화는 경찰의 실제 이야기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자막을 넣었는데 그게 더 사람들의 배를 쥐게 했던 것이다. 나 역시 그 자막에 유난히 크게 웃어댔던 한 사람이었고.
 |
|
주인공들이 진도아리랑의 한 대목을 주고받으며 걸어가는 <서편제>의 한 장면. 1993년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의 자신감을 세웠다. <한겨레> 자료사진
|
 |
|
<서편제>가 상영되는 서울 종로 단성사 앞에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이 몰려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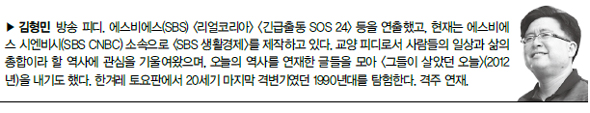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