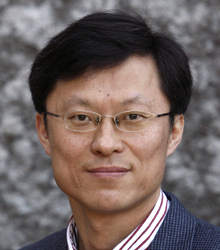 |
|
정재권 사회부문 편집장
|
정재권 사회부문 편집장
그들이 다시 빗자루를 놨다. 대신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라고 쓰인 조끼를 입고 손팻말을 들었다. 일본 대지진 탓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860명은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에서 일하는 청소·경비 노동자들이다. 알려진 대로 이번 파업은 2차 파업이다. 지난 8일의 ‘경고파업’에도 용역회사 쪽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자 본격적인 공동파업을 시작했다. 이들의 요구는 간명하다. 현재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4320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애초 5180원을 요구했다가 4800원으로 낮췄다. 인상 요구액이 시간당 480원이다. 그 이유가 가슴 아프고 절박하다. 시급 4800원이 되어야 한달에 100만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 봐야 우리나라 노동자 월평균 임금 284만6000원(지난해 3분기 기준)의 절반을 한참 밑도는데도.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까? 단순화해 860명×480원×209시간(월평균 근로시간)×12개월로 계산하면 10억3530만원이 나온다. 10억원가량만 있으면, 새벽 5~6시부터 출근해 온갖 궂은일을 하고도 월급이 90만원도 안 되는 이들의 처지가 나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공은 대학으로 넘어갔다. 대학이 10억원가량만 감당할 수 있다면 문제는 풀린다. 대학들은 “청소노동자들은 용역회사 소속이고 우리는 제3자일 뿐”이라고 모른체하지만, 법적 책임을 넘어 대학이 청소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사실을 누구든 안다. 세 대학의 재정상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지난해 기준으로 세 대학의 교비회계는 고려대 2305억4854만원, 연세대 3907억6881만원, 이화여대 6280억3955만원이다. 세 학교가 쌓아두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조2493억5690만원이나 있는 셈이다. 청소노동자들이 목을 매는 10억여원은 교비회계 전체금액의 0.1%보다도 적다. 평균적으로 계산해 세 대학 주머닛돈의 0.1%면 시급 4800원이 가능하다. 게다가 이들 대학 재단의 법인회계에도 1000억원 이상씩이 쌓여 있는 상태다. 좀더 욕심을 부려보자. 이번 파업과 협상을 통해 건물 계단 아래 곰팡이 냄새 나는 비좁은 곳에서 도시락을 먹고, 힘들고 지쳤을 때 편히 발 한번 뻗을 곳조차 없는 비인간적인 처지도 나아졌으면 좋겠다. 청소·경비는 하루도 빠뜨릴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업무인 만큼, 대학들이 이들을 직접 고용한다면 더더욱 좋겠다.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드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서명에 세 대학의 학생 4만여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요즈음 대학가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런 관심은 일차적으로 청소노동자들의 처지가 워낙 안타까운 탓이겠지만, 우리 사회가 대학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아이엠에프 구제금융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대학도 경쟁이나 효율 등이 중시되는 체제로 달라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학에서 기업적 가치가 우세해질수록 자유, 정의, 진리, 인간화 같은 비물질적 가치들이 대학에서만큼은 향유되고 전파되기를 바라는 기대 또한 커진다.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이 진행중인 고려대의 교육목표 가운데 하나는 ‘인간다운 삶의 영위’이고, 연세대는 건학이념으로 ‘이웃을 위한 봉사’를 내세운다. 이화여대의 교육이념에도 ‘공동체 속에서 조화와 참된 평화를 이루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 사회의 ‘대표 사학’으로 불리는 세 대학은 공교롭게도 지금 나란히 시험대에 섰다. 세 대학조차 청소노동자들의 비인간적인 처지를, 시급 4320원의 굴레를 걷어내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조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가능성은 봉쇄된다. 그런 대학이 공동체의 희망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jjk@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