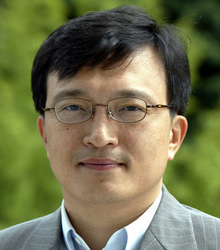 |
추억 속 왜관은 노을조차 금모래 빛
크레인과 독극물의 생채기 안은
그 수난의 역사가 너무 서럽다
제주도 출신인 우리 신문사 문화부 허미경 기자에게, 고향은 ‘소똥 내음’이다. 풀잎을 뜯어먹고 자란 소들의 배설물은 구수하고 향긋하기까지 했단다. 외양간 담벼락에 기대 겨울 한철 쪽볕을 쬐노라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소똥 냄새의 푸근함에 꾸벅꾸벅 졸곤 했단다.
난, 집 문을 나서면 바로 낙동강 백사장이 펼쳐지는 왜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나에게 고향은 ‘금모래 빛’이다. 쏟아지는 햇살로 바삭바삭하게 구워진 모래알들이 뿜어내던 그 눈부심. 입술이 파랗게 시리도록 멱을 감다가 모래 속으로 파고들면 모래 알갱이들은 살갗을 간질이며 따뜻하게 품어주었다. 강 건너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엄마는 사공이 젓는 나룻배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 해 질 무렵 강변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리노라면, 뱃전에서 손을 흔드는 엄마 뒤로 비껴선 노을조차 금모래 빛이었다.
유년이 가고 어른이 되자 냄새도 빛깔도 변했다. 허 기자는 모처럼 고향에 내려가니 역겨운 소똥 냄새가 마을 어귀부터 진동을 하더란다. 제주의 바람과 이슬이 키운 풀을 대신한, 공장에서 만들어낸 사료가 소똥을 화학물질 범벅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얼마 전 아버지, 나, 아들놈 이렇게 3대가 40년 만에 왜관을 찾았다. 옛집은 일찌감치 헐렸고, 가지가 휘도록 감꽃을 달곤 했던 감나무 밑동도 잘려나갔다. 정작 흉측한 건, 그 곱던 모래밭은 사라지고 거무튀튀한 준설토만 솟아난 모습이었다. 바람에 날려온 모래알들은 입안에서 벌레처럼 질겅거렸다. 우리는 모욕이라도 당한 듯 서둘러 떠나고 말았다.
변한 건 빛깔만이 아니었다. 이번 폭우로 100년 넘게 버텨온 왜관철교 교각이 휩쓸려 가버렸다. 어린 눈에 미국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만큼이나 장엄했던 왜관철교가 그토록 허무하게 무너지다니…. 깨복쟁이 아이들의 물장구를 받아주었던, 그 은은하고 자애로웠던 낙동강의 은빛 물살이 어째서 그렇게 난폭해졌는지 ‘4대강 살리기’ 말고는 탓할 곳이 없다.
하지만 이런 넋두리도 사치일 것이다. 왜관의 강변과 철교는 금모래 빛 추억이라기보다는 핏빛 상흔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왜관은 6·25 때 가장 처절한 전쟁터였다. 남과 북의 생때같은 젊은이들 핏물로 낙동강은 철벅거렸다. 그 가운데서도 왜관철교는 비극의 정점이었다. 1950년 8월 미군은 왜관철교 위로 피난민들이 꾸역꾸역 몰려오는데도, 인민군을 막는다는 이유로 다리를 폭파했다. 폭음과 함께 수백명의 피난민이 다리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그때 잘려나간 부분이 공교롭게도 이번 장마에 쓸려간 2번 교각 위 상판이다. 낙동강변의 하얀 모래는 피난민과 병사들의 뼛가루였는지도 모르겠다.
왜관철교를 폭파했던 미군은 근처에 캠프 캐럴을 지었다. 아버지는 직업상 하루에도 몇차례씩 캠프 캐럴을 드나들었고, 그 덕에 난 일찌감치 초콜릿 맛을 알게 됐다. 그 달달한 유혹 앞에 이 나이 먹어서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유는 순전히 그때의 각인 효과 때문이다. 허나 캠프 캐럴은 ‘전쟁 배설물’도 함께 쏟아냈다. 고엽제, 디디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의 독극물을 파묻고 흘려보냈다. 지하로 스며든 맹독 성분은 비수처럼 낙동강의 옆구리를 파고들었을 텐데, 미군은 단 한 차례도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다.
왜관은 조선시대 낙동강을 따라 뱃길을 타고 올라온 왜인들의 물품보관창고에서 생긴 이름이란다. 임진왜란 때는 왜군과 청군이 올라가고 내려오며 전쟁을 벌인 곳이기도 하다. 이방인들의 손때를 많이 타는 지리적 운명인가 보다. 그래도 크레인이 파헤치고 독극물이 할퀴어버린 생채기를 풍수 탓으로 돌려버리기에는 수난의 역사가 너무 서럽다.
김의겸 정치부문 선임기자 kyummy@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