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5.31 18:41
수정 : 2007.05.31 1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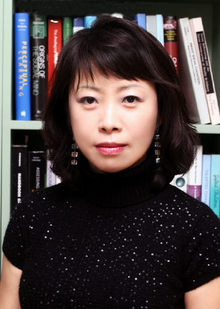 |
|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
세상읽기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가 가속화되고 첨단 지식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요즘, 우리 사회의 열쇳말은 창조·혁신·개혁인 것 같다. 기존 지식이나 기술을 단순히 습득하고 그대로 적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기존 지식을 결합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이제 생존의 필수조건이다.
‘두바이’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불모지, 사막 한복판에 초호화 골프장과 실내 스키장을,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고급호텔을 만들고 새로운 관광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한때 20억달러 적자에 파산 위기에 놓였던 ‘애플’은 아이튠즈라는 온라인 음악 사이트를 통해 쉽게 음악을 내려받고 바로 재생하도록 한 엠피3 플레이어 아이팟을 개발해, 지구촌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다른 검색 엔진이 수익 확장을 위해 백화점식 사업을 할 때 ‘구글’은 불필요한 띠광고와 링크를 과감하게 없앴다. 이용자가 원하는 것, 즉 가장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찾도록 개편한 결과, 접속자 수와 광고수익이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한 인터넷 업계에서 살아남게 되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존 생각의 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이다. 이제 변화하지 않는 조직은 생존하기 어렵다. 이런 변화와 개혁의 걸림돌은 무엇일까? 바로 의식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습관적 사고요, 습관적 행동이다.
사람들의 심리적 용량은 제한되어 있다. 만일 일상생활에서 순간 순간의 판단·선택·행동을 일일이 따지고 신경써서 한다면, 사람들은 지금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부분은 습관으로 크게 자원과 용량을 들이지 않고 해결함으로써 우리 내부의 자원을 아낄 수 있다. 빨리 결정해야 할 많은 문제를 두고 습관적 사고는 자동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고, 여러 힘든 일들을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절약된 심리적 자원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이렇듯 습관은 제한된 용량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할당하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좀더 능률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문제는 나쁜 습관이다.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찾아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잠재워 버리고 변화나 개혁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버린, 나와 조직을 무기력하게 묶어 버리는 사고와 행동의 습관이다. 일단 나쁜 습관이 생기면, 그것은 무의식적·자동적으로 작동하므로 여간해서는 고치기 어렵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어느 바닷가 해변에 사다새(펠리컨)들이 수백 마리나 무리를 지어 살고 있었다. 이 새들은 관광객이 던져주는 갖가지 먹이만을 먹으며 편안히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날, 시 당국에서는 이 먹이 탓에 바닷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펠리컨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자 날마다 던져주는 먹이만 먹으며 편안하게 살아가던 새들은 점차 굶어죽어 갔다. 이 문제를 논의하던 시 당국에서는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해 냈다. 야생의 펠리컨들을 잡아서 무리 속에 섞어 놓자는 것이다. 야생 펠리컨들은 스스로 먹이를 잡아먹는다. 야생이 무리에 들어간 이후 던져주는 먹이만을 받아먹던 펠리컨들은 야생 펠리컨들과 같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먹기 시작했다. 외부에서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습관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야생성이 길들여지지 않도록 하자면 외부의 자극과 변화에 겁내지 않고 늘 과감하게 열린 사고와 행동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의 습관은, 조직의 습관은 어떠한가? 어느새 쉽게 먹이를 받아먹는 데 길들여진 무기력한 펠리컨의 모습은 아닌가?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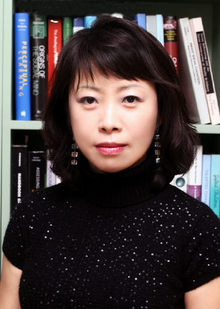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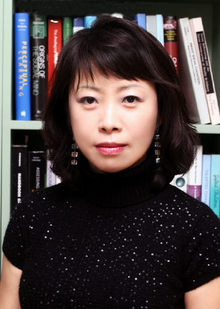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