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7.15 20:04
수정 : 2008.07.15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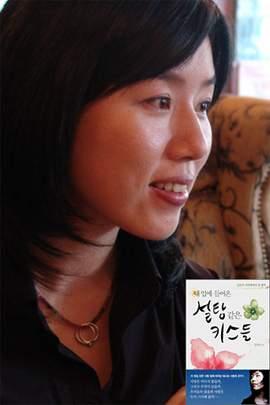 |
|
김선우 시인
|
세상읽기
원천봉쇄된 광장을 보며 생각한다. 직접민주주의니 대의민주주의니 어려운 말이 많지만, 민주는 말 그대로 ‘민’이 ‘주인’인 것이니 직접이든 간접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소외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주체의 소외가 일어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외되지 않는 세상. 그런데 여전히 도처에 벽이다. 봉쇄된 광장에서 나는 사랑을 상상한다. 감동시키고 감동받을 수 있는 능력이 확장될 때 사랑의 능력도 커진다. 현실의 벽이 아무리 단단하고 고단할지라도 우리의 꿈은 여전히 역동적이다.
흥미진진. 이 말을 나는 퍽 좋아한다. 우리 사회 기묘한 엄숙주의 성향은 흥미진진한 놀이에 대해 ‘애들 짓’이라는 편견을 종종 보이는데, 내 생각엔 놀이야말로 모든 창조적인 생산의 기본이다. 비생산적이어서 오히려 생산적인 놀이들! 한 손에 촛불을 든 채 한 손으로 공기놀이를 하는 딸의 사진을 폰카로 찍어 전송해준 벗. ‘대통령 아저씨. 미국이랑 놀지 말고 우리랑 함께 놀아요’라고 앙증맞게 쓴 팻말을 든 자신을 셀카로 찍어 보내준 고등학생 독자. 과거의 집회장소에서 찾을 수 없는 흥미진진함이 가득한 광장에서 벗들이 전송해준 디카 사진 속에는 미소를 짓게 만드는 놀이의 힘이 있었다.
나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다. 나는 내 삶의 속도를 가능한 아날로그적으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지만, 디카에 대해서는 오래 전 마음을 열었다. 호감을 갖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하다. 디카는 필카보다 지구오염 요인을 덜 만든다. 필름의 제작과 현상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들에 대해 알게 된 후 나는 디카 유저가 되었다. 필카 소모품인 필름이 너무 비싸고 현상 인화의 모든 과정에 돈이 많이 든다는 점도 이유일 것이다. 해상도에서 여전히 디카가 필카를 못 따라간다고 하지만 직업사진가가 아닌 나 같은 사람에게 인화 해상도 운운은 겉치레에 불과하다. 카메라는 내게 있어 놀이, 표현, 소통의 짝꿍이 되어 주면 족하고 똑딱이 디카로도 충분하다.
벗들이 광장에서 보내준 사진들을 보며 나는 내가 디카를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디카의 직접성이다. ‘항간에 떠도는’ 말로 하자면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이랄까. 필카의 사용에는 필연적으로 소외가 일어난다. 작업실을 갖고 직접 현상 인화를 하는 경우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 현상과 인화는 특정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야 하고 유저와 결과물 사이에 소외의 과정이 발생한다. 이런 소외를 카메라 사용의 당연한 과정이라 여겼던 필카 세대는 자신이 아닌 누군가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대신해주는 방식에 만족할지도 모르지만, 사진을 찍고 골라내는 전 과정에서 주체의 소외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디카 세대는 직접행동에 자연스럽다. 나는 언제 어디서든 숨쉬는 것처럼 디카를 꺼내드는 이들을 감각의 액티비스트라고 부른다.
민주주의 위기를 염려하며 대의민주주의 정립만이 금과옥조라 생각하는 정치인과 교수님들께 디카를 한번 ‘사유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마침 올 여름 “내 사랑을 찍어요”라는 타이틀의 사진 콘테스트가 가야산 깊은 산속 해인사에서 열린다고 하니 그곳으로 가봐도 좋겠다. 사랑의 능력은 무한 가능성이다. 고착화된 금과옥조가 아니라 오늘의 아이들이 보여주는 새로운 사랑을 발견해 보시길. 사진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필카 세대의 미국 작가 수잔 손택을 떠올리며 나는 촛불집회를 경험한 우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듣는다. 당신들의 해석에 반대한다. 우리는 움직인다. 우리는 사건을 ‘보는’자가 아니라 사건‘속에 있는’자다. 우리의 사랑은 소외 없이 확장된다.
김선우 시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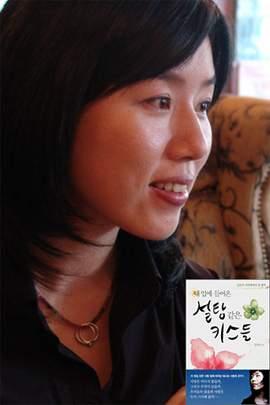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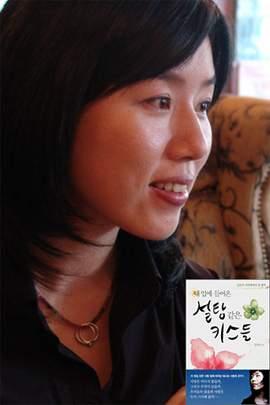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