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8.26 19:52
수정 : 2008.08.26 1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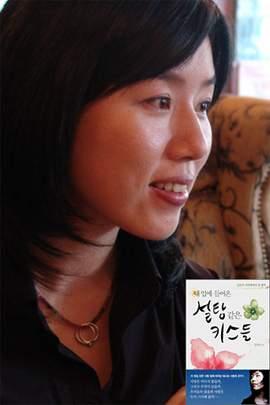 |
|
김선우 시인
|
세상읽기
대한민국을 통째 삼키듯이 비정상으로 거대해진 서울은 도시 고유의 아우라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 건물과 길들이 고유 색채를 잃고 어디든 비슷해져 간다. 대학가에서 서점이 사라진 지도 오래다. 정치인들은 저마다 ‘문화도시’ 어쩌고 떠들지만, 무엇이 문화인가. 자극적이고 중독성 강한 소비문화? 다른 버전으로 말하면, 경제만능주의 실용문화? 물질의 소비에 중독되어 존재의 성찰 능력을 잃어버린 도시의 비극은 비단 서울만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요동치고 있다. 어떻게 단언하냐고? 중요한 지표가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도 책을 안 읽는다. 좋은 책을 늘 곁에 두는 사람의 삶은 쉽게 기성화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게 되는 순간, 그 사회의 문화적 자존과 자율성은 내리막길로 접어든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주 대학로의 한 책방에서 독특한 행사가 열렸다. ‘이음책방 후원의 밤.’ 소식을 접하고 모여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재능과 열정으로 작은 책방을 후원했다. 책방을 빼곡하게 채우고 낭독을 듣거나 공연을 보는 사람들 중 특별히 부자인 사람은 없었지만, 선불제 회원을 자처하거나 책방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작은 책방이 ‘살아남아 주기’를 소망했다. 책방 대표는 이런 후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부끄럽다 했지만, 내가 보기에 그것은 일방적인 후원이 아니었다. 책을 누리는 것은 누리는 자의 영혼에 득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책방이란 그 존재만으로도 애틋하고 긴급한 문화적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먹고사느라 바쁜데 언제 책까지 읽느냐고? 역설적으로, 먹고사느라 힘들기 때문에 더욱 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기 존재를 스스로 아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머잖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발레리가 전하는 이 말은 두려운 진실이다. 자본력의 경쟁에서 대형서점들과 게임이 안 되는 작은 책방이면서 더구나 문학·예술·인문학 중심의 서가를 꾸리고 있는 이음책방의 ‘살아남기’는 그 자체로 이 공간의 문화적 소중함을 역설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학·예술·인문학이 살아 있지 않으면 사회는 천박해진다. 꿈의 상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21세기를 문화와 상상력의 시대라고들 하고 위정자들은 입만 열면 국익과 선진국을 말하지만, 문화적으로 우리는 아직 빈국이다.
그동안 척박한 환경 속에서나마 문학의 활로를 찾고자 여러모로 분투했던 문화예술위의 ‘문학나눔 사업’ 예산도 새 정부 들어 반 토막 났다는 소식이 들린다. 반 토막 낸 예산이 흘러들어가는 곳은 어디일까. 입만 열면 반복되는 ‘경제 살리기’에 동원되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정신의 성장과 영혼의 풍요에 대해 지나칠 만큼 인색하다.
도로를 깔고 금세 다시 뜯고 불필요한 방파제를 쌓거나 별별 괴상한 건설공사들에 세금 낭비하지 말고, 문화공간 구실을 할 수 있는 동네책방 같은 데 세금 혜택을 듬뿍 주는 정책 같은 건 없을까. 일상적으로 좋은 책을 나누고 낭독회·공연·전시를 하는 동네책방 문화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 위정자들이 굳이 ‘문화도시’의 위상을 세 치 혀로 역설하지 않아도 될 터. 문화란 생활 속에 숨결처럼 배어들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빵 없이는 살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도 않는다. 빵만으로 살라고 강요하는 경제실용주의의 독주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먼 길을 가야 할 모양이다. 그러니 꿈이여 왕성해져라. 꿈 없이 이 캄캄한 세월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는가.
김선우 시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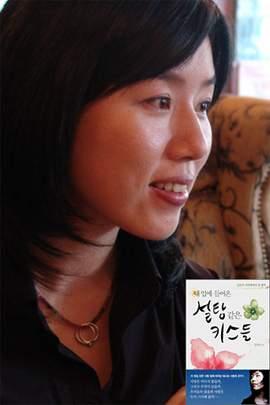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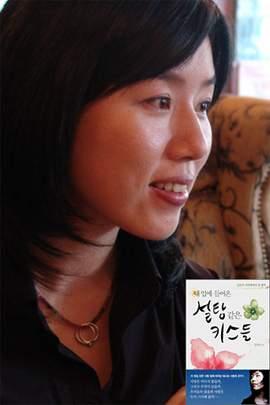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