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9.16 19:38
수정 : 2008.09.16 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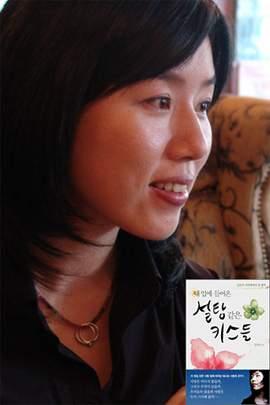 |
|
김선우 시인
|
세상읽기
“달 봐라. 달 떴다!” 혼자 보기 아까운 달이 뜨면 오래 못 만난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진다.
달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지구라는 별에 몸을 의탁한 존재임이 실감난다. 지구의 사람인 것이 기쁘기도 하고 아득하기도 하다. 유정한 달 덕분에 삶·우주·죽음 … 같은 말들이 떠오른다. 유한과 무한, 신과 종교, 사랑과 영원에 대한 무수한 질문들. 달은 질문을 수호한다. 고향마을 산등성이나 동해 먼 수평선 위로 달이 솟을 때, 어릴 적 내가 경외감에 전율하며 던지던 질문은 여전히 반복된다. 달은 그런 질문들을 작은 우주인 나에게서 큰 우주로 연결시킨다. 그렇게 달은 타자를 생각하게 한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 속의 나와 당신을.
올 추석 달은 착잡하고 슬펐다. 추석이 가까워질 무렵 들린 끔찍한 소식 때문이다. 조계사 경내 공원에서 벌어진 식칼 테러. 머리에 칼이 꽂힌 채 병원에 실려 온 의식불명의 아들을 바라보는 노모의 눈에 이 끔찍한 사태는 어떻게 이해되었을까. 잔인한 폭력의 양상도 끔찍했지만, 이 사건이 새 정권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환부의 가장 절망적인 부분을 드러내 보여주는 듯해 섬뜩했다. 치명적인 소통 불능이야말로 식칼 테러의 본질 아닐까.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이를 향한 가장 끔찍하고 극단적인 행동 양상. 설상가상, 속속 터지는 내로라하는 개신교 목사들의 불교 폄하 발언은 도무지 성직자의 발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차마 입에 담기 거북한 수준이다. 이들의 발언에는 오직 자신만 있다. 이쯤 되면 한국 개신교의 일부가 보여주는 이 극단적 자기애와 폭력성의 뿌리에 어떤 정신세계가 있는 것인지 정말이지 의문스러워진다.
신의 존재 여부는 논외로 치자. 혼돈의 발견처럼 신의 발견도 모순적인 매혹과 경로를 가질 터. 저마다의 심성에 따라 신은 발견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문제는 개신교, 특히 한국의 개신교가 신 앞에 너무도 부자유하다는 것이다. 내 생각에 이 부자유함은 한국의 보수 개신교가 일체의 질문을 잃어버리면서 발생한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을 ‘마귀’ 혹은 ‘사탄’이라 적대시하고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길이 없어 보이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혹시 예수 믿는 자들끼리의 사랑을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혔다고 생각하게 된 것일까. 자신만을 생각하고, 제 가족의 평강만이 관심사고, 제 교회만이 옳다는 식의 신앙은 생명력 없는 도그마의 극단이 된다.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신앙은 믿는 자 스스로 우상이 되어 스스로에게 갇힌다. 그러니 도그마에 갇혀버린 신성이 소통 부재의 중병을 앓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조계사 마당엔 촛불 수배자들이 70여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올 추석은 유난히 달이 밝아서 쓸쓸했다. 방송사 카메라 앞이 아니라 조계사 마당에서 대통령이 이들과 대화를 해보는 건 어떨까. 대통령이 장로일 수는 있다. 하지만 장로로서 대통령 노릇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일곱살배기 아이들도 알 만한 상식이다. 세상 가장 낮고 소외된 변방까지 사랑과 헌신으로 순결해지기를 열망했던 예수의 마음을 진정으로 실천하길 원한다면, 대통령은 2008년 봄여름의 무수한 촛불 속 예수를 보아야 할 것이다.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모든 곳엔 개혁과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사랑에 대해 말하는 기독교가 사랑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 방식을 성찰하지 않을 때 일부 목사와 장로들이 보여주는 ‘그들만의 사랑’은 소통불능의 깊은 환부일 뿐이다.
김선우 시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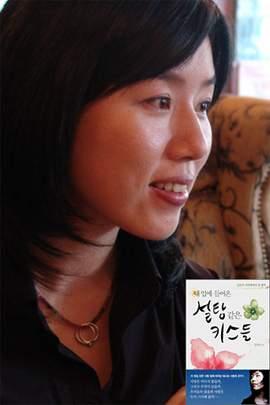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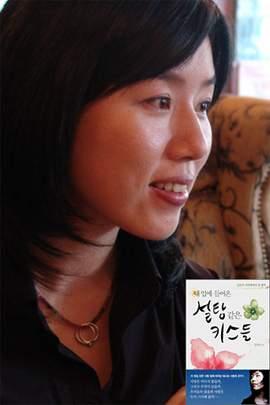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