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02.18 18:46
수정 : 2011.02.18 2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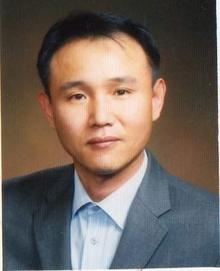 |
|
윤석천
|
윤석천 경제평론가
사하라에도 단비가 내리는 걸까. 누구도 이집트의 시민혁명을 과소평가할 순 없다. 잔인한 독재정권에 시달리며 절망의 삶을 살아야 했던 민중들의 봉기는 당연하지만 힘든 여정이었을 거다. 그래서 아름답다. 이집트로 달려가 와락 안아주고 싶을 정도다. 하나 카이로의 진정한 봄을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 혁명이 온전히 이집트 민중의 승리라고 말할 수 없는 정황들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하나만으로도 전략 요충지이다. 더욱이 중동과 아프리카를 잇는 관문이다. 무엇보다 무바라크 정권은 대표적 친미 정권이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귀중한 지역의 대표적 친미 괴뢰정권이 혁명으로 무너지는 것을 방관, 묵인했다. 오히려 그것을 지지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혹, 무바라크가 미국이 의도하고 있는 새로운 중동 질서에 장애물은 아니었을까? 어쩌면 정교하게 짜인 미국의 각본에 의해 중동 전역의 정권교체가 의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미국은 2001년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했을 때부터 줄곧 ‘더 큰 중동’이란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최근엔 그 이름을 좀더 부드러운 어감의 ‘신중동’ 프로젝트로 바꾸었다. 이것은 중동이란 개념을 세계 전역의 이슬람 국가는 물론 이슬람 세력이 존재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이들 국가에 서구적 가치를 전파, 이식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미국은 이 계획에 의거해 2003년부터 시작된 그루지야(현 조지아), 우크라이나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컬러혁명을 지원했다. 2009년의 실패한 이란의 녹색혁명도 이 프로젝트의 하나였으며 작금의 중동지역 정권교체 운동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이집트 시민혁명의 주요 축으로 ‘4·6 청년운동’과 ‘케파야’를 들 수 있다. ‘4·6 청년운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기초로 한 조직으로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인 엘바라데이가 지원하는 단체다. 그는 친미세력을 대표한다. ‘케파야’는 ‘이제 충분하다’라는 의미로 2003년 그루지야의 장미혁명을 주도했던 단체인 ‘크마라’와 그 뜻이 같다. 이것을 우연이라 할 수 있을까? ‘크마라’와 마찬가지로 이집트 시민단체 뒤에도 미국의 인권단체인 민주주의재단(NED)과 프리덤 하우스가 있다.
프리덤 하우스는 중앙아시아 컬러혁명의 배후였다. 그런데 이집트 혁명을 이끈 청년활동가들이 이 단체의 ‘신세대 프로그램’이란 과정을 이수했다. 이것도 우연일까? 민주주의재단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부터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정권 무력화를 준비해왔다. 이 단체의 웹사이트를 보면 이들의 주요 활동지역을 알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들 지역은 현재 민중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국가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물론 이들 지역은 미국의 ‘신중동’ 프로젝트에 속해 있다.
이슬람 세계의 혁명 중심에 미국의 인권단체가 있다. 물론 그 뒤에는 미국 정부가 있다. 이들은 미국식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이슬람 세계에 이식해 에너지 자원을 장악하고 달러 시스템을 공고화하려 한다. 패권의 영구화가 이들의 최종 목표다. 과거와 달리 그 수단을 자국 주도의 폭력적 전쟁에서 해당국 민중의 자발적 비폭력운동으로 바꿨을 뿐이다. 혁명 초 이집트 군의 주요 장성들이 펜타곤 초청으로 워싱턴에 있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혁명이 온전히 이집트 민중의 힘만으로 일궈졌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뒤에는 정교하게 계획된 미국의 의도가 숨어 있다. 미국은 이슬람 세계의 재편을 의도하고 있다.
한반도에 봄이 온 지도 어언 한 세대가 흘렀다. 그러나 민중이 디디고 있는 땅은 아직도 동토다. 친미, 종미로 대변되는 기득권의 봄일 뿐이다. 카이로에 봄이 온 것은 확실하다. 다만 이집트 민중의 봄과 승리를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 혁명의 배후를 돌아봐야 할 때다.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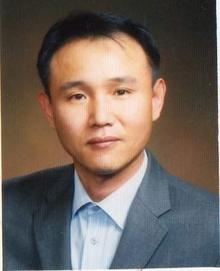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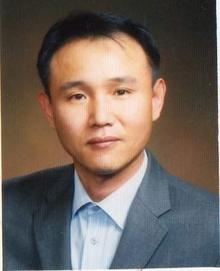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