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11.07 19:21
수정 : 2012.11.07 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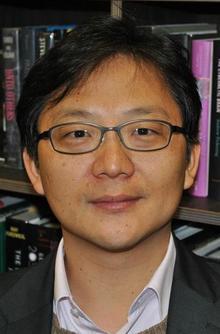 |
|
장대익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
드디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두 사람은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화, 가치와 철학이 하나 되는 단일화,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를 원칙으로 삼아 “낡은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치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대체 무엇이 “낡은 패러다임”이고 어떤 것이 “혁신”일까? 이 두 용어가 후보들의 입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나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사학자인 토머스 쿤이 생각난다.
쿤은 명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과학의 역사를 패러다임의 출현과 성장, 그리고 교체로 설명하려 했다. 그가 관찰한 과학 이론의 성장은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인다. 잘나가던 지배 패러다임이 어느 때부터인지 해결되지 않는 변칙 사례들에 맞닥뜨리며 버거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해결의 실마리가 좀체 보이지 않자 과학자들이 그 패러다임 자체를 의심해본다. 이것이 낡은 패러다임의 위기 상황이다.
하지만 위기가 왔다고 해서 곧바로 혁명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 변칙 사례들을 매우 인상적으로 해결해주는 대안적 이론이 등장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혁명이 시작된다. 그렇게 되면 과학자들은 비교적 단기간에 새 패러다임으로 갈아탄다. 이것이 바로 ‘과학 혁명’이다.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패러다임의 교체가 완성되면 이전 패턴이 또다시 반복된다. 쿤은 이것이 바로 과학의 일생이라고 보았다.
가령 서양의 하늘을 2000년간 지배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은 행성들의 역행 운동을 설명하는 데에 계속 실패했다. 그러자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원운동을 한다는 새 이론(지동설)을 내세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했고, 결국 새 패러다임으로 성장했다. 250년 동안 물리학의 왕좌를 차지했던 뉴턴 역학은 수성의 근일점이 변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계속해서 실패했다. 뉴턴이 퇴위한 결정적 이유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이 바로 그 현상을 정확히 예측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인슈타인의 세상이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배가 침몰하는 상황을 그려보자. 그 육중한 배가 정말로 침몰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한 승객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던가? 무작정 뛰어내리던가? 아니다. 그들은 갈아탈 대안(비상용 구명보트)에 모두 줄을 서고 있다. 최악의 상황이라도 대안이 보이지 않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 법이다. 그 대안의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죽음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대안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거기에 매달리고 본다. ‘위기’보다 더 두려운 것은 어쩌면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정신적 진공 상태’인지도 모른다. 쿤은 혁명기의 과학자도 비슷한 심리를 갖는다고 말한다.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대안적 패러다임이 낡은 패러다임을 모든 면에서 능가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과학자들이 배를 갈아탄 이유는 거기에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낡은 패러다임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그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냈으니 정말 능력있는 이론이겠구나’ 하는 생각. 미래가 불투명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쏠렸던 것은 바로 이런 기대심리 때문이다.
여권이 경계하고 있듯이 ‘단일화는 곧 대선 승리’라는 공식은 실패의 등식이기 쉽다. 투표일 직전까지라도 낡은 패러다임이 실패한 그곳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줘야 한다. 아직은 두 후보가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의 비상용 구명보트인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승객들이 적지 않다. 이제부터라도 문제해결력이 있는 능력자임을 선명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 침몰하는 배에 홀로 남아 쓸쓸히 최후를 맞았던 타이타닉호의 선장을 측은지심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장대익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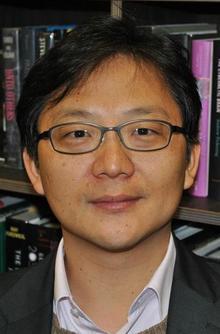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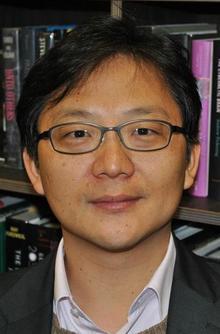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