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1.02 19:17
수정 : 2013.01.02 1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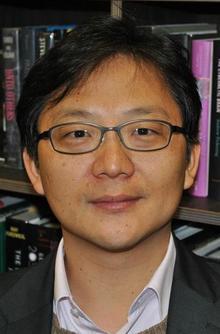 |
|
장대익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
지난 며칠간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를 맞히려고 통계 조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 틀림없이 삼파전일 것이기 때문이다. ‘복’, ‘건강’, ‘행복’. 그런데 유독 이번 새해에는 ‘행복’이 강세다. ‘국민행복시대’라는 표어를 들고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계셔서일까? 아니나 다를까, 서울시의 신임 교육감도 신년사에서 ‘행복’을 꺼내들었다. “행복한 학생이 성공한다. 이것이 서울 교육이 행복교육이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행복이 성공을 위한 수단이란 뜻인가? 그가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교실은 별로 행복해질 것 같지 않다.
물론 성공과 행복은 관계가 깊어 보인다. 성공한 사람은 대체로 행복하며, 행복한 사람은 대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복에 대한 최신 연구들은 적어도 경제적 성공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깨뜨린다. 우선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행복은 ‘주관적 안녕감’이랄 수 있는데, 이것은 직업, 소득, 소속 집단 등에 대한 인지적 평가(‘삶의 만족도’)와 유쾌(또는 불쾌)한 정서 상태를 합한 값이다. 즉, 행복은 감정과 인지의 복합적인 상태인 것이다.
이렇다 보니 행복에 대한 역설이 발생한다. 연봉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해보자. 첫번째 상황에서는 사장이 당신 연봉을 6000만원으로, 다른 이의 연봉을 4000만원으로 정하려 한다. 두번째 상황에서는 당신 연봉을 1억2000만원, 다른 이의 연봉을 2억원으로 정하려 한다. 당신이라면 어떤 상황을 선택하겠는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두번째 상황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첫번째를 골랐다. 왜 그럴까?
행복과 돈의 관계는 직선적이지 않다. 지난 반세기 동안 1인당 평균 소득은 엄청나게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더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경제적 측면에서 훨씬 더 나아졌어도 행복감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역설이다. 행복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연구결과는 돈이 기본적인 경제적 필요를 채워준 뒤에는 행복을 더 이상 크게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연봉 1억원을 받는 사람이 5000만원을 받는 사람보다 갑절 더 행복한 사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에는 소득의 절댓값 그 이상의 무엇이 있는 것이다. 위의 연봉 협상 상황에서 대다수가 6000만원을 택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행복에 관한 한 우리는 후진국이다. 이런 맥락에서 박 당선인이 ‘국민행복시대’를 내건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행복 연구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기본적인 경제가 안 되는 국민들에게는 최소한의 만족감을 위해 직업과 소득부터 챙겨줘야 한다. 반면, 중산층에게는 그 이상의 부가 더 많은 행복을 담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국가행복지수에서 최상위인 덴마크와 평범한 미국을 비교한 연구에서 그 둘을 가른 것은 “잃어버린 지갑이 되돌아올 것이라고 믿는가?”에 대한 대답 차이였다. 즉 사회, 기업,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행복지수의 또다른 변수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상위 부유층을 “기분 좋다고 쇠고기 사먹겠지”의 무한반복으로부터 탈출시킬 방법도 필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그들을 행복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자선과 기부의 기쁨을 알게 하는 길이다. 경제만 이야기하지 말자. 행복해지는 법은 다양하다. 맞춤형 행복 프로젝트가 가동되어야 한다.
장대익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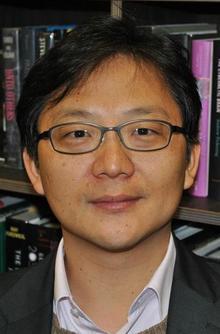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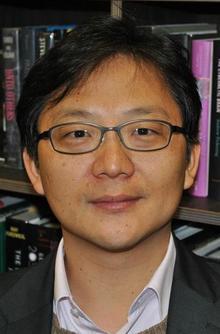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