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1.23 19:15
수정 : 2013.01.23 1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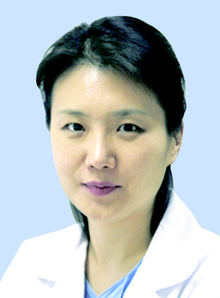 |
|
김현정 정형외과 전문의
|
얼마 전 여고 동창생을 만났다. 그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에서 책임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다. 직업 특성상 매주 시청률 변동을 민감하게 지켜본다고 한다. 얘기를 들으며 언뜻 이런 생각을 했다. ‘오랫동안 해왔으니 이제 웬만해서는 끄떡하지 않는 달관에 이르렀겠구나.’ 그런데 웬걸, 그건 완전한 착각이었다. 이어진 그의 말은 뜻밖에도 이랬다. “그래서 우리 피디들은 ‘일희일비하자’ 그렇게 살아. 시청률 올랐을 때 한껏 좋아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또 좋아할 일이 있겠어?” 패러다임의 참신한 전환이었다.
병원에 온 사람들은 팔이나 다리, 몸의 어딘가가 아프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실제 아픈 곳은 자각하지 못하고 숨겨진 채로 지니고 있는 수가 많다.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우울한 일이 계속될 때, 억눌린 정서상태가 실제 몸의 증세로 전이되어 나타난다. 소화가 안 된다, 머리털이 빠진다, 잠을 못 잔다, 까닭 없이 심장이 두근거린다, 힘이 빠진다. 얼굴은 영리하게 가면을 쓰지만 몸은 우직하고 솔직한 반응을 보인다.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 중 약 3분의 1은 이런 ‘정서질환’ 때문이라고 한다. 의학 용어로 ‘신체화 현상’이라고 한다. 뺨은 동대문에서 맞았는데 화풀이는 한강 가서 하듯이, 다친 곳은 마음인데 증세는 팔다리가 겪는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감정노동자들이 있다. 매장이나 창구에서 여러 고객을 맞으며 일관된 미소와 친절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런 정서질환에 더욱 취약하다. 고객 중에 별별 까다로운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중에는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일과를 마칠 무렵이 되어서는, 종일 유예되어온 자신의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되어야 적절한 것인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상태가 된다. 지나치게 소모된 명랑함 때문에 신경이 와해되어 아무런 감흥을 느끼기 힘든 정서적 탈진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여느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상황만 다를 뿐 업무와 관련하여 이 비슷한 경험들을 한다.
건강은 축적된 내 삶의 결과물이다. 질병도 마찬가지다. 좋은 습관이 쌓이면 건강이 되고 안 좋은 습관이 쌓이면 병이 된다. 자신의 감정을 미루지 않고, 담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건강한 습관의 기초다.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 매일 똑같이 밋밋한 표정, 기쁜 일이 생겼는데도 선뜻 기뻐하질 못하고 전전긍긍,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슬픔은 도처에 깔려 있다. 우울과 역경에 관해서라면 우리들은 이미 충분히 달인들이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도 실컷 기뻐하자. 감사하자. 기뻐할 일을 일부러 찾아서라도 기뻐하자. 깨질 때 깨지더라도 웃을 때는 웃자. 그리고 너무나 힘든 날에는 실컷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고개를 처박아 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야 툭툭 털고 내일은 또 내일의 새로운 삶을 맞이할 에너지가 생성될 테니까. ‘울다가 웃으면 똥구멍에 털 난대’ 아이들처럼 금방 울다 웃다 그렇게 살자. 쌓아 두다가 한 방에 크게 터뜨리지 말고, 소소하게 자주 터뜨리며 살자. 매일 비워내는 것, 하루의 치료제로서 일희일비를 권한다.
눈이 내렸다.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좋아 일부러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왔다. 좋아하는 드라마 시작 시간에 알람을 맞춰 놓는다. 기쁘지 않은가? 이런 ‘조그만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약이다. 지금 기뻐하지 않으면 언제 또 기뻐할 것인가? 나는 새해 일희일비하기로 했다. 소곤소곤 작은 목소리지만 오늘도 만세삼창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만세, 만세, 만세!”
김현정 정형외과 전문의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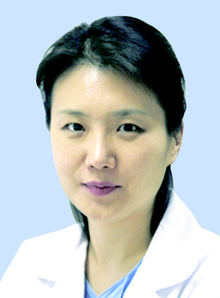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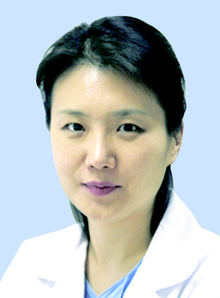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