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1.30 19:18
수정 : 2013.01.30 1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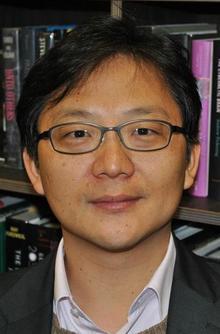 |
|
장대익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
한국 사회를 경험한 외국 사람들은 경탄해 마지않는다. 조찬, 오찬, 만찬 모임, 그것도 모자라 밤늦은 회식까지, 우리는 정말 자주 모이고 빨리 처리하며 오래 일한다. 이런 직장 문화가 우리 사회를 이토록 빠르게 진화시켰다는 해석에 반기를 들 생각은 없다.
그렇다면 가족 문화는 어떤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료들과의 끈끈함이 계속되는 동안 가족 공동체에는 ‘아빠 없음’이라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물론 맞벌이 가정에서는 이 부재의 대상이 꼭 아빠만은 아니겠지만, 회식 자리에 끝까지 앉아 있는 엄마를 보는 일은 매우 드물다. 어느덧 우리 사회에서 직장을 택한 쪽은 대개 남성이고 자녀 교육과 양육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쪽은 주로 여성으로 고착되었다. 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자녀 입시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아는가? 뼈 있는 우스개로, 첫째가 할아버지의 재력이고, 둘째가 엄마의 정보력이란다. 마지막 조건이 압권이다. 아빠의 무관심! 엄마가 전담을 해서 한 방향으로 애들을 몰아가고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아빠가 괜히 끼어들어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아야 성공한다는 이야기다. 어쩌면 입시공화국에서 이런 전담 전략이 최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한국의 가정은 지난 수십년 동안 문화적으로 무성생식을 하는 기이한 공동체로 퇴보했다.
무성생식은 세균처럼 암수가 없는 생명체가 단독으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번식 방법이다. 무성생식을 하는 생명체는 자신의 유전자 세트를 자손에게 고스란히 물려준다. 하지만 잘못된 것들도 그대로 물려줄 수밖에 없어서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이 된다. 반면 대부분의 복잡한 생명체들이 취하는 유성생식은 암수의 생식세포들이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개체가 탄생하는 새로운 번식 방법이다. 이 경우 부모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유전자 세트를 절반씩 물려준다는 단점이 있지만, 모계와 부계의 유전자가 섞임으로써 새로운 유전자 조합을 가진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물학자들은 이런 성의 출현으로 인해 비로소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의 나쁜 유산과 결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만일 유성생식 메커니즘이 진화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지구는 세균들만 득시글거리는 밋밋한 행성이었을 것이다. 자연계가 지난 10억년 동안 이룩해낸 혁신과 다양성의 배후에는 이렇게 성의 출현이 있었다.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유전자 전달 방식이 아니라 문화 전승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자. 문화유전자(‘밈’)를 전달하는 방식에도 두 가지가 있다. 아빠든 엄마든 한쪽 성의 문화만이 전달되는 문화적 무성생식과 아빠와 엄마의 문화가 적절히 섞여서 전달되는 문화적 유성생식이 그것이다. 대개의 경우처럼 엄마가 자녀를 전담하는 구조에서는 아빠가 배우고 익힌 다양한 문화적 자산이 자녀에게 전수될 채널이 없다. 이 때문에 역동적 사회 속에서 굳건히 살아남은 아빠들의 경험과 지혜가 자식 세대로 잘 전달되지 않는다. 우리 가정은 어느덧 엄마의 밈만이 재생산되는 획일적인 공동체가 되었다.
문화적으로 유성생식을 하는 가족으로 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살벌한 입시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빠의 문화 전승 채널을 잘라내는 엄마들은 끝내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 오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며 자녀들과의 문화적 관계를 끊는 아빠의 태도도 결코 현명하지 않다. 아이들은 아빠로부터도 무언가를 전수받을 권리가 있으며, 실제로 전수받음으로써 더 행복해지고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대익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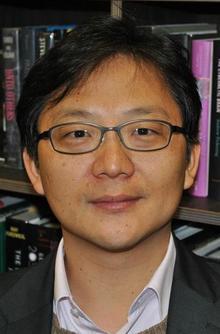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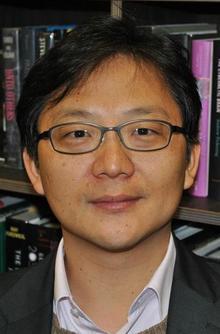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