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4.02 19:15
수정 : 2013.04.02 1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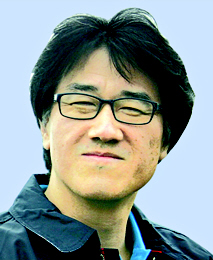 |
|
정정훈 변호사
|
법치주의는 보수의 단골 수사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내세운 핵심 과제는 ‘국민행복’과 ‘법치국가’였다. 특히 한비자를 자주 인용하는 박 대통령에게는 ‘법가적 리더십’이라는 비유가 따라붙기도 한다. 여하튼 법치주의를 강조한 두 정부의 공통점 중 하나로 ‘김앤장’ 출신 인사가 대거 정부 고위직에 진출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김앤장 출신의 고위 인사로는 한승수 전 총리, 한덕수 전 주미 대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회선 전 국정원 2차장, 서동원 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등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김앤장 인사만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제 첫 인선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이런 사정은 계속되고 있다. 외교부 장관, 여성부 장관, 사퇴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어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다섯번째 ‘김앤장’ 출신 인사가 고위 공직자가 되었거나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사정을 배경으로 해 언론에서는 ‘김앤장공화국’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검찰공화국, 삼성공화국에 이어 공화국의 주어 자리를 차지한 세번째 사례다. 검찰공화국은 수사와 기소권의 독점이라는 견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정치권력의 창과 방패 구실을 했던 검찰을 규정하는 용어였다. 삼성공화국은 삼성이 한국 사회에서 행사하는 지배력의 현실을 드러내는 용어이자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기업사회의 상징적 언어였다.
그렇다면 ‘김앤장공화국’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현상적으로는 퇴임 공직자들이 전관예우와 회전문 인사를 통해 다시 공직에 진출하는 우리 사회 관료체제의 현주소를 설명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김앤장공화국’이라는 신조어는 ‘삼성공화국의 그림자’와 같은 현상을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권력의 핵심인 법의 상품화와 법에 대한 기업과 자본의 우위가 공고화되어 가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일부 관료, 검찰 및 사법 권력의 이해관계가 대형 법률회사(로펌)를 통해 로펌의 주요 고객인 대기업의 이해와 하나로 만나고, 그러한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다시 정부의 공적 영역에 관철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의 사적 이익이 국가정책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에 출간된 <법률사무소 김앤장>이라는 책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먼저 들어간 자와 남은 자가 국내외 거대 자본의 이익을 위해 함께 움직이는” 자본-법률엘리트-정부관료의 “삼각동맹”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김앤장공화국’은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우리 사회의 우울한 단면을 보여준다. 대개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대변하기 마련인 대형 로펌에서의 경력이 정부 고위직에 진출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국가경영 능력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법치는 권력을 견제하는 원리이고, 기본적으로 정치적·사회적 약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김앤장공화국’의 법치는 왜곡된 법치다.
한비자의 법가와 법치는 기본적으로 관료들을 견제하는 기술이었다.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여 귀족들이 누리던 특권을 법으로 폐지하는 것이 그 방법이었다.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굽은 모양에 따라 구부려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비자의 말은 이를 설명한다. 한비자를 자주 인용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고위직 인사와 관련하여 귀 기울여야 할 경구다.
정정훈 변호사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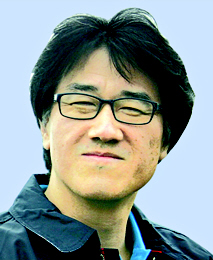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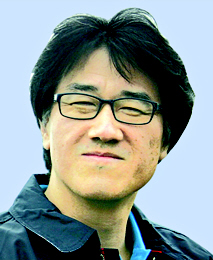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