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5.14 19:29
수정 : 2013.05.14 1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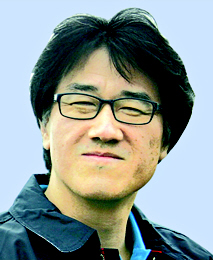 |
|
정정훈 변호사
|
소설가 김훈은 “법전은 어휘의 보고”라고 한다. 형용사, 부사 없이 주어, 동사의 뼈다귀만으로 된 글을 쓰고자 한다는 김훈의 절제된 문체를 생각하면, 그가 법전을 가까이에 두고 글을 쓰는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 법전은 형용사, 부사가 배제된 건조한 언어의 구조물이다. 그러나 그 어떤 문서보다도 법전에는 뜨거운 형용사, 부사들이 생략된 채로 우글거리며 웅크리고 있다.
‘존엄’, 나는 우리의 법전 전체에서 가장 울림이 있는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주저 없이 ‘존엄’을 든다. <세계인권선언>에도 등장하는 이 존엄(dignity)이라는 표현은, 자유의 ‘피냄새’를 씻어낸 채 깔끔하지만 역사의 진보에는 단 한걸음도 공짜가 없다. 수백년에 걸친 을(乙)들의 함성과 목소리가 ‘존엄’이라는 명사 하나에 차분하게 내려앉아 있다.
이런 느낌으로 헌법을 읽어보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제10조는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이다. 국민 ‘주권’을 선언한 제1조와 ‘인권’을 규정한 제10조는 헌법의 두 기둥이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인 ‘주권’(제1조)이 전제되어야만 존엄할 권리인 ‘인권’(제10조)도 보장될 수 있다. 또한 주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한 원리로서 의미를 지닌다.
헌법에서 존엄이라는 표현은 제10조를 포함하여 세 번 나온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제32조 제3항과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한 제36조 제1항이 그것이다. 헌법은 왜 존엄이라는 표현을 유독 근로관계와 가족생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을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갑을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갑을관계는 갑의 권력적 우위하에 을의 존엄이 희생되는 현상을 말한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갑을관계는 삶의 양식으로 구조화된 측면이 보인다. 가령 우리는 집·학교·회사라는 공간에서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보내왔지만, 이러한 공간에서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거나(주권)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했다(인권). 학교에서 우리는 훈육의 대상이었을 뿐 자치의 주체였던 적이 없고, 회사에서는 샐러리맨이거나 근로자였을 뿐 경영에 참여하는 공동의 의사결정자였던 경험이 없다. 심지어 대다수 노동자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 정리해고가 이루어져도, 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객체인 을이었을 뿐, 주체인 갑의 지위를 인정받은 적이 없었다.
헌법에서 유독 근로관계와 가족생활에 대하여 존엄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가정이나 직장이라는 삶의 토대가 되는 일상의 관계에서부터 자치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선언이 아닐까? 집, 학교, 회사라는 기본적 공간에서부터 존엄이 보장되는 관계와 경험을 만들어나갈 때, 갑을관계가 전제하고 있는 문화적 불평등을 교정할 수 있는 전제가 충족될 수 있다.
‘을을 위한 정치’를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에게 ‘존엄’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헌법을 다시 읽어볼 것을 제안한다. ‘을을 위한 정치’나 갑을관계의 개선의 핵심은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문화적 제도를 안착시켜 존엄한 관계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다. 학교인권법·차별금지법과 같은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이유 중의 하나다.
정정훈 변호사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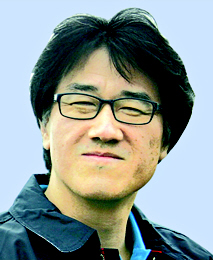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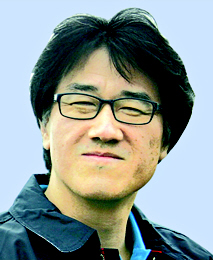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