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6.25 19:10
수정 : 2013.06.25 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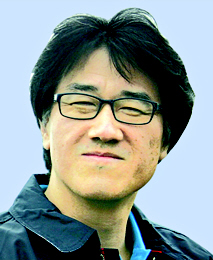 |
|
정정훈 변호사
|
축구선수 정대세.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재일동포 3세로, 한국 국적자인 부친을 따라 국적법상 ‘속인주의’에 의해 한국 국적을 지니고 있다. 그의 모친은 ‘조선적’(朝鮮籍)이다. ‘조선적’은 관련 법령상 무국적자에 해당한다. 최근 그는 북한 국가대표 시절의 발언 등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고, 일부에서는 그를 ‘추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연구자 정영환. 역시 일본에서 나고 자란 재일동포 3세로, 그는 ‘조선적’이다. 몇몇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만, 일본 대학에서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연구하는 그는 2009년 서울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입국이 거부된 이유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과 조선학교 출신으로 과거 총련계 학생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점 등이었다.
축구선수 정대세와 연구자 정영환, 그들은 자신의 국적과는 상관없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이니치’(在日), 즉 재일조선인이라고 규정한다. 정대세는 말한다. “내가 대표하는 건 한국도, 북한도, 일본도 아닌 자이니치다.” 그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성장통의 질문 과정을 거쳐, 여전히 스스로를 ‘자이니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삶과 경험에서는 남과 북이라는 적대적 정체성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동질적 정체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자이니치들이 일본 사회의 극심한 차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정대세에 대한 국가보안법 고발 사건은, 민변 등 단체에서 성명서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찬양고무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는 점에서, 한 보수단체에 의한 비(B)급 퍼포먼스로 종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다만 이번 고발 사건을 계기로 자이니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이 깊어지기를 바란다. 한 가족 내부에서도 조선·한국·일본 3개의 국적이 흔하게 공존하는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국적 그 자체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총련계와 민단계로 재일조선인 사회를 양분한 것은 남북한의 경쟁적·대립적 동포 정책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 “밥상머리 38선”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역사적 형성의 결과다.
또한 연구자 정영환의 입국 거부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정영환은 소송을 제기해 2010년 10월에는 대법원에까지 이르렀지만 아직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정영환 개인만의 사건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이후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 대다수의 ‘조선적’ 동포들과 관련된 문제다. 판결 선고와는 관련 없이, 이제 대통령과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답할 때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차별적·적대적 동포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
‘자이니치’, 그 겹의 정체성은 역사가 강요한 상처였다. 재일조선인들의 역사는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를 닮아 있다. 인형 속에 작은 인형이, 그 작은 인형 속에 더 작은 인형이 들어 있는 러시아 목각 인형 마트료시카. 정대세·정영환과 같은 젊은 자이니치들은 그 겹의 정체성 모두를 자긍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목각 인형의 허리를 비틀어 과거의 정체성을 끄집어내고 그중 하나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역사가 비틀어버린 것은 겹의 정체성을 살고 있는 자이니치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국가보안법과 추방으로, 한편에서는 입국 거부로 대응하는 졸렬한 우리의 인식과 제도야말로 역사에 의해 뒤틀린 것이라는 반성과 인식이 필요하다.
정정훈 변호사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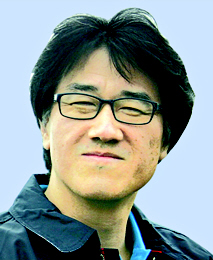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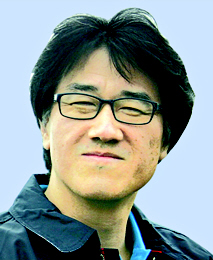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