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7.10 19:04
수정 : 2013.07.10 1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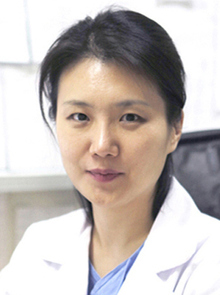 |
|
김현정 서울시립동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
장마가 시작되었다.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비 오는 동안 해볼 것, 가볼 곳, 읽을거리 등등 장마철 리스트를 적어본다. 바야흐로 일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온 것이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 나는 가뭄에 지친 사바나의 동물처럼 허둥지둥 그냥 좋단다.
1973년. 어려서 우리 집은 한강 가까이에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한강 둑이 터지고 수문이 열렸다.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보니 마당에 물이 가득 차서 마루까지 넘실넘실 신발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별로 놀라지도 않았다. 신속히 보따리를 꾸리고 이모네 집이었는지 할머니 집이었는지 어느 친척 집을 향해 떠나기로 했다. 아빠가 마당의 물속으로 성큼성큼 내려갔다. 허리춤까지 차는 물속에서 마루턱에서 물구경하고 있던 잠옷 바람의 나와 동생을 서둘러 안고서 골목 어귀까지 물을 헤치며 천천히 걸어나갔다. 아빠 어깨에 대롱대롱 매달려 내려다보던, 좁은 골목길 굽이치던 흐린 강물, 그날의 광경이 생각난다. 큰길까지 나오자 서운하게도 물이 발목까지밖에 차지 않았다. 일부러 첨벙이면서 걷다가 엄마한테 한소리 듣고 말았지만 발목을 간질이던 그 찰랑임은 아직도 생생하다. 솥단지를 이고 피난 떠나는 사람들의 처량한 행렬이 길게 정류장까지 이어졌다. 다음날 물이 빠졌다는 소식에 우리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는 마당에 온갖 가재도구를 내다 놓고 몇 번이고 며칠이고 힘겹게 씻고 말리고 했다.
1984년. 며칠 내내 비가 내리는 게 심상치 않았다. 학교에 도착하면 이미 흠뻑 다 젖어서 우리들은 이내 뽀송한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수업을 시작했다. 휴교령이 내릴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날 저녁 우리들은 어느 친구네 집에 모여 숨죽여 저녁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황톳물 속에 떠내려가는 돼지들이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휴교령이 발표되었다. “야호!” 우리는 다 함께 만세를 불렀다. “저 철딱서니 없는 것들. 구정물이 목구멍에까지 차 들어와도 낄낄대는 것들.” 곁에서 같이 뉴스를 보던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찬다. ‘미안해요 할머니, 우린 그런 족속이에요.’ 휴교령이 끝나고 나자 갖가지 홍수 모험담이 쏟아져 나왔다. 미술선생님은 아파트 4층까지 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안방 문짝을 발로 차서 뗏목처럼 타고 탈출했다는 무협소설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들은 수해 입은 친구들을 위해 수재의연금을 걷었다. 삼삼오오 그들 집에 가서 청소며 빨래를 도와주었다.
2011년. 풍경은 규모가 커졌다. 우면산이 무너져 내리고 흙더미가 들이친다. 올림픽대로가 잠기면서 자동차들이 신발처럼 혹은 돼지처럼 둥둥 떠다닌다. 황톳물은 골목길을 벗어나 강남역 네거리로 진출하여 굽이친다. 풍경은 이제 낭만과 운치가 아니다. 잔인함이고 상실이다.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는 농부의 마음, 폐지 주우러 나왔다가 허탕치는 노인들 마음, 밤이 조마조마한 저지대 주민들 마음, 이런 고단한 마음들을 헤아릴 때면 철딱서니 없이 비를 좋아하는 내 오래된 이력이 한없이 부끄러워진다.
84년도에 함께 만세 부르던 친구가 몇년 전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갔다. 카톡을 보냈다. “거기 비는 좀 오냐?” 딩동, 이내 답장이 온다. “여기 많이 와.” 힘주어 자랑하는 낌새다. 여전히 철딱서니 없는 것.
오늘도 비가 내린다. ‘유비무환.’ 비 오면 환자 없다는 90년대 규칙은 이제 작동하지 않나 보다. 세련된 교통수단으로 빗길을 뚫고 온 수많은 환자들이 이미 대기실 의자를 빼곡히 메우고서 진료가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다. 채송화처럼 앉아서 생의 감각을 흔들어주고 있다.
김현정 서울시립동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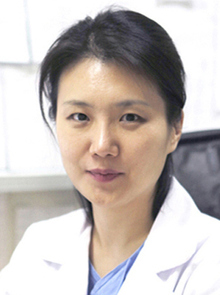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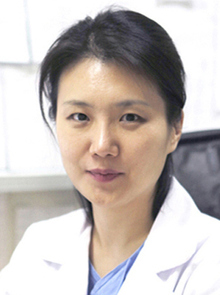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