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8.07 19:06
수정 : 2013.08.07 1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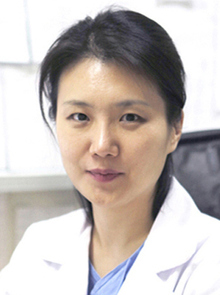 |
|
김현정 서울시립동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
화학자 케쿨레는 잠자는 동안 벤젠고리의 구조식 실마리를 찾아낸다. 영화감독 크리스토퍼 놀런은 잠자는 중에 영화의 모티프를 얻고, 소설가 이사벨 아옌데도 잠을 자면서 스토리를 생각해낸다고 한다. 천재적 패션디자이너 알렉산더 매퀸 또한 잠을 자는 동안에 디자인의 영감을 얻는다고 고백했다.
잠이란 사람에게 어떤 효능을 지닌 것일까? 동화 <피터 팬>에는 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묘사가 나온다. ‘낮 동안 이리저리 흩어졌던 마음 조각들을 모아 차례차례 제자리로 돌려보내 아침을 맞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사람에게는 누구나 일정량의 주기적인 잠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잠을 못 자도록 하는 것은 가장 가혹한 고문법 중의 하나로, 수면을 박탈당한 사람은 피로, 근육통, 무기력, 판단력 저하, 환청과 환시, 정신착란 등을 보이다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이 늘 충분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들은 삼당사락이니 사합오락이니 해가며 잠을 줄인다. 조직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은 야근과 회식으로 수면부족에 시달린다. 몸과 마음이 아파서, 걱정거리가 많아서, 숙제와 일이 많아서, 열대야에 너무 더워서 등등 현대인이 잠 못 드는 이유는 참으로 다양하다.
의사가 막 되어 인턴 하던 시절이었다. 잠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얼마나 졸렸는가 하면, 피 토하는 환자 곁에서 밤새 식도세척술을 하고 나서 다음날 운동부하검사 환자의 혈압을 잴 때였다. 혈압을 재려면 수축기와 이완기, ‘120에 80’,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숫자가 필요하다. 혈압계를 감고 청진기에서 두 번의 소리를 잡아내야 하는데, 두 소리의 간격은 1초도 안 되는 짧은 찰나다. 그런데 나는 그 찰나를 못 참고 그만 잠에 떨어져, 수축기 혈압은 들었는데 이완기 혈압 소리를 놓치고 말았다. 환자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하며 감기는 눈을 부릅뜨고 몇 번이나 혈압을 다시 쟀는지 모른다. 나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친구 의사는 회진을 따라 돌던 중, 다른 의사들은 얘기를 마치고 모두 다음 병실로 이동했는데 자신은 그걸 모른 채로 깜박 잠이 들어서 혼자 우두커니 환자 앞에 서 있었다고 한다. 서서 잠이 들었던 것이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근로기준 개선안을 내놓았다. 주요 뼈대는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최대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오타가 아니다. 주당 40시간이 아니라 80시간이다!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당 100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한 전공의가 30%가 넘었고, 평균 수면시간이 하루 두세 시간이라고 답한 사람도 20%나 됐다. 이것이 의료계 가장 아래 서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잠 못 드는 열악한 노동 현실이다.
그럼에도 전공의 근로기준 개선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노동의 그 빈자리를 누가 메울 것인가?”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아마도 아메리카 대륙에서 야만스런 노예제도를 철폐하자고 했을 때에도 반대자들은 이 비슷한 논리를 펼쳤을 것 같다. 또한 ‘수련’이라는 용어를 앞세워 전공의 노동 강도를 어물쩍 희석하려는 교묘한 논리도 시도되고 있다. 속지 말자. 전공의는 교육부 소관의 학생이 아니라 엄연히 노동부 소관의 계약직 근로자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이래서는 환자들이 위험하다. 어느 전공의가 환자의 오른쪽 다리에 박을 쇠핀을 왼쪽 다리에 박는 실수를 했다고 가정하자. 그 의사는 당직근무로 지난 이틀 밤을 거의 새운 상태였다고 하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잠은 천부인권이다. 제발 환자 보는 의사들에게 잠을 돌려주라.
김현정 서울시립동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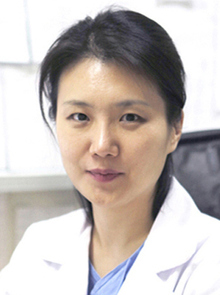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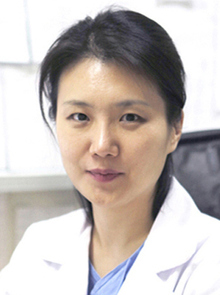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