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9.04 19:03
수정 : 2013.09.04 1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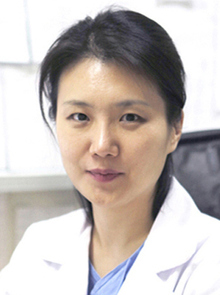 |
|
김현정 서울시립동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
초등학생들이 여름캠프로 한옥 체험을 다녀왔다. 3박4일 일정이 끝나는 날 설문 중에 이런 항목이 있었다. “한옥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들은 무엇을 골랐을까? 이리 오너라 솟을대문도 아니고, 기단 높은 대청마루도 아니고, 휘영청 창호지 드리운 띠살문도 아니고, 쓰레기 거리를 다 집어삼키는 아궁이도 아니었다. 한옥의 수많은 미덕 중에 아이들의 선택을 받은 것은, 지붕에서 비스듬히 경사를 이루며 내려와 여인의 치맛자락처럼 사뿐 뻗은, 한옥의 깊디깊은 ‘처마’였다. 집으로 가져가 아파트 베란다 위에 달고 싶어했다. 아이들의 놀라운 안목이다.
처마는 혹서와 혹한을 지닌 우리나라 기후에서 고마운 구조물이다. 여름에는 높이 뜬 해를 가리는 차양이 되어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겨울에는 낮게 뜬 해라도 집안 깊숙이 들게 하여 따뜻하게 해준다. 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 처마에 걸려 집안에 머문다. 이렇게 계절마다 태양의 남중고도에 따라 적절하게 열기를 막아주고 순환시키고 머금어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처마의 지혜다.
최근 서울시 새청사에 갈 일이 있었다. 번쩍이는 유리벽 안에 들어선 첫인상은 후끈한 느낌이 마치 식물원에 들어온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벽마다 식물들이 줄줄이 물기를 흘리며 양식되고 있었다. 두 번째 인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목적 층에 내렸을 때였다.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양쪽에 사무공간으로 통하는 유리문이 있는데 카드키가 없는 사람은 누군가 나와서 열어줄 때까지 엘리베이터 앞의 그 제한된 복도 공간에 꼼짝없이 갇혀 있는 꼴이 된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비상계단은 없었다. 아마도 저 유리문 너머에 있나 보다. 이럴 수가, 불이라도 난다면 어디로 가야 하나? 문이 열릴 때까지 폐소공포증 환자처럼 나는 안절부절못했다.
그런가 하면 어이없는 뉴스도 있었다. 지난겨울 이 건물의 곡선 모양 지붕에선 한파에 얼어붙은 눈이 ‘얼음 폭탄’이 되어 떨어져 행인과 차를 위협했다.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지붕에 열선을 까는 것이라고 한다. 에너지를 한 방울이라도 아껴야 하는 시기에 지붕에 열선이라니! 처음부터 지붕을 똑바로 지었으면 되었을 것을. 그뿐이 아니다. 올해 장마철에는 빗물이 샜다. 여기저기 양동이와 쓰레기통을 받쳐놓은 시청 로비 사진이 기가 막힌다. 서울시청 맞아요? 이 정도면 삼천억짜리 대략난감 아닌가?
요즘 주위에 유리벽 건축물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커튼월’ 공법이라는데, 이는 초고층 건물 짓는 데에 유리하고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유리벽 건물들은 대개 열효율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어서 한국 토양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 한 가지, 멀쩡한 건물들을 아깝게도 너무 자주 허물고 새로 짓는다는 생각이 든다. 1980년대 초반, 통학 길에 지켜보던 어느 건물 공사가 있었다. 철골이 차근차근 올라가고도 한참을 걸려서 몇년 만에 공들여 완공이 되었다. 그 건물은 삼성동 한전사옥이다. 이제 겨우 삼십년 가까이 된 그 튼실한 건물을 헐고 거기에 백층이 넘는 초고층 복합단지를 짓는다는 뉴스가 들린다. 안타깝다.
동물은 스스로 집을 짓는다. 자신에게 필요한 목적에 부합하는 집을 짓는다. 다행스럽게도 동물세계에는 무책임한 위정자도 없고 미적 충동에 취해 사용자를 배려하지 않는 자기만족적 설계자도 없다. 수백년 후 미래의 후손이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의 유적을 보면서 “21세기 선조들은 이런 집에서 살았대. 처마도 없어. 창문도 빠끔 열려. 바람도 안 통해. 쯧쯧, 불쌍하게 살았었구나.” 이러지 않을까? 아이들의 안목이 필요하다.
김현정 서울시립동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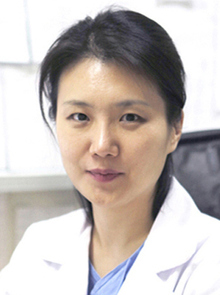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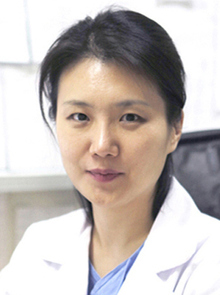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