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2.02 18:37
수정 : 2014.02.02 18: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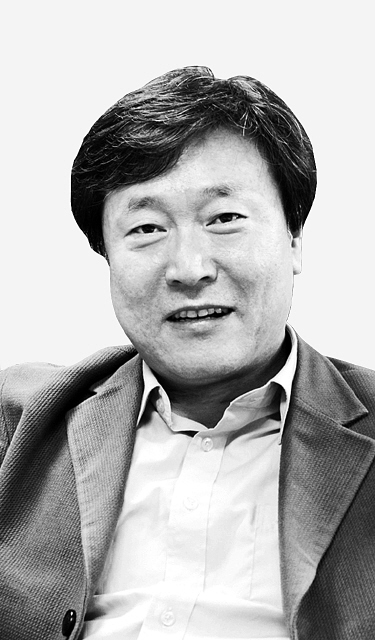 |
|
김누리 중앙대 교수·독문학
|
삼성이 올해 신입사원 채용부터 적용하기로 한 ‘대학총장 추천제’가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더니, 마침내 전면 ‘유보’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여론의 비판은 주로 삼성이 대학별로 추천 인원을 차등 할당해,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고, 대학·지역·성 간의 차별을 조장했다는 데 모아졌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문제의 핵심을 한참 빗나간 것이다. 문제는 삼성의 ‘차별 할당’에 있다기보다는, 대학을 마치 자신의 하부 기관처럼 취급하는 기업의 오만한 행태와 이런 어이없는 행태를 당연시하는 우리 사회의 의식에 있다.
이번 사태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사회에 잠복해 있던 중요한 진실을 드러내주었다는 데 있다. 한국 대학이 완전히 자본에 예속되어 있다는 진실 말이다. 이 땅에선 자본권력이 대학을 점령했고, 시장 논리가 대학을 장악했다. 그 와중에 대학은 놀라운 속도로 기업화되었다.
이 땅에 대학은 없다.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학문 공동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직업훈련소’만 존재할 뿐이다. 오늘날 한국 대학은 그 외양도 정신도 완전히 변해버렸다. 대학 캠퍼스는 기업 상호를 단 건물, 기업 홍보물, 취업 정보물로 뒤덮여 있다. 자본은 건물을 지어주거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혹은 대학을 설립하거나 기존 대학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학을 지배하고 있다. 시장은 ‘경쟁력’, ‘수익성’, ‘효율성’ 등 경영 논리를 앞세워 대학을 평정한 지 오래다. 게다가 시장 논리로 중무장한 재벌언론이 대학 평가의 칼을 움켜쥠에 따라 대학은 꼼짝없이 시장의 포로로 포획되었다.
돌아보면 역사상 어떤 권력도 오늘날의 자본권력처럼 대학을 완전히 지배한 적은 없었다. 대학은 언제나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서서 그 시대의 지배적 권력과 맞서 싸웠다. 중세 대학은 종교적 도그마를 강요하는 교회권력과 맞섰고, 근대 대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강제하는 국가권력과 투쟁했다. 한국 대학을 돌아보아도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 대학의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그 영혼만은 오롯이 깨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대학은 시장의 논리로 짓누르는 자본권력의 압박 아래 육신도 영혼도 퇴락해버렸다. 자신을 지켜낼 언어도, 담론도, 이념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자본권력과 시장 논리에 굴종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대학의 현실이다.
진리와 정의가 무너진 폐허 속에서 대학 기업화는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 그것은 자본한테는 일거양득의 수지맞는 사업이다. 대학에 널리 퍼진 진보적 이념을 시장적 실용주의로 탈색시키고, 대학의 공적 성과물을 기업의 사적 이득을 위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학 기업화가 대학 사회에 미친 영향은 괴멸적이다. 진리 탐구의 전제인 학내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최고 학문기관으로서 대학의 도덕적 권위는 참담하게 무너졌다. 또한 대학 기업화는 우리 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기업화된 대학이 생산하는 기업 담론이 사회적 담론을 지배함에 따라 시민사회의 민주적 욕망과 실천이 크게 약화되었다. 특히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시장의 공격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비판적인 담론 생산을 원천봉쇄하고, 시장 이데올로기에 순종적인 노동자와 자동인형적인 소비자를 양산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처럼 ‘대학 기업화’ 현상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시장이 사회의 모든 영역 중에서 가장 비판적인 영역인 대학을 제압함으로써 시장의 총체적 지배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자본 독재에 맞선 대체 담론을 생산할 마지막 보루인 대학이 마침내 소멸할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알리는 불길한 경보음이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독문학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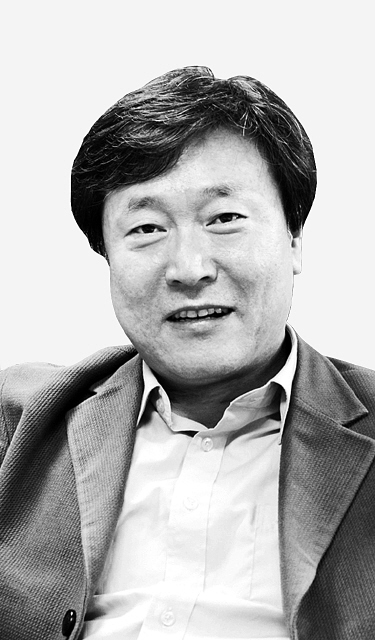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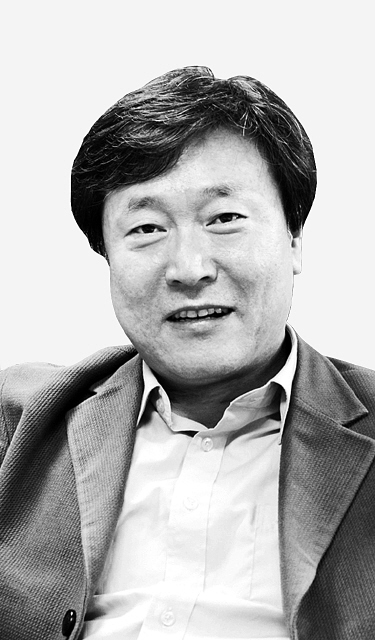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