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3.04 18:41
수정 : 2014.03.04 2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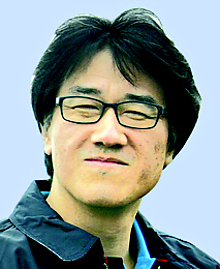 |
|
정정훈 변호사
|
전남 신안군 일대의 속칭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공분이 있었다. 외딴섬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장애인, 노숙인(홈리스)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되었다. 무관심과 침묵으로 일관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논의되는 계기가 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개인적으로도 분노와 부끄러움으로 언론보도를 접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의 기사에서 눈엣가시 같은 표현들이 걸렸다. 신안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염전 사업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도 7명이 붙잡혔다”는 식의 내용이었다. 대부분의 언론보도에서는 그 ‘불법체류자’도 염전에서 강제노동과 임금체불을 당한 피해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이른바 ‘불법체류자’는 그저 검거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들은 사건의 한가운데서 다시 무관심과 침묵의 대상이 되었다.
현재 소금채취업은 어업에 포함되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의 취업이 허용되어 있다.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임금체불 문제는 내국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140만명에 이르는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 중 선원·양식장·염전 등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는 2만명 이상이다. 도시의 공장과는 달리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임금체불과 폭력·가혹행위 등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앞에서 언급한 보도들은 경찰의 보도자료를 받아 무의식적으로 기사를 작성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는 보도였다. 그만큼 더 신중했어야 했다. 단 한 곳의 언론도 염전 사업장 이주노동자의 인권 문제에 주목하지 못한 것은 ‘불법체류자’라는 단어의 부정적 영향력 때문이다. 경찰이 불법체류자를 검거했다고 발표하는 순간 인권의 문제의식이 사라진 것이다.
‘불법체류자’라는 규정은 메마른 법의 언어, 행정의 언어다. ‘체류’가 ‘불법’이므로 그 ‘불법’은 검거와 행정처분의 대상일 뿐이다. 사람 자체는 불법·합법의 대상일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을 ‘체류’의 관점으로 한정함으로써 건전지 ‘폐기처분’하듯 간단히 처분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꿔 놓는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통해 구체적인 사람을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불법체류자’라는 말이 수행하는 부정적 영향력이다.
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규정을 통해 우리는 다른 인식과 실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이주’해서 살아가는 ‘이웃’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미등록’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들에게 더해지는 곤궁한 처지를 되살펴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존재 자체를 간단히 불법으로 규정하는 위험에서 빠져나와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유엔의 인권규약 등 관련 국제인권문헌에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undocumented migrant worker)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보다는 이러한 표현 방식이 인권의 문제의식에 더 부합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언론이 보도한 그 ‘불법체류자’들이 ‘염전 노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염전 사업장이 정상화되면 그만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것이다. ‘염전 노예’ 사건을 통해 장애인, 홈리스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실태에도 관심을 기울였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결에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정훈 변호사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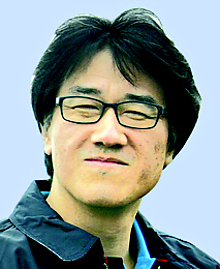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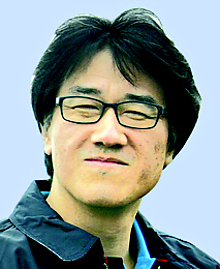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