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7.01 18:21
수정 : 2014.07.01 1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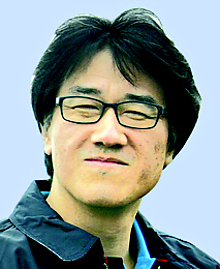 |
|
정정훈 변호사
|
사할린은 섬이다. 사할린은 러시아 연해주 동쪽, 일본 홋카이도 북쪽에 위치한 러시아 땅이다. 1910~1918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토지를 잃은 조선의 농민들이 살길을 찾아 고향을 떠나 정착한 땅이고, 1938년 ‘국가총동원령’에 의하여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이 벌목장·탄광 등에서 강제노역을 한 땅이기도 하다.
1945년 패전국 일본은 사할린에 억류된 일본인의 귀환에 매우 빠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당시 일본 국적이었던 조선인들의 귀환은 철저히 통제된 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 패망 후, 고향으로 가는 배가 올 것이라는 소식에 수만명의 한인들이 코르사코프 항구에 모여들었지만, 그들의 희망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만명의 조선인들이 ‘동토의 땅’ 사할린 섬에서 추위와 굶주림과 싸우며 망향의 언덕을 지켜야 했다.
1992년 이장호 감독의 영화 <명자, 아끼꼬, 쏘냐>는 그 제목만으로도 사할린 한인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사할린 한인의 역사는 세 개의 이름, 세 개의 국적을 강요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여전히 ‘쏘냐’라는 이름으로 사할린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아끼꼬’가, ‘명자’가 있다. 그 겹의 정체성은 역사가 강요한 상처였다. ‘국가’라는 제도 바깥에 버려진 삶이었고, 자신들의 운명을 역사가 비틀어버린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아직 어느 국가, 어느 역사도 그 상처와 아픔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았다.
1945년 당시 사할린에는 약 4만3000명의 한인이 억류되었다. 그중 90% 이상이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강제동원 70여년, 이 비극의 역사를 기억하고 증언할 사람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사할린의 무국적 한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다. 재판부는 “사할린 무국적 한인들은 조국에 돌아갈 날만 기다리며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우리는 정녕 어느 나라 백성이냐”는 사할린 한인의 오랜 탄식에 대하여, 이 판결이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 그러나 사할린 한인들의 삶에 새겨진 역사의 상처는 너무도 깊고, 이번 판결은 그 상처 중 일부분에 관한 것일 뿐이다. 우선 판결은 ‘무국적’ 사할린 한인의 국적에 대한 것이다. 1990년 한-소 수교 이전까지 고향에 돌아갈 길이 막혀 있던 사할린 한인들이 불가피하게 러시아 국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아직 법적·역사적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당시 사할린에 강제동원된 한인들은 일본 기업에 의해 노동력을 수탈당하고, 그마저도 예금·저금 등의 형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영주귀국 대상자를 1세대로 한정함으로써 강제동원으로 가족의 이산과 해체를 강요당했던 그들에게 다시 가족과의 이별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오늘 또다시 부당하게 삶의 선택을 강요하며, 과거 역사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재생산하는 것이다.
사할린 한인들의 삶의 구체성을 존중하면서도 역사의 문제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지원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할린 한인 지원 특별법 등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 역사와 삶에 충실한 제도를 통해 과거의 상처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여전히 오늘의 과제다.
정정훈 변호사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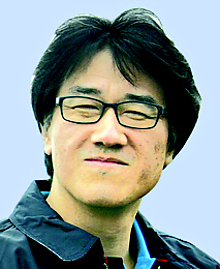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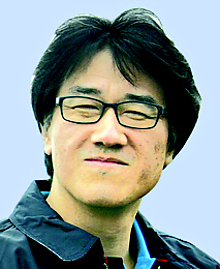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