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1.14 19:48
수정 : 2008.01.14 1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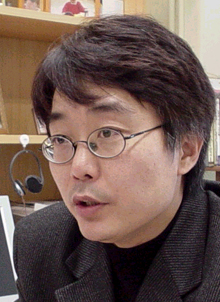 |
|
윤태진/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
야!한국사회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참 어렵다. 대학에 있다 보면 끊임없이 사람들을 평가해야 한다. 지원자를 평가해서 합격생을 가리고, 답안지를 채점해서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논문을 심사해서 석·박사 졸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항상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공정하게 평가하겠노라 다짐하지만, 과연 매 순간 옳은 평가를 했는지 확신할 수는 없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유쾌하거나 개운한 일은 아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주 일상적으로 남들을 평가하면서 살아간다. 친구로 사귈 만한지, 무슨 일을 맡겨도 될지, 혹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뽑아줄 만한지. 기준은 무엇인가?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참 어렵고 개운치 않은 일이며, 동시에 귀찮은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단하고 손쉬운 기준 한두 개를 무의식적으로 적용하곤 한다. 여자니까 운전을 못하고, 키가 크니까 싱겁고, 충청도 출신이면 느릿느릿하고, 최씨 성 가졌으면 고집 세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런 선입견 혹은 고정관념은 얼마나 정당한가? 마찬가지로 혈기왕성한 10대 때 잠시 게을렀거나 심지어 아팠기 때문에 소위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가지 못해 평생을 차별받아야 하는 현실은 정당한가? 내가 아는 한 교수님은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출신교를 꼭 수식어로 사용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 “아, 그 사람 경기고 나와서 서울대 영문과 졸업한 사람인데 …” 하는 식이다. 참 이상한 버릇이다. 그런데 이런 말버릇이 없다뿐이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40대 후반 이상의 사람들은 잘 안다. 경기고를 나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학교에서 꼴찌를 했어도 상관없다. 사람들은 그를 똑똑하다고 믿어주고, 사회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선배들은 그를 이끌어주었다. 30대 중반 아래 사람들 또한 안다. 외고를 나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외국어를 잘한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20대가 생각하는 민사고나 외고는 50대의 경기고일 뿐이다. 확신하건대, 90년대 이후 대학에 진학한 세대가 사회의 주축이 되는 20년 후에는 외고를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보다 높은 대우를 받거나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일부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학교 갖고 따지지 말자. 최근 대통령 세 명이 모두 상고 출신 아닌가. 그런데도 전임 두 명에 비해 이번 당선자는 ‘제대로 된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치켜세우는 건 또 뭔가. 여전히 사람들은 일류 학교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외고 같은 학교를 300개쯤 만든단다. 모두 개성 있고 차별화된 ‘좋은’ 교육을 한다지만, ‘좋은 대학’ 가는 훈련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그 ‘좋은 고등학교’들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기우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짜 걱정이다. 그 300개에도 끼지 못한 사람들은 나머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려나? 성별이나 생김새, 그리고 출신 학교로 평가받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지만, ‘초등학교에서 시작하는 외고입시 참고서’ 광고가 신문에 대문짝만큼 실리는 우리 앞의 현실은 그리 기대만큼 빨리 변하지 않는 듯하다. 출신교로 사람을 평가하는 연좌제 같은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 한, ‘좋은’ (고등)학교에 대한 열망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른바 ‘좋은’ 자사고와 ‘기타’로 ‘좋은’ 사람 여부를 결정할지도 모른다.
윤태진/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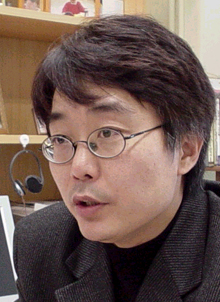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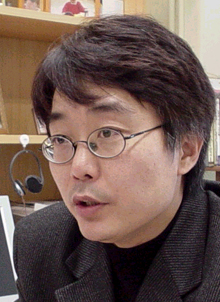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