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4.28 20:51
수정 : 2008.04.28 2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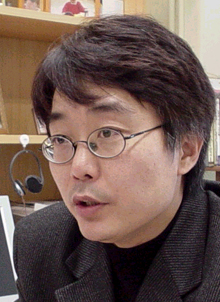 |
|
윤태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
|
야!한국사회
지난주말, 미디어 관련 학회 네 곳이 모여 학술대회를 열었다. 수백명의 학자와 현업인들이 다양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현안들을 논의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학술대회의 또다른 재미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다. 오랜만에 원로 학자들을 뵙고,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못 보던 동학들, 혹은 옛 동료나 동문들을 만나 맥주 한잔을 하며 이런저런 잡담을 한다. 가족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떠도는 소문을 주고받기도 하고, 요즘의 정치를 안주로 씹어대기도 한다. 전국 각지의 대학 교수로 있는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교수라는 직업은 뭘까? 과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교수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승진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괴롭단다. 공장에서 물건 찍듯 논문을 써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단다. 영어로 강의를 하라니 머리가 빠진단다. 잡무가 많아서 죽겠다고도 한다. 학생들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살갑지 못하다고 걱정한다. 교수를 보는 사회적 시선이 왠지 차가워졌다며 풀이 죽기도 한다. 그래도 이 정도는 그냥 푸념이다. 그냥 삭막해진 현실에 대한 불평 정도다. 각자 알아서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한국에서 교수로 사는 일이 그리 녹록잖은 것은 다른 이유들 때문이다. 수억원을 횡령한 교직원이 있는데 학교 명성에 흠이 날까봐, 혹은 불똥이 튈까봐 쉬쉬하며 덮으려는 보직교수들을 보면서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무력감을 느낀다. 형편없는 연구업적 때문에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람이 후안무치하게 소송을 걸 때 동문이라거나 종씨라는 이유로 편을 드는 동료교수들을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 유독 교육에 소홀하던 교수가 어느날 장·차관이나 국회의원이 되어 축하를 받는 현실에 쓴웃음이 나온다. 게다가 그런 몇몇 때문에 ‘멀쩡한’ 다수 교수들마저 웃음거리가 된다는 사실이 분하다. 하필이면 명석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교수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으며 허망해한다.
그래도 여전히 교수는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직업이다. 예전만큼은 못하더라도 교수이기에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일도 많다. 다른 전문직에 비해 보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땅투기를 하거나 뇌물을 받아야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직업은 분명 아니다. 종종 괴롭거나 화나는 일이 생기지만, 하기야 그 정도는 평범한 기업에 다니는 친구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왜 교수사회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대학은 양심이 사는 곳이다. 사회의 다른 모든 부문이 돈과 권력을 추구하더라도 대학만큼은 양심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힘과 억지가 통하는 사회라도 대학만큼은 합리적이고 떳떳해야 한다.
소수라고 자위하긴 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권력욕과 물욕이 지식을 지배하는 교수들. 비정규직 교원처럼 강의시간에만 잠깐 학교에 나오는 교수들. 대학원생의 연구를 가로채거나 무한 자기표절을 일삼는 교수들. 학생이나 교직원들을 장교가 사병 다루듯 대하는 교수들. 의당 교육이나 연구에 써야 할 공금을 아주 사적인 용도로 써 버리는 교수들. 이들에게는 한국에서 교수로 산다는 일이 마냥 즐겁고 행복할지 모르겠다.
역설적이지만, 정말로 팍팍한 교수의 삶을 사는 이의 수가 늘기를 바란다. 가끔 모여 푸념이나 한탄을 하더라도, 그 팍팍함 속에서 양심과 합리성을 키우는 대한민국 교수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작은 존경이라도 받기를 원한다면, 지난 몇 달 평범한 시민들을 분노케 했던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관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떳떳해야 하지 않겠는가.
윤태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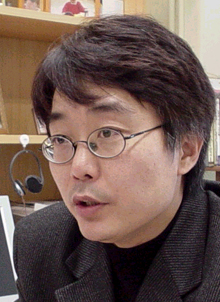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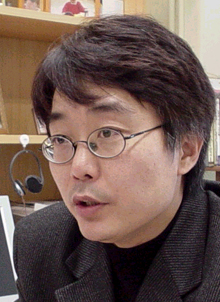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