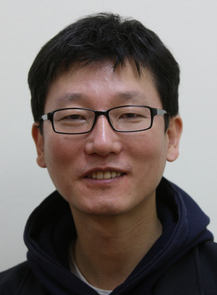 |
|
엄기호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위원
|
고양이를 입양할 생각이었다. 돈 주고 사는 것보다 이왕이면 버려졌거나 버려질 위기에 처한 고양이를 업어 오려고 여기저기 무료분양 사이트와 동물보호소를 기웃거렸다. 익히 알고 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었다. 젊거나 건강할 때는 자식보다 더 나은 반려였지만 막상 병이 들자 비용이나 시간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버려지는 야박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다 자식보다 더 귀하게 키웠지만 어쩔 수 없이 분양한다는 글이 제법 많이 눈에 띄었다. 가난하거나 싱글·비혼인 경우다. 단칸 셋방에 살면서 노점을 하신다는 한 노인 부부는 포장마차 한쪽에서 애지중지 고양이를 키워왔지만 얼마 전 철거를 당해서 더는 거둘 수가 없게 되었다며 눈물로 자기 고양이를 입양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한 소녀가 자기의 단짝을 내놓은 경우도 있었다. 반지하 방에서 홀로 고양이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다, 하지만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 처지라 야간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다, 몸도 시간도 이제 고양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며 고양이를 잘 돌봐줄 사람을 찾는다는 사연도 있었다. 누구보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어떤 이들보다 외로운 그들의 삶에 반려가 필요한 이들이지만 정작 이들에게는 무엇으로부터도 위로를 받을 돈도 시간도 없다. 가난과 함께 이들이 가장 끔찍하게 박탈당한 것은 친밀성이다. 무엇보다 이들의 ‘주거’ 자체가 사람이건 동물이건 ‘반려’를 허용하지 않는다. 달동네의 해체와 더불어 가난한 사람들은 옥탑방과 반지하 방으로 유폐되었다. 달동네에서 사람을 귀찮게 할 정도로 간섭하던 이웃들의 ‘마실’이란 꿈도 꾸지 못한다. 다만 이들을 찾아오고 ‘돌보는’ 사람은 동사무소의 복지담당 공무원뿐이다. 다른 사회의 영역만큼이나 반려와 친밀성도 심각하게 양극화되었다. 애완동물 산업에서부터 결혼알선, 인공임신·출산까지 인간의 반려를 돌보는 온갖 상품이 존재한다. 단 이 모든 것은 소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다. 물론 소비자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주거를 친밀성의 공간으로 가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단히 잘살지 않는 이상 대다수의 싱글이나 비혼들 역시 반려가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살아간다. 이들이 구할 수 있는 주거는 다가구나 빌라 혹은 원룸 같은 것들이다. 이런 공간들에서의 주거란 말 그대로 먹고 자는 것만이 용인되는 ‘빈 박스’와 같은 공간이다. 실제 서울시민의 1%는 문자 그대로의 ‘빈 박스’인 고시원에서 살아간다. 용케 좋은 집주인과 이웃을 만나 반려동물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피란살이에 가까운 이사가 큰 문제다. 많은 경우 반려동물들은 이사 과정에서 버려진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주거의 가장 큰 윤리이자 미덕은 주거를 친밀성의 공간이 아니라 ‘빈 박스’로 남겨두는 것이다. 쥐 죽은 듯이 ‘빈 박스’에 몸만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임대인이고 가장 좋은 이웃이다. 지금 당장 몸 누일 공간도 없는데 무슨 반려와 돌봄과 같은 사치를 이야기하느냐고 타박을 놓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 혹은 외로운 사람들의 주거권을 사고하는 방식이다. 빈 박스 하나 던져주는 것이 주거권과 복지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주거의 권리란 주거를 통하여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돌봄과 반려와 같은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것이 생략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단지 짐승의 권리일 뿐이다.
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사회가 많이 퇴행하였다. 그렇다고 우리마저 인권에 대한 논의를 짐승의 권리로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인권에 후퇴는 없다. 엄기호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위원


기사공유하기